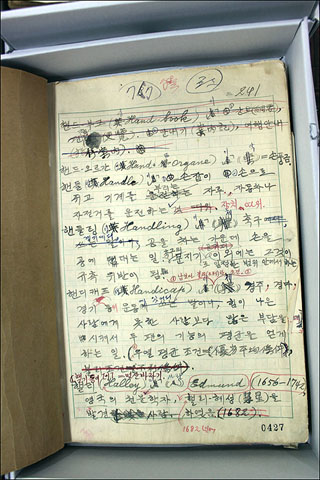
한국이 잘된 건 일본 가르침 덕분? 뉴라이트의 헛소리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83> 경제 개발, 아홉 번째 마당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른바 진보 세력 안에서도 부박한 담론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절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를 이어간다.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은 한국 현대사 연구를 상징하는 인물로 꼽힌다. 매달 서 이사장을 찾아가 한국 현대사에 관한 생각을 듣고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아홉 번째 이야기 주제는 경제 개발이다. '편집자'
프레시안 : 1960∼1970년대 전면적인 경제 발전의 역사적 배경으로 지난번에 평준화 문제를 살폈다. 이번에는 교육 문제를 짚었으면 한다.
서중석 : 한국 사회가 꼭 평준화돼서 교육열이 높아진 건 아니다. 조선 후기부터 보면 한국은 상당히 교육열이 높은 나라였다. 그렇지만 이 평준화 현상이 교육열을 엄청나게 부채질한 것은 틀림없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평준화되다 보니까 출세하는 데나 돈 버는 데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 정실, '빽'이었기 때문이다. 1950년대에는 '빽' 없으면 못 산다고 할 정도로 모든 데 '빽'이 작용했다.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었다. 그런데 이 정실에서는 대개 지역 연고나 같은 학교 출신이라든가 하는 교육 연고, 이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역 연고라는 건 한계가 있고 대개는 교육적인 연고 관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뿐 아니라 '일류 학교를 나오면 더 빨리 출세할 수 있다. 상향된 지위를 가질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국인들이 해방 후 상당히 일찍부터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도 교육열이라는 게 굉장히 셌다. 한국에서 교육열이라는 건 평준화와 함께 그야말로 역동적인 사회로 가는 기본적인 힘이었다.
한국은 해방되면서 문화적, 교육적 혁명을 맞이했다. 일제 때 초등학교 취학률이 얼마나 낮았느냐 하는 건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일본은 1904년에 이미 초등학교 취학률이 94.4퍼센트가 돼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가고 있었는데, 한국은 일본이 98.1퍼센트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갔을 때인 1911년에 적령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률이 1.7퍼센트였다. 1929년에도 18.6퍼센트밖에 안 됐다. 1930년대 후반부터 일제가 한국인을 동원하면서 취학률이 좀 높아지지만, 일제 시기 내내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
그런데 해방되면서 초등학교 취학률이 갑자기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1945년에 초등학교에 다닌 학생들이 136만여 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게 1955년에 294만여 명, 즉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온다. 1960년에는 408만 명이나 된다. 그러면서 해방 직후에 이미 70퍼센트를 훌쩍 뛰어넘는 것을 볼 수 있고, 의무 교육을 실시한 직후인 1954년에는 82.5퍼센트가 된다. 1958년에는 94.6퍼센트, 자유당 정권 말기인 1959년에는 96.4퍼센트가 된다. 96.4퍼센트라고 하면 유럽에서도 이만큼 되는 나라가 많지 않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초등학교 취학률로는 선진 대열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당시 학교 유리창도 깨진 게 많았고, 초등학교 교육 환경이 말할 수 없이 안 좋았다. 그리고 제대로 가르쳤느냐, 교사 질은 어땠느냐 하는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때 대량으로 한글세대가 탄생하게 된다. 엄청난 한글세대의 탄생을 이 시기에 맞이하게 된다.
평준화와 더불어 한국을 역동적인 사회로 만든 교육열과 한글세대의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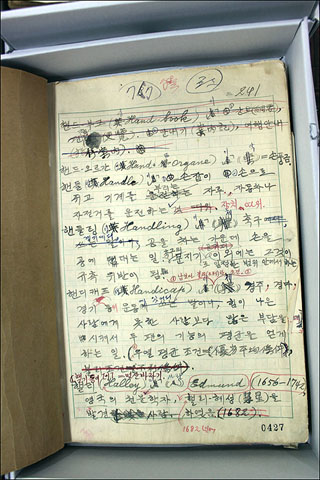
서중석 : 해방 직후 교과서를 바로 한글 중심으로 하고 나중에는 한글 전용으로까지 가게 되고, 거기다가 가로쓰기 한글 교과서를 내게 된 놀라운 변화도 이러한 대량의 한글세대를 창출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지 500년이 돼서야 한글이 그야말로 국민 문자가 되는 상황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일제 때는 한국에 문맹자가 참 많았다. 예컨대 문맹자가 1930년에 77퍼센트였고 1933년에 72퍼센트였다. 그런데 해방 후에는 한국인이 초등학교에는 100퍼센트 가깝게 들어갔고, 13세 이상 인구 중에서는 1960년 통계를 보면 159만 명이 글을 모르는 것으로 돼 있다. 문맹률이 27.9퍼센트, 그중 남자는 15.8퍼센트로 나온다. 무학자 비율도 1955년에는 50.4퍼센트, 1960년에는 39.5퍼센트로 대폭 줄어든다. 그 후에는 훨씬 더 줄어든다. 거듭 얘기하지만 여기서 대량의 한글세대가 탄생하게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중학생 숫자가 해방 직후에 엄청 늘어나는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 일제 때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어려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중학생은 더더욱 적었다. 한국에 와 있는 일본인이 1910년의 경우 한반도 거주자의 1.3퍼센트, 1940년에는 3.0퍼센트였다. 그래서 한반도 거주자 중에서 일본인이 대략 40분의 1 정도였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중등학교에 다닌 학생 수를 살펴보면 일본인 숫자와 한국인 숫자가 거의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인은 일본인의 40분의 1밖에 중등학교에 못 들어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예컨대 1922년 조선총독부 통계를 보면 한국인은 7691명으로 돼 있는데, 그 당시 인구의 2퍼센트를 조금 넘던 일본인은 1만2567명으로 한국인보다 월등 많았다. 1938년에 가면 한국인은 2만4473명, 3퍼센트 정도 되던 일본인은 2만10명으로 일본인이 약간 적었다.
이때까지 한국인이 다닌 학교는 고등보통학교, '고보'라고 보통 말했고 여자의 경우 여자고등보통학교, '여고보'라고 했다. 이와 달리 일본인이 다닌 학교는 중학교였다. 초등학교도 이름이 달랐다. 한반도에 있던 일본인이 다닌 학교는 소학교, 한국인이 다닌 학교는 보통학교였다. 이름만 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교육 수준도 떨어졌다. 하여튼 중등학교에 다닐 수 있는 숫자가 무척 적었다. 그렇게 일본은 문맹 수준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인이 교육 받는 것을 제한하려 했던 것이다. 식민지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나. 그만큼 한국인의 능력이 커지는 것이고, 일제에 대들고 독립하는 것으로 가려 하지 않겠나.
1945년 통계를 보면 중학생이, 이 당시에는 중·고등학교가 합쳐 있었는데, 8만4572명으로 나온다. 일제 때보다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 이게 1955년에 가면 47만5302명이 된다. 5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이다. 1960년에 가면 65만5123명으로 나온다. 고등학생 숫자도 1955년에, 이때는 중·고등학교가 분리됐을 때인데, 이미 21만2518명에 이르렀고, 1960년에 32만3693명이 된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온 한글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대들은 1960년대의 노동 집약적 경공업에서는 전부 다 일할 수 있었다. 일하는 데 조금도 지장이 없었다. 그뿐 아니라 1970년대에 중화학 공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소비재 중화학 공업, 그러니까 석유화학 계통, 조선, 가정용 전기·전자 제품을 만드는 중화학 공업이 많았는데 여기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거의 다 일할 수 있었다. 경공업에서건 중화학 공업에서건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이 세대들이 월급을 적게 받고 노동 조건이 나쁘더라도 정말 열심히 일하려는 게 돼 있었다.
한국이 이만큼 사는 건 권력자·재벌 몇 명 덕분? 성장의 주역 문제 다시 생각해야
프레시안 : 대규모 한글세대의 탄생 및 이들이 경제 발전 과정에서 한 역할에 주목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역사의 주인공, 성장의 주역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한국인들이 이만큼이나마 먹고살 수 있게 된 건 특정한 권력자나 재벌 회장 몇 명 덕분이라는 식의 왜곡된 신화에서 벗어나야 더 나은 미래가 열린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도약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과 국제적 조건, 그리고 그 속에서 발휘된 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의 힘과 노력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도 중요하다. 다시 돌아오면, 일제가 그 길을 아주 좁혔던 대학 교육도 해방 후 활발하게 이뤄진다.
서중석 : 대학생의 경우 숫자로만 따지면 일제 때보다 훨씬 비율이 높다. 사실 수준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그나마 일부 있던 대학 과정을 일제가 한국을 병합하면서 없애버리지 않았나. 그러고 나서 대학을 세우지 않았다. 일본의 중요 지역, 그러니까 교토, 도쿄에는 대학이 몇 개씩 있었고 다른 어지간한 도시에도 대학이 다 있었으며 중국만 하더라도 큰 도시에는 몇 개씩 있었던 건데, 도대체 한국에는 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대학을 안 세운 것이다. 그러니까 1920년대 초에 민립대 기성회라는 것이 생긴 것이고, 그러자 일제가 할 수 없이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 예과(豫科)라는 것을 만든 것 아니겠나.
이 경성제국대학이 일제 시기를 통틀어 유일한 대학이었는데, 뽑는 숫자도 얼마 안 됐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1920년대에서 1930년대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인은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밖에 안 됐다. 정원이 얼마 안 된 이 학교에조차 대부분 일본인이 들어갔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한국인은 특별히 돈이 많거나 아르바이트를 정말 열심히 해서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 유학을 하는 방법 이외에는, 국내에서 대학을 다니기가 아주 어려웠다. 전문학교라는 것도 몇 개밖에 안 됐다. 서울을 중심으로 의학전문학교니 고등사범학교니 하는 몇 개의 전문학교가 있었다. 이런 전문학교도 대개 20퍼센트, 많아야 30퍼센트만 한국 학생을 뽑았고 나머지는 한반도 거주자의 2퍼센트에서 3퍼센트밖에 안 되던 일본인으로 채웠다. 이렇게 교육 차별이 심했는데도, 뉴라이트들은 정반대 소리를 하고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들면서 '일제 때 교육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잘됐다'는 식의 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 : 이른바 '맨 파워(man power)'론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의 한 축은 일제 강점기 때 이뤄진 개발이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의 밑거름이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식민지 시대에 이뤄진 모든 개발의 유산은 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거의 무의미한 수준으로 축소됐다는 실증적인 비판을 넘어서기 어렵다. 다른 한 축은 일제 때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한국인들의 능력이 향상됐고, 한국이 발전하는 데 이것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맨 파워'론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 주장이다. 어쨌건 해방 이후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한국이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중석 : 8.15 당시에는 대학이 갑자기 늘어나서 19개나 된다. 통계를 보면 대학생 숫자가 7819명으로 나와 있다. 1952년에는 3만2542명, 1955년에는 대학 숫자도 많이 늘어나서 53개 학교에 7만8649명, 그리고 4월혁명이 난 1960년에는 남학생 8만770명, 여학생 1만7049명 해서 총 9만7819명으로 통계가 나온다. 대학생 숫자는 그 뒤에 엄청나게 늘어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시기에도 일제 때와는 비교가 안 된다.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비교한 통계가 있는데, 거기서 한국은 수준이 아주 높게 나온다. 1955년에 인구 10만 명당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일본은 470명으로 나와 있는데, 한국은 177명이고 대만은 그 반절인 88명밖에 안 된다. 버마는 18명, 인도는 영국이 해놨기 때문에 112명이었다. 1960년 통계를 보더라도 일본은 750명, 한국은 367명, 대만은 많이 올라와서 329명인데 한국보다는 적었다. 버마는 63명, 인도는 220명이었다. 그러니까 교육 수준에 의해서 아시아에서 한국과 대만이 일본 다음으로 경제 발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한 번 생각해봐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특히 독일하고 일본은, 독일이 더 심했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폐허이지 않았나. 공습 때문에 제대로 된 도시가 거의 없지 않았나. 그 정도로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경제도 똑같이 어려웠다. 그런 속에서 어떻게 그런 기적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했느냐. 전 세계적으로 독일과 일본처럼 교육 수준, 교육열이 높은 나라도 없지 않나. 그게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게 한 기본 동력이었다. 어떤 한 사람이 한 게 절대로 아니다. 그런 기본적인 밑바탕이 있었으니까 독일과 일본이 그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다. 제일 큰 힘은 교육에 있었다.
한국의 경우 전쟁 중에도 전시 수도 부산에 서울에서 피란 온 각급 학교들이 임시 학교를 개설했다. 그러면서 천막이나 벽돌만 둘러친 가교사(假校舍)에서 수업을 하는 눈물겨운 광경을 볼 수 있었다. 전쟁이 끝난 후부터 교육열이 본격적으로 불붙었는데, 교실이 부족했고 교육 시설이 파손되거나 부실한 데가 많았다. 도시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어서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해 서로 교육을 받으려고 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 대도시를 보면 한 교실에서 70명, 80명씩 배웠다. 이건 1960년대에도 그랬다. 한 학급이 100명 이상 되는 학교도 꽤 많았다. 일류 국민학교라고 불린 곳 중에는 한 학급이 120명에서 130명이나 되는 데도 있었다. 당시 신문에서 그런 내용을 나도 자주 봤다. 이른바 일류 학교일수록 2부제, 3부제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생이 하도 많으니까 하루에 교대해가면서 가르친 것이다. 100명이 넘는 학생들을 2부제, 3부제로 가르치고 그랬다. 하나의 학교 교정에 두 개의 학교 이름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 경우 이건 도대체 몇 부제 수업을 한 건가를 얘기할 수 없을 정도였다.
교육열이 빚은 부작용, 수험 지옥과 '사모님' 치맛바람
프레시안 : 교육에 대한 열정은 한국이 도약하는 데 기본적인 힘으로 작용했지만, 부작용도 많았다.
서중석 : '좋은 학교만 가면 된다. 그러면 출세하거나 돈을 벌 수 있다', 이것이 한국인한테 너무나 크게 자리 잡다 보니까 교육열이 아주 심하게 과잉됐다. 그래서 서로 다 이른바 일류대를 가려고 했다. 일류대를 가려면 일류고를 가야 하는 것이었다. 서울에 있는 학교들이 일류에서 사류, 오류까지 분류돼 있지 않았나. 지방에도 중요 도시마다 다 일류고가 있었다. 일류고에 가려면 일류 중학교에 가야 하는 것이었고, 일류 중학교에 가려면 또 일류 국민학교에 가야 하는 것이었다. 이건 서울이건 부산이건 대개 다 그랬다. 서울에서는 덕수, 수송 같은 곳이 일류 초등학교로 꼽혔는데 이런 데는 서울 사람이 주로 갔다.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약간 돈이 있더라도, 서울 중심에서는 그 당시에 변두리로 불렸던 혜화나 서대문에 있던 학교 같은 데 갔다. 지방에서 올라와서 그렇게 했다. 그 당시 덕수국민학교는 아무나 못 갔다. 거기가 2부제, 3부제가 있었고 한 학급에 130명까지 있고 그랬다.
이렇게 계열화가 되면서 한국 특유의 수험 지옥이 생겼다. 과외가 지독했다. 과외도 원래는 시험을 잘 보라는 수험 지도 중심이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다른 부문까지 파급되면서 어머니들이 너무 심할 정도로 이런 것을 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이 시기에는 그야말로 '빽', 돈이 좌지우지했다. 1950년대, 1960년대는 그런 사회였다. 거기서 그 유명한 '사모님'이라는 말이 생겼다. 치맛바람이라는 게 학교를 휘저었다. 사실 이 치맛바람은 학교만이 아니라 사회까지 휘젓고 다니고 그랬다.
1950년대 후반에는 일류 중·고등학교 교장은 문교부 장관도 마음대로 못했다. 문교부 장관이 발령을 냈는데 중학교 교장이 이동을 안 해버리는 일도 있었다.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싶지만, 실제로 그랬다. 그러다 나중에 문교부 장관이 취소를 해버렸다. 이게 다 '빽'의 사회라 그런 것이었다. 이기붕을 비롯한 자유당 최고 권력자들이 관련된 문제였는데, 하여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한 제일 큰 이유도 교육이었다. 교육만 받으면 된다고 해가지고 다들 서울로, 대도시로 그렇게 몰려든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인구가 집중하는 것은 분산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왜냐하면 시쳇말로 머리 싸매고 덤벼드는 식이기 때문에 간단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었다. '일류 대학에 가야만 한다. 그래야 취직이 잘된다' 하는 세상에서는 그런 게 안 풀리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걸 볼 수 있다.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여든네 번째 편도 조만간 발행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