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일단 장벽이 무너지자, 그것은 세계를 동서로 가르던 40Km의 얼음 장벽이 아니라 40Km짜리 거대한 콘크리트 더미가 됐다. 콘크리트 파편 위에 서서 "뷔어 진트 아인 폴크(Wir sind ein Volk, 우린 하나의 국민이다)"라고 외친 동독의 20대 청년은, 30년이 흐른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 근본적인 질문을 들고 <프레시안>이 2018년 독일을 찾았다. 그리고 한반도를 돌아보는 기획을 만들었다.
☞프레시안 독일 통일 기행 특별취재 [장벽 너머 사람들을 만나다] 전편 읽으러 가기
이 르포가 <환상 너머의 통일>(숨쉬는 책공장)이라는 책으로 묶여 나왔다. 동독인의 관점에서 본 동서독 통일에 대한 책이다. <프레시안> 이대희 기자와, 이재호 기자가 함께 썼다. 무너진 베를린 장벽의 파편 위에 올라서 통일을 그릴 때 우리는 보통 남한의 정치 경제 체제로 북한을 흡수하는 방식을 떠올린다. 북한 사람의 관점에서 그러한 통일을 본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를 상상해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북한 이탈 주민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의 통일, 즉 서독으로의 흡수 통일을 경험한 동독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다. 지난 25일 합정 북 카페 ‘디어라이프’에서 <환상 너머의 통일> 북토크가 진행됐다.
저자들은 급격한 흡수 통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독인의 삶을 전하며 "통일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한 사람이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이야기했다. "동서독 통일에서 활발한 교류만은 배워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완전히 낯선 체제에 던져진 동독 사람들
우리에게 익숙한 동서독 통일의 서사는 서독의 서사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이 하나로 통일됐다. 독일은 통일 비용을 치르느라 한때 '유럽의 병자'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고생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탄탄한 통일 국가로 다시 섰다"는 것이다. 이대희 기자는 여기에 독재 정권과 싸운 동독 시민의 민주화 시위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짚었다.
"통일 직전에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동독에 개혁개방 압력을 넣고 있었어요. 철저한 공산혁명을 이어가려던 동독 정부에 맞서 동독 민주화 세력이 시위를 벌였죠. 기존 공산당을 축출하고 새 정부를 만들려 하고 있었어요. 동독 민주화 세력 입장에서 보면 '나라를 새로 만들려 하고 있었는데 통일 당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민주 동독과 민주 서독이 동등한 입장에서 통일을 준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동독은 통일 이후 급작스럽게 서독의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됐다. 대표적 사례가 통일청을 통한 서독 자본의 동독 기업 구조조정이다. 10만여 명이 살던 도시 예나에 위치한 칼 자이스라는 기업에서는 6만여 명의 직원 중 5만여 명이 해고당했다. 많은 수의 동독인이 "통일이 됐으니 필요 없겠다"며 동독 정부에서 발급받은 노동자 카드를 버리는 바람에 그동안 일했다는 근거가 사라져 연금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재호 기자는 이 같은 일을 겪으며 동독인이 느낀 상실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통일 당시 중고생 정도 되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교생 800명 중 동독인이 3명 정도인 학교에 다녔는데, 서독 친구들이 자신을 신기한 듯 봤대요. 동물원의 동물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고, 자기 말을 이해한다고 느끼지 못했대요. 그런데 서독 친구들에게는 통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였대요. 동독인 입장에서는 시스템이 바뀌고 인생의 큰 기로에 선 순간인데 서독인의 일상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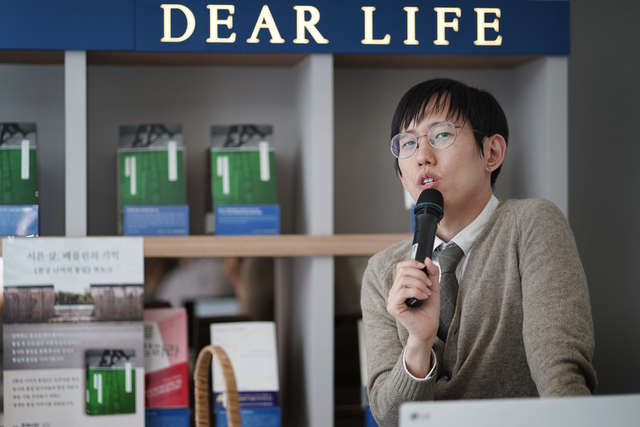
30년간 해소되지 않은 동서독의 격차
동독인이 서독의 체제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았다. 동서독 지역의 경제 격차가 이를 보여준다. 2017년 동독 지역의 경제력은 서독 지역의 75%였다. 동독 지역의 평균 임금은 서독 지역의 81%였다.
동독 정부가 2018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동독인의 57%가 자신을 '2등 국민'이라고 느낀다. 이대희 기자가 제시한 독일의 엘리트 구성 비율 통계는 동독인의 '2등 국민'이라는 느낌에 근거를 제공한다.
"2012년 베를린사회과학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통일 독일 엘리트 중 95%가 서독 출신이래요. 동독 출신은 2.8%에요. 그럼 나머지는? 외국인이에요. 30여 년이 지나도록 동독 출신이 엘리트가 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혀 있는 거죠."
동독인의 불만은 극우의 득세로 표출됐다. 삶이 힘든 원인을 사회적 약자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다. 이대희 기자는 한때 사회주의 세력이 강해 '붉은 작센'이라고 불렸던 작센 주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전했다.
"동독 지역에 있는 작센 주는 옛 독일에서 가장 잘 살던 주였어요. 나치 독일 때 군수 생산이 주로 여기에서 이뤄졌고요. 커트 보네거트가 쓴 <제5도살장>의 무대인 드레스덴도 작센 주에 있습니다. 마르크스 두상으로 유명한 켐니츠도 작센 주에 있고요. 그런데 지금 독일에서 극우 집회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 작센 주라고 해요."
저자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옛 동독에 대한 향수가 일고 있으며, 동독인들 사이에 "동독 지역 제품을 사자"는 식의 소비 풍조도 있다고 말했다. 이대희 기자는 "그럼에도 대부분의 동독인은 다시 갈라지기보다는 동독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완전한 통일을 바란다"는 말을 덧붙였다.

통일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가
우리는 동서독 통일에서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을까. 저자들은 급격한 흡수통일의 진통을 겪고 있는 독일의 학자들이 "한국과 독일은 역사가 너무 다르고, 독일 통일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해 내부 식민지화한 나쁜 통일이라 배우면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저자들은 "꼭 통일이 아니더라도 배울 게 왜 없겠나. 동서독은 계속 교류했다"는 정범구 독일 대사의 말을 인용하며, 동서독의 활발한 교류에서는 배울 것이 있다고 말했다.
"통일 전 동서독에서는 상대 지역에 사는 가족이 팔순, 졸업식, 결혼식 같은 걸 한다고 하면, 사유를 적어내고 갈 수 있었어요. 서독은 동독인의 방문을 늘리려고 여비 차원의 돈을 주기도 했대요. 우리는 이런 교류가 전혀 없죠. 결혼식이 웬 말이에요. 살아있는 것도 확인이 안 되는데."
남북 교류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양국 정부만이 아니라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의 거리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대희 기자는 남한 적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북한 이탈 주민의 이야기를 통해 이를 전했다.
"북한 이탈 주민 한 분이 자기는 돈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직장에 다니는데 제일 어려운 게 말이었대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가 힘들었대요. 한국어인데 명사가 전혀 다르더라는 거죠.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도 일상에 오면 외국에 떨어진 것 같았대요. 그 정도로 남북에 차이가 있다는 거고, 통일이 된다면 이런 부분이 큰 문제가 되겠죠."
이대희 기자는 독일 사례에서 배울 점이 한 가지 더 있다면, 활발한 교류라는 큰 그림만큼이나 작은 그림도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독일에 다녀오고 북한 이탈주민을 만나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큰 그림만큼이나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북한 이탈 주민을 비롯한 북한 사람을 우리와 대등한 사람으로 보고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소수자나 약자를 보는 우리의 시선도 함께 점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