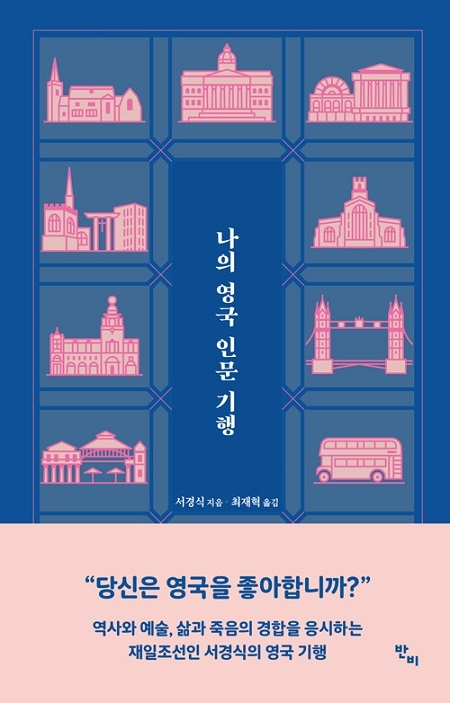
마른 몸매의 한 흑인 남성이, 왕 앞에 당당히 섰다
[최재천의 책갈피] 서경식 <나의 영국 인문 기행>
2007년 영국의 노예무역금지법 통과 200주년 기념식이 엘리자베스 여왕과 토니 블레어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렸다. 그런데 기념식이 한 흑인 남성의 항의로 일시 중단됐다.
일본에 있었던 저자 서경식은 텔레비전을 통해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한다. 마른 몸의 그가 엄숙한 분위기의 식장 가운데로 걸어 나와 여왕을 비롯한 단상 위 고위층을 향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결코 격앙된 어조는 아니었다. 바로 경비원에게 제압당하면서도 당당한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그가 끌려 나간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기념식은 담담하게 이어졌다. '그야말로 영국이다.'라고 생각했다.
"그랬던 예전의 대영제국은 지금 유럽연합 탈퇴 문제를 둘러싸고 대혼란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다. 길었던 몰락 과정의 최종 국면일지도 모른다. 이 과정은 앞으로도 많은 비극과 함께, 숱한 '인문학적 물음'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런 질문 자체가 나를 매혹해 마지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책은 <나의 영국 인문 기행>이 됐다. 그럼에도 저자의 상징성이 <나의 서양미술 순례>에서 비롯되었듯, 독자로서 역시나 끌려가는 쪽은 '미술 순례'다.
"차창에는 평탄한 전원 풍경이 펼쳐진다. 높은 산이 없고 바다가 멀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넓은 하늘에는 구름이 끝없이 움직인다. 존 컨스터블(John Constable, 1776~1836)이 그린 풍경화 같다. 영국에 올 때마다 나는 항상 컨스터블의 풍경화를 떠올린다. 반대로 컨스터블을 볼 때마다 '이게 바로 영국이지.'라고 생각한다. 내 속에 만들어진 하나의 스테레오타입이라고나 할까."
중학교 때 아버지께서 가져오신 달력에서 컨스터블의 풍경화를 처음 만났다. 그땐 컨스터블의 그림인지 몰랐다. 컨스터블의 풍경화는 나에게도 일종의 '스테레오타입'이 되고 말았다. 컨스터블이 호명되면 당연히 터너가 따라 나와야 한다. 영국을 대표하는 위대한 풍경화가 터너와 컨스터블은 거의 동시대를 살았다.
그렇지만 두 사람의 작품이 주는 인상은 전혀 다르다. "컨스터블을 정(靜), 평화, 조화라고 한다면, 터너는 동(動), 투쟁, 혼돈이다. 전자를 삶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죽음이다." 어째서 이렇게까지 대조적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저자에게 컨스터블이 '마음에 드는' 화가라면, 터너는 ‘마음을 술렁이게 하는’ 화가다. 그래서 저자는 더욱 터너에게 끌린단다. 하지만 난 아직도 컨스터블이 주는 목가적인 풍경을 그리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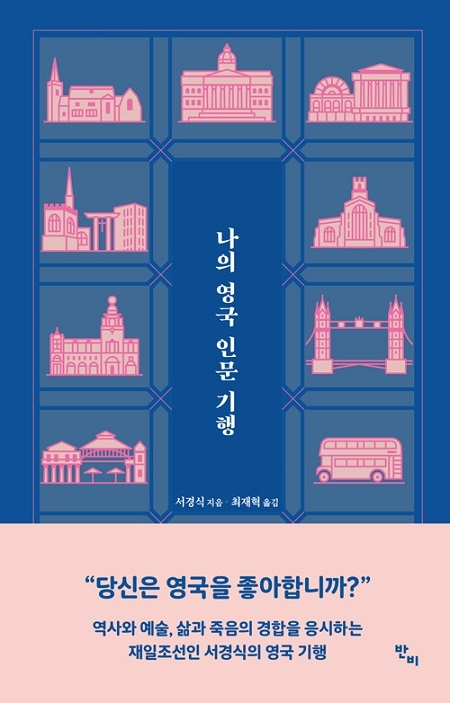
프레시안에 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