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어두컴컴한 곳이다. 이렇다 할 조명도 없다. 그렇게 어두운 공간 속에서 노동자 한 명이 손 랜턴 하나에 의지해서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있다. 컨베이어 벨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고착탄'이 벨트에 끼이면 작업이 중단된다. 벨트에 끼인 석탄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고착탄만이 아니다. 벨트가 다른 방해 요소로 멈추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그런 그가 의지하는 거라곤 손에 들린 랜턴 하나다. 그는 그 넓은 공간을 홀로 돌아다니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8시45분, 사고 직전 찍힌 고 김용균 씨의 CCTV 모습이다. 그리고 그는 정확히 7시간 뒤,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다. 그렇게 어두운 공간에서 고착탄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컨베이어 기계장치에 몸이 끼여 사망했다.

"그렇게 인간 취급 못 받고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의) 동료들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그 위(원청)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좀 밝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자기들 일이 아닌데 너네(하청)들 일이니까, 너네들이 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고인의 어머니는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인간 취급 못 받고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라고 분노했다.
고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니, 2011년 조선소 하청에 위장 취업했던 일이 다시금 생각났다. 기자는 조선소 하청 노동자의 노동 실태를 취재하기 위해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업체에 취업을 한 적이 있다. 그때 기자가 일했던 공간도 어찌 보면 고인의 작업 현장과 비슷했다.
그곳에서 일하던 첫날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사방이 꽉 막힌 공간.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있으나 마나한 조명 불빛을 따라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세한 먼지와 철가루가 떠다녔다. 환풍은커녕 햇볕조차 비집고 들어올 구멍이 없다. 바닥은 드릴과 철사 등 각종 장비와 자재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어지러웠다. 어두운 조명 때문에 걷다가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면 바로 자빠질 것만 같았다. 곳곳에서 용접 불똥이 폭포수처럼 떨어졌다. 매캐한 냄새의 주범이다. 철가는 소리, 드릴 박는 소리, 쿵쿵 울리는 망치 소리, 철과 철이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파열음이 쉴 새 없이 귓구멍을 때렸다.
그나마 기자는 2인1조로 일을 했다. 사수가 기자가 내 옆에 늘 붙어 있었다. 기자가 기대하는 마지막 보루였다.
하나같이 무표정한 얼굴을 한 노동자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하늘색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푹 눌러쓴 안전모와 눈언저리까지 한껏 올려 쓴 마스크까지 하나같다. 1층에서 용접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3층에서 철을 절단하고, 옆에서 페인트칠을 하던 사람이 어느새 2층에서 청소를 하고 있다. 모두가 비슷해 보이니 드는 착각이다. 눈매만으로 그 사람이 하나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보려면 얼마나 많은 눈빛을 주고받아야 할지 생각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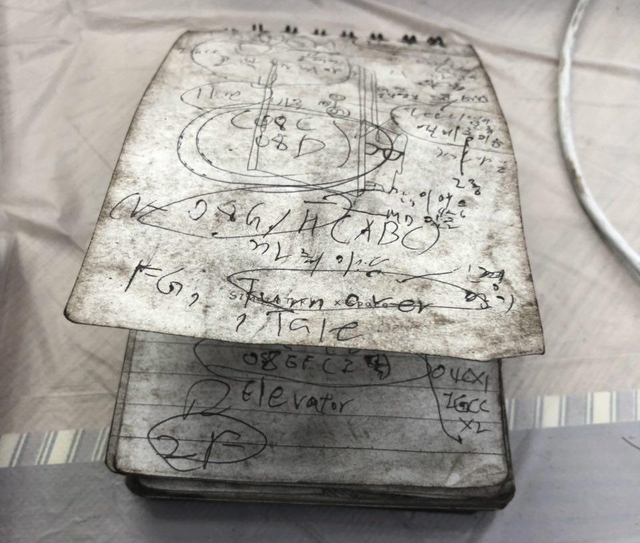
사람이 일회용 물건인가
열악한 작업환경인지라 사고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기자가 일하던 중에는 40대 여성이 6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반신불수 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족장에 묶인 철사나 나사를 푸는 건 안전 요원이 금지하지만 작업 편의를 위해 잠시 풀고 다시 묶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사고는 작업자가 깜박 잊고 풀어놓은 철사를 깜박 잊고 다시 묶어 놓지 않아서 발생했다.
어두운 작업환경은 이러한 사고를 더욱 부추긴다. 기자도 일하다 여러 차례 넘어져서 수십 미터 아래로 곤두박질 칠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다. 그때마다 좀 더 작업장이 밝았으면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자가 속한 하청업체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원청은 '니네가 일하는 공간이니 우리는 알 바 없다'는 식으로 무시했다.
"우리 아들도 그렇게 일하는 줄 알았어요. 현장이지만 깨끗하고 안전한 곳인 줄 알고, 우리 서로 이제 괜찮은 직장 잡고 일만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제가 보고 나니 완전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접받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건 사람이 일회용인지, 물건인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없으면 또 하나 채워 가동하면 되니까. 이게 뭡니까?" 고 김용균 어머니
고인 어머니 말마따나 하청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간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조명불빛 하나조차도 밝게 비추지 못하는 공간이다. 그마저도 하청과 원청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노동자들의 안전을 방치한다. '하청-파견' 구조가 이를 고착화하는 셈이다.
고인의 마지막 모습담은 CCTV가 공개됐다. 그 영상에서 고인은 열심히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를 살피고 있다. 어둡기 그지없는 공간에서 그가 의지할 것은 사수도, 환한 조명도 아닌 손전등이 고작이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고인과 마찬가지의 또다른 '김용균'이 작업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다.
돈을 아끼기 위해 노동자를 위험으로 떠민다. 그게 더 싸게 먹힌다고 생각할 것이다. 실제로도 그럴 것이고. 우린 언제까지 이런 사회에서 살아야 하는걸까.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