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대상으로 선정된 고전 50권은 "우리에게 맞춤한 우리 시대"의 과학 고전을 과학자, 과학 담당 기자, 과학 저술가, 도서평론가 등 여럿이 머리를 맞대고 2015년에 새롭게 선정한 것입니다.
가끔씩 과학 책께나 읽었다는 자칭 '과학 애호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속으로 피식 웃을 때가 있다. 주로 외국 저자가 쓴 과학 책을 읽었다고 자랑스럽게 열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듣다 보면 허점투성이이기 때문이다. 과학 분야가 편중되기 십상인 데다, 결정적으로 과학 애호가라면 꼭 접했어야 할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이강영의 [LHC, 현대 물리학의 최전선](사이언스북스 펴냄)을 안 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면, 참다못해 이렇게 반문하곤 한다.
"아니, 한국인 과학자가 (일반인을 위해) 쓴 최고 수준의 책을 아직도 안 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답변이 나온다.
"그 책은 그냥 LHC 소개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도구를 소개하는 책이 무슨 과학 책이라고."
20세기 물리학, '이론'과 '도구'의 앙상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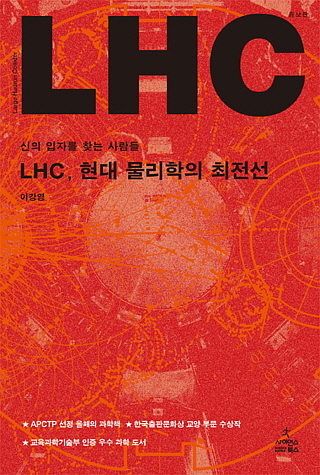
현실에서 이 양쪽 입장이 또렷하게 대비될 수 있을까? [LHC, 현대 물리학의 최전선]은 내용과 구성 두 가지를 통해서 이 다이슨의 질문에 답하는 책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앞에서 언급한 그 과학 애호가의 말대로 [LHC, 현대 물리학의 최전선]의 열쇳말은 '도구'인 LHC(Large Hardron Collider, 대형 강입자 충돌기)이다. 하지만 이 책을 '신의 입자(힉스 입자)'나 그것의 발견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도구인 LHC가 입길에 오를 때, 유행에 부응하고자 즉석해서 만든 것이라고 오해한다면 큰 실수이다.
과학을 넘나드는 박학다식함을 자랑하는 이강영은 이 책을 데모크리토스 같은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책은 만물의 근원을 찾는 인류의 지적 여정 속에 LHC를 위치 짓고 있다. 자연스럽게 이 책의 전반부는 19세기 존 돌턴의 원자론부터 시작해 최근의 입자 물리학의 성과까지 개괄한다.
이 과정에서 원자가 전자와 원자핵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 또 그 원자핵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었다는 수준의 과학 상식은 물론이고, 그보다 훨씬 작은 입자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유추되고, 발견되었는지 훑는다. (사이사이에 20세기 물리학계 슈퍼스타 과학자의 뒷담화는 덤이다.)
당연히 이런 입자들의 확인은 '이론'과 '도구'의 절묘한 합주를 통해서 가능했다. 이론 물리학자들은 입자의 존재를 예측했고, 20세기 들어서 그 존재가 또렷해진 실험 물리학자들은 그렇게 예측된 입자를 발견했다. 다이슨이 '이론'과 '도구'의 경쟁이라고 불릴 법한 과학사의 새로운 장이 어떻게 열렸는지 이 책은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러니 이 책의 전반부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읽을 수 있다. 입자 물리학의 재미있는 입문서로 읽을 수도 있고(강의용으로 제격이다!), 입자 물리학의 여러 성과를 가능하게 한 실험 도구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에 초점을 맞춰도 흥미롭다. 나 같은 경우는 '이론'과 '도구'의 앙상블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증언하는 간략한 과학사 책으로도 읽었다.
(물론 힉스 입자의 발견을 가능케 한 이론이었던 표준 이론이 어떻게 정립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대목은 특수 상대성 이론, 양자 역학, 게이지 대칭성 등과 같은 20세기 현대 물리학의 핵심 이론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을 경우에는 단숨에 이해하기가 버겁다. 하지만 무식하게(!) 그냥 읽어나가도 큰 흐름을 따라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LHC에서 WWW를 발명했다고?
물론 이 책의 주인공인 LHC도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책의 후반부는 LHC를 설치, 운영하는 기관인 세른(유럽입자물리학연구소)과 LHC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백미다. 이강영은 자신이 직접 세른에서 공동 연구를 해본 경험을 바탕에 두고 이 기관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샅샅이 훑는다.
유럽연합(EU)을 염두에 두더라도 이례적인, 국민 국가의 틀을 깬 공동 과학 연구 기관 세른은 어떻게 탄생하고, 발전했나? 미국도 예산 문제 때문에 포기한 세계 최대의 입자 가속기가 세른에 설치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세른의 미래는 과연 밝은가? 이 책은 이런 결코 간단치 않은 질문에 나름의 답을 내놓는다.
특히 이 대목을 읽으면서 독자는 지금 입자 물리학의 최전선에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어떻게 과학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감을 잡을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대다수 시민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과학의 결과만 소비하기 십상인데, 사실 중요한 것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과학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이강영은 세른 과학자의 록 밴드 같은 취미 활동을 소개하는 등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전 세계 수천 명의 과학자가 협력해야 하는 공동 연구가 세른을 중심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한다. 이런 세른의 과학 활동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수천 명의 저자를 가진 과학 논문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어떤 독자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한국 사회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창조'나 '혁신'이 왜 어려운지에도 생각이 미칠 것이다. 단적으로, 물리학을 연구하는 세른에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월드와이드웹(WWW)'이 탄생했다. 그런 일이 물리학이나 천문학을 연구하는 우리나라의 정부 산하 연구 기관에서 가능할까?
왜 대형 입자 가속기를 지어야 하는가?
본문만 600쪽에 가까운 대작이다 보니, 이강영은 이 책의 말미에서 나름의 욕심까지 부려 놨다. 바로 여전히 과학자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는 현대 물리학의 난제를 열거해 놓은 것이다. 이 대목을 통해서 독자는 지금 이 순간 현대 물리학의 최전선에 선 과학자들이 어떤 질문을 놓고서 고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질문이 이 책의 마지막에 오는 것은 참으로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어 놓은 LHC가 (이미 수십 년 전에 이론적으로 예측된) 힉스 입자를 확인하는 데서만 멈춰서는 그 존재 이유에 심각한 회의가 들 테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쩌면 지금 '도구'가 '이론'을 선도하는 정말로 새로운 과학 시대를 목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LHC야말로 그 증거고.
마지막 질문 하나. LHC와 같은 엄청난 규모의 도구로 대표되는 현대의 거대과학에 우리는 기꺼이 세금의 일부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까? (LHC는 건설비 10조 원에 연간 운영비가 2500억 원을 넘는다!) 과연 이런 연구는 우리의 삶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결국 좌절한 미국의 대형 입자 가속기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로버트 윌슨은 냉전이 한창이던 1969년 이렇게 답했다.
"가속기는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화가인가, 좋은 조각가인가, 훌륭한 시인인가와 같은 것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나라에서 우리가 진정 존중하고 명예롭게 여기는 것, 그것을 위해 나라를 사랑하게 하는 것들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새로운 지식은 전적으로 국가의 명예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