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10월 14일에 올린 김영현의 "이것은 '표절 시비'가 아니다"라는 기고문을 보고 참 명문이고 유려하다고 생각했다. 역시 중견 작가가 다르긴 다르다고 혀를 내두르며 읽고 또 읽었다. 그런데 읽어갈수록 공허하다. (☞관련 기사 : "문학이여, 나라도 먼저 침을 뱉어 주마")
그러고 보니 기고문의 제목도 이상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뭐를 지껄여왔는가? 바로 표절 시비가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별안간 표절 시비가 아니란다. 나는 기고문에서 주이란과 조경란의 소설을 소제목 하에 언급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표절이 맞는가'라는 또 하나의 소제목으로 어리버리한 내 느낌마저 피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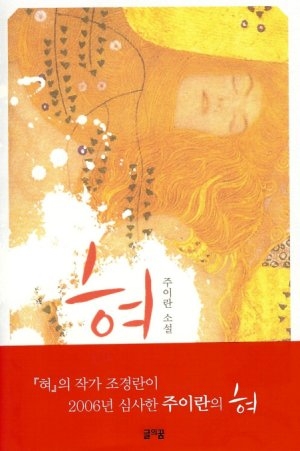
|
과연 조경란의 작품 겉표지에 붙은 '사랑하는, 맛보는, 거짓말하는 혀'라는 글이 내용과 맞는가, 나는 이 글이 주이란의 작품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문구인데, 조경란이 끌어다 붙였다는 의문을 던졌고, 엽기적인 혀의 절단 장면에서는 어느 작가의 글을 읽는지 구분이 안 간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런데 이틀 만에 올라온 기고문을 통해 김영현은 한참 주절주절 하다가 '문단 권력'이라는 엉뚱한 곳에 머리를 처박아 '문학 독립 만세'를 외치고 말았다.
지금 문학 독립 운동을 하자는 말이 아니다. <프레지안>에서 벌어졌던 사건의 진행은 이렇지 않았는가? 주이란의 호소문이 올라왔다. 이에 방현석이 "매력 없는 공방" 운운하며 발을 뺐다. 침묵을 견디지 못한 홍세화가 분통을 터뜨렸다. 뒤이어 김곰치가 뛰어들어서 어느 구석의 뭐가 표절인지 설명은 부족했지만, 전체의 흐름이 표절이라고 단정 짓고 주이란의 손을 들어줬다.
그 후에 나는 조경란이나 <동아일보> 또는 다른 작가의 해명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다가 답답해, 독자의 입장에서 한번 내갈겼다. 그랬더니 김영현의 길고 비통한 사설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마치 1905년 11월 12일 <황성신문> 2면에 실렸던, 멸망해가는 조선의 황성옛터를 통곡했던,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과도 같다.
그렇다. 사방이 적요해도, 문학의 신이 죽어도, 남이 뱉기 전에 자기가 먼저 침을 뱉어도, 자본에 길들여진 문단 권력에 의해서 작가 정신이, 모두 뒈져도 다 좋다.
그러나 요점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작가 지망생이 응모했다. 심사 결과 당선되지 못했다. 그 후에 그 작품을 심사했을 법한 심사위원의 작품이 나왔다. 신인 작가가 보니 꼭 자기 작품을 표절한 것 같았다. 억울한 심정에 심사위원과 접촉을 시도하며 항의를 해봤지만 소용없었다. 그래서 울고불고 다니다가 언론에 호소했다.
그러니깐 이 사안은 간단하다. 책임 있는 작가들이 나서서 표절인가 아닌가를 가리면 된다는 결론이다. 혹자는 법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법관은 문학의 문외한이기에 궁극에는 믿을 만한 기성 작가에게 그 판단을 의뢰하게 마련이니, 마지막에는 작가가 이 표절 논쟁의 최고 심판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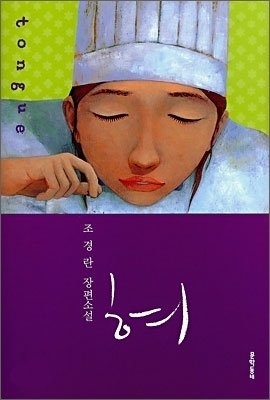
|
김영현은 한국 문단의 중견 작가가 아닌가. 주변이나 독자의 의문에 해답을 줘야만 하는 책임 있고 냉철한 작가란 뜻이다. 김영현은 표절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적으로 김곰치의 불분명한 글에 의지하지 않고, 더욱 논점을 명확하고 분명히 해, 구체적으로 두 작품의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하며, 문학에 있어서 표절과 패러디의 경계가 어떻고 현대 문학의 흐름이 이러니, 조경란의 작품은 표절이라는 등, 아니면 표절로 볼 수 없다는 등, 중견 작가라는 전문가로서의 작품 감정서를 코앞에 내밀었어야 했다.
나는 내 기고문을 올리고 나서 아차 했다. 기고문 댓글에 '표절이라고 주장할 만한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이었다. 사실 조경란의 <혀>에서 표절이라고 딱 단정 지을, 그러니깐 주이란의 문장을 고스란히 옮겼다든가, 줄거리를 그대로 모방했다는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25쪽에 불과한 단편 소설을 300쪽이 넘는 장편으로 물을 타고 구도를 바꿔서, 주이란 소설의 뉘앙스와 줄거리와 배경을 교묘하게 이리저리 흩어뜨려 숨겼다는 느낌은 강했다. 그래서 이 표절 논쟁의 중점이 바로 '아이디어 도용'이 아닌가, 더구나 조경란은 주이란의 작품을 심사했던 위원이었다니 말이다.
나는 김영현의 울분을 안다. 공감하는 바도 크다. 그러나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할 표절 문제를 일반적인 공분으로 휩싸고, 막연히 하늘에 대고 주먹질하는 분위기로 몰아가서, 문단 권력이라는 추상성에 올인 시키면 곤란하다. 정말이다. 논점을 흐려 종식시키려는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다. 더구나 김영현은 '시대와 불화하는 포즈를 잡지만 사실은 시대와 잘 야합하는' 그 반동적인 무리들을 질타하지 않았는가.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