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4년, 모 기업에서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1년 반, 인사동의 작은 화랑에서 다시 1년 반을 일했다. 대략 7년 남짓 미술계의 언저리를 맴돌았다. "쉽게 써진 시를 부끄러워" 했던 윤동주 시인처럼, 그간 만났던 작가들은 '쉽게 만들어진 작품을 부끄러워하듯' 치열하게 작업했다. 겉으로는 시쳇말로 '한량'처럼 보였던 이도, 조금 더 가까이 삶을 들여다볼라치면 작업에서만큼은 피와 땀, 눈물을 쏟아내며 몰두했다.
꿈은 그저 꿈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차라리 다행이었다. 평생 나 자신을 쥐어짜며 살아갈 용기도 없었다. 그만큼 솔직하게 드러낼 자신 역시 없었다. 서서히 꿈과 멀어질 무렵, 열등감과 이유 없는 설움, 죄책감에 시달렸다. "참을 수 없는 현실의 고통을 겪는 이들이 알록달록한 예쁜 그림 앞에서 구토증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그림, 눈물을 닦다>(추수밭 펴냄)의 저자 조이한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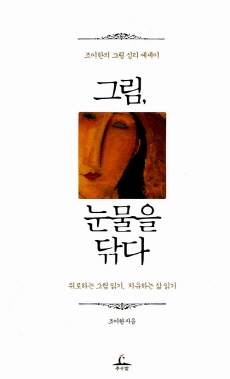
|
| ▲ <그림, 눈물을 닦다>(조이한 지음, 추수밭 펴냄). ⓒ추수밭 |
조이한의 표현대로 <그림, 눈물을 닦다>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삶의 무의미함에 대한 저항이나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몸부림이기도 하며, 벗어날 수 없는 고독과 절망과 슬픔에 대한 사색이기도 하고, 어떻게든 타인과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이기도 하다."(6쪽)
네 부분으로 구성된 책에는 모딜리아니의 <모자를 쓴 여인>이라든가, 오귀스트 르네 로댕의 <신의 손>, 베첼리오 티치아노의 <프로메테우스>, 르네 마그리트의 <연인>, 프란시스코데 고야의 <막대기를 들고 싸우는 사람들>, 빈센트 반 고흐의 <슬픔>이나 <해바라기>와 같이 어디선가 한두 번쯤은 보았을 고전도 있고,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광장>, 조지아 오키프의 <달로 가는 사다리>, 질리언 웨어링의 <나는 절망적이다>, 송연재의 <결혼의 상처>, 필립 라메트의 <사물들의 자살>, 공성훈의 <담배 피우는 남자> 등에 이르는 현대 미술까지 다양한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작품에 대한 배경 설명과 함께 저자 개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 서른여덟의 나이에 에이즈로 사망한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의 1991년 작품이 오래도록 시선을 사로잡았다. "마치 조금 전 사랑을 나누었던 것처럼 두 사람의 무게에 눌린 베개와 흐트러진 시트를 찍은 사진"을 옥외 광고판에 걸어 놓은 작품이다(106쪽). 작가의 의도를 모른다면 침대 회사 광고이거나, 괴짜 예술가의 장난기 있는 '쇼'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성애자였던 작가가 죽은 애인을 그리워하며 함께 했던 흔적을 소재로 작업했음을 알게 된다면, 그러니까 더는 볼 수 없는 사랑의 그리움을 눈치 챘다면 금세 작품이 달리 보일 터이다. 그뿐 아니라 <무제>혹은 <로스>라는 제목의 작품도 함께 보면 작가의 절절한 사랑과 외로움, 그리움에 어느새 빠져들지도 모른다.
조이한은 안나 멘타에타의 회고전을 보고 "잊고 있던 상처가 도진 것처럼 아릿했다"고 말했다. "보고 싶지만 동시에 보고 싶지 않은 이중적인 마음. 하지만 언젠가는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것 같은 상처"(36쪽)를 보았다고도 했다. 내게는 이중섭의 <돌아오지 않는 강>이나 에드바르트 뭉크의 <입맞춤>이 나만의 슬픔과 사랑, 기다림의 상징을 담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하여, 권태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는 뭉크의 <입맞춤>을 보며 자극받는다. 또한, 지나치게 흥분되어 있을 때면 이중섭의 <돌아오지 않는 강>을 꺼내 본다. 물론 인쇄도 불량한 화집일 뿐이지만 말이다.
이렇듯 "자신에게만 섬광처럼 꽂혀 가슴을 흔들어 놓는", "뭔가에 찔린 상처처럼 아파오는", "순전히 개인적인 경험에서 오는 것이기에 다른 누구에게 설명할 수도 없는" 작품을 찾아내는 일은 삶에 활력을 주지 않을까 싶다. 굳이 예술가의 개인사를 알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작가의 의도와는 별개로 작품을 감상하고 그것을 개인적인 경험과 연결 지어 마음대로 해석할 권리가 있"으니까.(128쪽) 그러니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작품을 골라 자신의 마음을 비춰보는 건 어떨까 싶다.
같은 이유로 <그림, 눈물을 닦다>는 텍스트를 먼저 읽기보다, 충분한 여유를 둔 채 이미지를 보고, 마음껏 상상하며 느리게 읽는 쪽을 권한다. 예술품 앞에 서면 머릿속이 하얘지거나, 일단 기부터 죽는다면, <그림과 눈물>(정지인 옮김, 아트북스 펴냄)의 저자 제임스 엘킨스의 말을 빌려 방법을 전한다.
"혼자서 그림과 대면하고, 모든 것을 보려는 욕심을 버리고,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서 집중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작품에만 충실하라." "남들이 해 놓은 말을 기웃거리며 눈치 보지 말고 자신이 본대로, 자기 느낌 그대로 말할 것. 그리고 그림이 자기에게 작용하는 것을 막지 말고 마음을 열고 바라볼 것." (209쪽)
한때 '미대 다닌 여자'였던 나는 조카나 친구가 느닷없이 예술가의 삶이나, 거리의 조형물에 관해 물어오면 가슴이 덜컹한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미술 관련 문제가 나오면, "야, 미대" 하고 부르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다. 모르는 게 태반이어서다. 한동안은 그네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다.
하여, 알고 있는 부분은 과장하고, 모를 때는 은근슬쩍 넘기곤 했다. 사는 게 피곤했다. 학부를 졸업한 지 10년도 훌쩍 넘었다. 미술계의 흐름도 몇 번 바뀌었다. '미대 나온 여자'도 모르는 게 당연하다. 다시 누군가 묻는다면, 그저 마음껏 보고, 멋대로 느끼고, 개인사와 연결 지어 감동하고, 감탄하면 되는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해야겠다. 예술은 그런 거라고 당당하게 말이다.
요즘도 집에서는 차례 상에 올릴 전을 만들 때면, 맛살 옆에 햄을 끼우는 게 좋을지, 단무지를 먼저 넣어야 할지 꼭 내게 묻는다. 어머님은 부침개나, 달걀을 부쳐야 할 때도 "야, 미대 나온 여자, 이거 예쁘게 해 봐라" 하신다. 조카들은 밑도 끝도 없이 교과서에 나온 작품을 들이밀고 이면의 의미를 묻는다.
물론, 내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때는 드물다. 그래도 언제나 그들은 찾고, 나는 긴장한다. 철없던 시절 '가난한 화가'를 꿈꿨던 바람은 지금도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