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에서 역사 교육은 찬밥 신세다. 한국사는 물론이고, 세계사 쪽으로 가면 더더욱 막막해진다. 최근 한국사의 경우 근대사는 아예 건드리지 않도록 하려는 '음모'까지 있었다. 역사 과목은 애초부터 암기 과목으로 인식되어 있고 역사적 사유나 지식을 체계적으로 쌓아나가는 훈련은 시도되는 일이 극히 드물다.
지난 2008년에 나온 현장 교사들의 글 모음인 <역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전국역사교사모임 지음, 휴머니스트 펴냄)는 그런 맥락에서 나온 고민의 산물이다. 이 책은 '세계사 교육 위기론'까지 지적하고 나섰다. 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에서도 역사 교육은 전공 과목인 경우를 빼놓고 무력한 상태에 있다.
전공의 경우에도 역사는 서양사가 짜놓은 틀 위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리스-로마-중세-르네상스-근대로 이어지는 공식 속에서 비(非) 서구를 이해하게 한다. 아시아는 이런 축에서 변방적인 위상을 지닐 뿐이다. 특히 16세기 이후 모든 것은 서구의 주도 아래 이뤄진 세계로 정리되어 버린다. 아시아는 이런 서구에 대한 대응에 실패해버린 모델일 뿐이다.
세계사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
조지메이슨 대학의 피터 스턴스(Peter Stearns)는 최근 미국 대학에 불고 있는 "세계사(World History) 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런 관점에서 대학 교육 전체를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관점으로 개혁하고자 <대학의 세계 시민 교육 : 도전과 기회(Educating Global Citizens in Colleges and Universitie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New York : Routledge 펴냄)라는 책을 지난 2009년 출간했다.
세계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현실을 바탕으로 세계 시민의 역량을 가진 인재 양성이 대학 교육의 축이 되어야 한다는 그의 논지는 단지 주장으로 그치지만은 않는다. 이는 대학의 행정 기능까지 포괄해서 거론하고 있어 매우 구체적이다. 그는 지구적 자본주의가 팽창하면서 만들어낸 지구적 네트워크의 현실과,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쇠퇴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세계 인류가 서로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함께 살아갈 지구 공동체를 목표로 설정한다.
이런 교육의 기초가 되는 것이 다름 아닌 세계사 교육이다. 여기서의 세계사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각 지역, 나라, 민족의 역사를 총망라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역사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를 만들고 또 각자를 만들어 왔는가를 보는 일이다.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른바 '지구적 연결 고리(global linkages)' 내지는 그 틀 안에서의 '상호 연관성(the story of connections within the global human community)'을 파악하는 작업이다.
이런 관점에서 쓰인 책으로 가장 뛰어난 저작은 노스이스턴 대학의 패트릭 매닝(Patrick Manning)이 쓴 <세계사 탐색(Navigating World History)>(New York : Palgrave 펴냄, 2003년)이다. 아직 국내에 번역되진 않았으나 피터 스턴스의 <세계사 입문(World History : the basics)>은 이러한 시각과 그간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200쪽이 채 안 되는 작은 책으로 세계사 교육 전반에 걸친 구상을 압축해냈다.
세계사 학회 창립 40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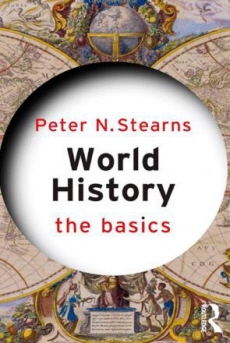
|
| ▲<세계사 입문(World History : the basics)>(Peter Stearns, Routledge). ⓒRoutledge |
세계사를 유기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은 1960년대에 구동독 라이프니츠 대학이 비교사학을 발전시키면서 그 초석을 깔았다. 1970년대 중반에 이르면 지구적 차원에서 비교사학이 보다 정교해지고, 세계 체제가 전면화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더는 유럽 중심의 역사 교육이 지구적 관점을 수립하는데 의미가 없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이는 서구 자신의 역사적 성찰과 반성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
사실 이러한 세계사 인식은 이미 1930년대의 아놀드 토인비가 내놓은 기념비적 저작인 <역사의 연구>가 그 선도적 역할을 했고, 뒤이어 1960년대 미국의 윌리엄 맥닐이 <서구의 등장(The Rise of the West)>을 출간하면서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두 인물 역시 여전히 서구 지향적 관점에 머물렀다는 한계로 인해 비판을 받았고, 이후 윌리엄 맥닐은 이슬람 역사의 세계적 학자로 단명한 친구 마샬 호지슨의 영향으로 방향을 비 서구까지 동일한 수준에서 포괄하는 세계사로 발전시켜나간다.
마샬 호지슨의 <세계사 재인식(Rethinking World History)>(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펴냄, 1993년)은 세계사 연구를 유럽 중심주의에서 탈출하게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말년에 16세기 이후의 세계 체제를 아시아를 중심으로 파악한 <리오리엔트(Re-orient)>를 쓴 안드레 군더 프랑크조차도 마샬 호지슨이 세계사의 총체적 연관 구조에 대한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고 토로할 정도였으니, 서구 역사학이 갇혀 있던 유럽 중심주의가 얼마나 강고했는지 알 수 있다.
'상호 유기적 관계망'에 대한 파악
피터 스턴스는 세계사 논쟁들을 정리하면서, 기원전 1000년 이전의 고대 문명의 세계적 연관성, 기원전 1000년에서 기원후 600년 이후의 시기까지의 고전적 문명의 형성기, 1450년대에서 1800년대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세계를 '상호 유기적 관계망'으로 파악해 들어간다.
가령 고대 이집트 문명이 지중해권, 아프리카 서남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과 어떤 관련을 맺고 서로 영향을 미쳤는지, 통일 중화 제국과 로마 제국, 페르시아 제국은 비슷한 시기에 서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상호 연관성을 맺었는지 등에 대해 연구한다. 12세기 아랍 문명권이 서서히 위력을 상실해가는 와중에 지중해 무역의 재부상, 인도와 남아시아의 세계 체제가 어떻게 형성되어갔는지도 정리해나간다.
피터 스턴스는 역사 교육에 시기 구분과 지리적 공간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면서, 특히 다양한 문명권을 비교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요구한다. 물론 이러한 작업은 방대한 지식에 대한 흡수와 장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까지 파악하고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작업의 책임은 전문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 역시도 교육 현장의 반응과 경험이 끊임없이 반영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재정리가 이뤄지면서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폴리비우스의 역사서 <로마 제국의 출현>
세계사라는 관점에서 쓰인 최초의 저작이라고 한다면 폴리비우스의 <로마 제국의 출현(The Rise of the Roman Empire)>라고 할 수 있다. 기원전 2세기 고대 그리스인으로 출생한 폴리비우스는 로마와 그리스의 마케도니아 전쟁 패전 이후 로마로 압송되었다가 그곳에서 로마 정치의 유력자 스키피온 가문과 연결된 이후 로마의 역사에 대한 연구에 몰두한다. 그의 관심은 지중해의 변방 국가에 불과했던 로마가 기원전 264년에서 146년 사이에 어떻게 거대한 제국이 되었는가에 있었다.
이걸 파악하기 위해 그는 지중해 동쪽 카르타고와 서쪽 그리스를 하나로 엮어서 '지중해의 세계사'를 쓰는 데 성공했다. 말하자면 폴리비우스의 관심은 알렉산더 이후 만들어진 헬레니즘 문명권이 어떻게 로마에 의해 해체되었고, 로마는 어떻게 해서 세계 제국의 틀을 만들어냈는가에 집중되었다. 이런 작업은 여러 가지 요소가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하나의 전체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오늘날 말하는 '세계사적 접근'이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의 경우는 역사 고전인 폴리비우스의 저작조차도 여전히 번역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다행스러운 것은 세계사 관련 교육서가 최근 많이 출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세계사 교육 논쟁과 운동이 밑바닥에서 전개되어나갈 때 보다 큰 대중적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올해 6월말 뉴멕시코에서 열리는 세계사학회의 주제는 "세계사 속의 邊境(변경)과 원주민(Frontiers and Borders in World History and Indigenous Peoples in World History)"이다. 기존의 서구 중심주의 역사관에서 배제되고 주변화된 지역과 존재들에 대한 역사적 관심을 재정리하겠다는 것이다. 세계사에서 오랫동안 주변적 존재처럼 여겨져 온 우리에게도 절실한 주제다.
우리 밖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세계 전체의 역사와 그 움직임을 총체적으로 포착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이와 같은 지적 열정과 의지는 당장의 현안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장의 현실을 파악하고 알아 가는데 너무도 절실한 능력이다. 오늘날 동아시아의 현실이 어떤 역사를 통해 형성되어 왔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걸린 문제 아닌가?
역사 교육과 교육 혁명
세계적 현실을 알고 성찰하며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세대를 기르는 교육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내야 할 숙제다. 인문 정신이 사라지고 있는 대학 교육의 현실에서, (1)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2)우리가 사는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가, (3)세계 시민으로서 실천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들을 축으로 만들어진 경희대학교의 '후마니타스 칼리지'가 하고 있는 교양 교육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 때문이 아닌가.
피터 스턴스가 세계사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의 연계를 중요시하면서 교육 혁명의 기치를 들어 올리고자 하는 것은 미국이라는 현실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모델이다. 당장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전국 역사 교사 모임'이 주체가 되어 세계사학회를 결성하고 교육 운동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내며, 각 대학이 인문 정신의 토대 위에서 세계사를 기본 과목으로 설정해서 교양 필수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는 개인과 공동체만이 미래의 방향을 정확히 잡아나갈 수 있다. 아니면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면서 비극의 드라마에 빠질 것이다. 그런데 그 비극은 사실 희극이다. 즐겁게 웃는 희극이 아니라, 슬라보예 지젝이 동원한 단어 'farce'처럼 조소당하는 어리석은 소극(笑劇)으로서 말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