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장을 넘기면서 내내 눈물이 났다. 시인 도종환은 "눈물의 시인"이다. 그런데 그는 또한 눈물로 꽃을 피운다. 그래서 그는 "꽃의 시인"이기도 하다.
"바람만이 아는 대답(Blowing in the Wind)"을 부른 '피터 폴 앤 메리(Peter, Paul and Mary)'는 "떨어지는 빗방울로 내게 햇살을 짜줄 수는 없나요?(Weave me the sunshine out of the falling rain?)"라고 애창했다. 그런데 도종환은 꽃잎을 적시는 빗방울 속에서 꽃의 향기가 되었다. 그의 책 제목은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이다. 도종환은 이 시대의 향기다.
그와 때로 산골 한적한 황토 집에서, 또는 때로 밤을 새며 술잔을 기울이는 중에 나름 들어 알고 있던 이야기가 활자로 박혀 나오니 새삼스러움을 넘어, 가슴이 아려온다. 이 책의 원고가 된 <한겨레> 연재를 이따금은 놓쳤던 탓에 내가 들었던 이야기는 사실 절반에 불과했고, 그 나머지 절반의 사연에 스며있는 시인의 삶은 내가 가늠했던 것 이상으로 아픔이었고, 고독이었으며 절박함이었다.
청춘의 빙하기를 거친 시인
시인 김수영은 그의 시 '거대한 뿌리'에서 여자처럼 앉는 김병욱이라는 시인에 대해 놀라워한다.
"8·15 후에 김병욱이란 시인은 두 발을 뒤로 꼬고 / 언제나 일본 여자처럼 앉아서 변론을 일삼았지만 / 그는 일본 대학에 다니면서 4년 동안을 제철 회사에서 / 노동을 한 강자(强者)다."
나는 김수영이 김병욱을 보고 느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가슴 저리는 여자처럼 애틋하게 웃고 세상물정 모르는 청년 같은 소박한 말투가 몸에 배인 시인 도종환이 담배 가마니를 나르는 노동을 한 강자라는 것을 알고 그의 시가 쉽게 쓰이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된다.
"겨울 방학 때는 나도 아버지처럼 노동을 했습니다. 엽연초 제초장에 나가 담배 가마니를 지어 나르는 동안 하루에 장갑 한 개가 다 닳아 없어지곤 했습니다. 15명이 한 조가 되어 30톤 정도를 지어 나르면 일당 600~7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토록 외롭고 가난하고 힘겹게 보냈던 청춘은 빙하기였다.
"담배 가마니를 까마득하게 실은 리어카를 끌고 커브를 돌다가 무게를 이기지 못해 허공에 붕 뜬 채 리어커 손잡이에 스무 살 청춘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은 젊은 날의 겨울은 그러나 그를 단련시켰다.
"빙하기를 사는 동안 추위는 사람을 끈질기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과 깨우침이 그의 평생을 이끌어 간다. 그래서 시인은 그에게 격심한 통증을 안겨주었던 시간을 도리어 감사해한다.
"가난과 외로움과 절망과 방황과 소외와 눈물과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내 문학은 시작되었고, 그것들과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들이 없었다면 나는 시인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많은 아픔의 시간을, 거기서 우러난 문학을. 나의 삶. 나의 시를."
역사의 한복판으로 걸어들어 가다
{#898431515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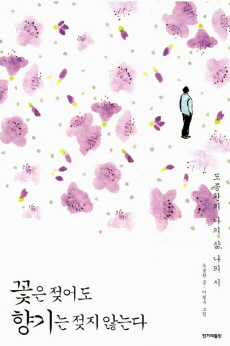
|
| ▲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도종환 지음, 한겨레출판 펴냄). ⓒ한겨레출판 |
김수영을 읽고, 최인훈을 탐독하며, 고은에 취하고 문학과 역사를 술에 버무려 날밤을 새는 동안에 새벽이 거침없이 진군해오는 시간도 여전히 일상의 연장인줄로 알았던 그는 나의 세대다. 그렇게 우린 가난했지만 격정적이었고, 허탈했지만 열정이 식지 않았으며 고독했으나 홀로가 아니었고 가진 것은 없어도 탐욕스러울 정도로 읽어댔다.
그 시절의 스무 살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절제되지 않은 감정의 덩어리를 안고, 다듬어지지 않은 문장으로 무작정 가고 있었습니다. 퇴폐적 낭만주의자가 되어, 세상과 유리된 채, 광활한 길을 우리끼리 감동하고, 우리끼리 눈물을 흘리며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를 비켜가지 않았고, 우리도 역사를 비켜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비극의 몸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섰다. 시인 도종환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가 그 역사의 실체와 온몸으로 생생하게 만나는 것은 5·18 광주 항쟁을 진압하는 진압군으로 나선 순간이었다.
여수-순천 17번 국도의 어느 고갯길에서 병사 도종환은 고뇌한다.
"'총을 쏘아야 할 것인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나는 소총의 탄창 버튼을 눌러 탄창을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발사하게 되어 있는 탄창 맨 위 실탄을 손으로 눌러 빼내어 거꾸로 끼워 넣었습니다. 맨 위에 있는 탄알을 거꾸로 장착해놓으면 방아쇠를 당겨도 총알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탄창을 밀어 넣었습니다. 탄창이 밀려들어가며 '철커덕'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커덕' 하는 소리를 들으며 잘못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상태로 5월의 밤을 견디었습니다."
이날을 그는 두고두고 부끄러워한다. 그러나 그는 그럴 필요가 없다. 시인은 이후 그의 삶에서 언제나 "잘못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탄알을 거꾸로 장착하는 불온한 도전과 반역을 멈추지 않았다.
향기를 잃지 않는 법
그가 <접시꽃 당신>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이후 그의 시에 여러 비판이 나오기 시작한다.
"시인이 이 땅의 엄연한 현실에 뿌리를 내리기를 바라는 필자로서는 너무 오래 무덤가를 배회하고 있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다"는 비평도 듣는다. 이후 이 비평은 "현실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다"로 바뀌고, 그는 이런 저런 비평에 머리 숙여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시대성이나 역사성 또는 삶의 문제에 진지한 고뇌가 없다는 비판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그 반박은 옳다.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한 적이 없는 사람은 시대의 고통을 껴안을 줄 모른다. 무덤에 오래 배회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무덤 주위를 맴돌고 있는 이의 아픔과 고독을 공감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측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를 향한 비평의 칼은 내가 보기에 도식적이다. 인간의 문제에 본격적으로 들어서지 못한 지적 과잉 내지 이데올로기적 단죄의 결과다.
도종환의 시가 역사의 급류에 휩싸이면서도 그의 기원대로 거칠어지지 않은 까닭은 모두 이 실존의 아픔에 충실한 까닭이 아니던가? 그리고 그것은 어느 누구도 결코 포기해서는 아니 될 바다. 소년 시절의 가난, 청년기의 방황, 젊은 교사로 살았던 그가 치렀던 고통 그리고 이후 도종환이 마주했던 폭력과 절망의 역사는 그를 야수로 만드는데 실패하고 만다. 도리어 그는 더욱 섬세하고 여리며, 더욱 따듯하고 부드러운 존재가 되어간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세시와 다섯 시 사이"에 있으면서도 향기를 잃지 않는다. 때로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꽃을 피우는 감격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한 시대의 주류가 휘두르는 폭력과 지배의 논리, 조선의 역사로 치면 "노론의 현실" 앞에서 그는 주저앉지 않는다. 그러기에 그는 "목민을 위해 고뇌하고 싸운 시간만이 운동하는 역사"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
알고 보니 축복이었던 고통
'나의 삶, 나의 시'라는 부제가 붙은 도종환의 책 <꽃은 젖어도 향기는 잃지 않는다>(한겨레출판 펴냄)는 그런 까닭에 인생과 역사의 배후에 계신 절대자에 대한 믿음 또한 서슴없이 누설한다. 누구는 이걸 시인의 종교적 한계라느니, 어느 누구는 그래서 그의 시에는 구도자의 교사적 냄새가 난다느니 하지만, 나는 도리어 바로 이것이 시인의 힘이 마르지 않는 원천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언할 수 있다. 인간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물의 이름은 무엇이겠는가?
그는 40대 후반에 병에 걸리고 산골에 혼자 처박혀 자발적 무명의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그건 그에게 복된 시절이 된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병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몇 년씩 산속에 들어 앉아 혼자 고요히 보내는 시간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 그렇게 축복받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겪었던 가난, 외로움, 좌절, 절망, 방황, 해직, 투옥, 시련, 고난, 질병. 이 모든 것이 다 고마운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축복'을 쓴다.
"내게 오는 건 다 축복이었다 / 내게 오는 건 통증조차도 축복이다 / 죽음도 통곡도 축복으로 바꾸며 오지 않았는가 / 이 봄 어이 매화꽃만 축복이랴 / 내게 오는 건 시련도 비명도 다 축복이다."
그러기에 그는 흔들리면서도 꽃을 피우는 존재의 아픔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그는 어떤 시를 쓰고 싶을까?
"치열하되 거칠지 않은 시. 진지하되 너무 엄숙하지 않은 시. 아름답되 허약하지 않은 시. 진정성이 살아 있으되 너무 거창하거나 훌륭한 말을 늘어놓지 않은 시를 써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지 않은가? 이게 우리가 진정 바라는 인생이라고.
이 책에는 그의 자전적 고백이 그래서 솔직하게 담겨 있다. 그의 무수한 시의 탄생에 얽힌 일화가 펼쳐져 있다. 그의 문학에 대한 비판과 변론, 그리고 그의 개인사에 대한 뼈아픈 토로가 담겨 있다. 시인 도종환과 그의 시가 어떤 울림을 가지고 그의 영혼에서 태어났는가도 보게 된다. 그 뿐이랴? 그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다시 깊숙이 기억해내고 성찰하게 된다.
나의 세대는 벌써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이 이제는 20대와 30대에게 더 많이 읽혀지기를 열망한다. 자기 이야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꼰대"가 된 아버지 세대의 일기가 아니라, 좌절과 절망, 고통과 외로움, 넘을 수 없는 벽과 치유하기 어려운 질병의 계곡을 지나온 세대와 인간의 내면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거기서 위로와 용기를 얻고, 축복의 비밀을 알아내는 즐거움을 느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숨을 멈추게 하는 선율"로 존재하고 싶어 하는 시인, 그의 삶이 정직하게 기록된 이 책이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여정에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춤추며 흔들리는 꽃이여
도종환의 벗 화백 이철수의 그림은 이 책의 분위기를 아낌없이 만들어 준다.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사람 좋게 웃는 이철수가 떠오른다. 도종환은 아름다운 벗을 가졌다.
도종환은 내 벗이기도 하다. 나이 먹어 얻은 귀한 벗이다. 그래서 더욱 그의 삶과 시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의 시가 영어로 번역되어 보다 많은 인류에게 일상의 기도로 읽혀지기를 바란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랴",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이미 나는 중심의 시간에서 멀어져 있지만 어두워지기 전까지 아직 몇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이 고맙고, 해가 다 저물기 전 구름을 물들이는 찬란한 노을과 황홀을 한번은 허락하시리라는 생각만으로도 기쁘다."
이걸 영어로 어떻게 옮길까 생각 중이다. 먼저 "흔들리지 않는 피는 꽃이 있으랴"는 "No flowers blossom without waving in the wind?" 또는 "No flowers blossom without being shaken by the winds?" 음, 너무 직역이다. 아, 이러면 어떨까? "No flowers blossom without dancing in the rain?"
바람에 수세적으로 흔들린 줄 알았던 도종환의 삶과 시는 사실 바람과 함께 춤을 추었던 것은 아닐까? 숲과 강과 꽃밭, 그리고 역사의 평원에 거세게 몰아쳤던 그 바람은 결국 한 시인에게 축복의 감격을 주었으니.
시인은 어찌 보면 한 시대의 춤꾼 아니겠는가? 언젠가는 그가 흐드러지게 춤을 추는 것을 보고야 말리라.
몸은 비에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은 채로, 뒤늦게 핀 꽃들과 함께.
흔들리며 흔들리며, Dancing in the rain!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