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탄불에서
이번 주 '리브로스 비바'는 서평이 아닌, 짤막한 여행 소고로 채운다. 필자는 지금 터키 이스탄불에 체류 중이기 때문이다. 내 가방에는 유재원의 <터키, 1만 년의 시간여행>(전 2권, 책문 펴냄)과 클라우스 헬트의 <지중해 철학 기행>(이강서 옮김, 효형출판 펴냄), 오르한 파묵의 <이스탄불>(이난아 옮김, 민음사 펴냄) 그리고 페르낭 브로델의 <문명사(History of Civilizations)>가 있다.
여행하면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크나큰 즐거움이지만 사실 욕심이기도 하다. 현장을 봐도 모자랄 시간에 책까지 함께 읽어가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지중해를 돌아 고대와 중세, 기독교와 이슬람, 그리스, 로마 그리고 비잔틴과 오스만 제국이 겹쳐 있는 곳에서 그와 관련 있는 책을 읽는다는 것은 또한 기대 이상의 기쁨을 준다.
에페소와 페르가몬 또는 트로이에서 읽게 되는 호메로스의 작품이나 <지중해 철학 기행>, 또는 성 소피아 성당의 저 정교한 모자이크를 보면서 다시 읽는 <이스탄불>은 한국에서 읽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감흥을 준다. 이스탄불의 야경을 배경으로 입에서 입으로 나누는 독후감 또한, 내 안에 생동감 있는 힘을 자라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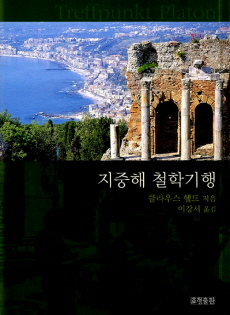
|
| ▲ <지중해 철학 기행>(클라우스 헬트 지음, 이강서 옮김, 효형출판 펴냄). ⓒ효형출판 |
문명의 탄생, 쇠락, 결합 그리고 파멸과 재탄생이라는 주제는 물론이고 제국의 팽창과 문명의 성장에 대해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평가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된다. 문명의 약탈이란 주제 역시 인류적 고민이다. 그에 더하여 '보존'이라는 개념도 더 많은 논의를 통해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역사의 지층이 깊은 지역을 여행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역사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하게 해준다. 그리고 그 재구성의 과정은 역사를 총체적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보게 해준다.
이번 여행에서 줄곧 생각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다. '도시의 철학'이다. 도시 자체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이들이나 그 도시를 찾는 이들에게 새로운 사유의 길을 뚫어주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 그 도시의 풍경이 철학적·예술적 상상력을 제공하고 그 도시의 거리와 성곽이 역사와 문화에 대한 생각의 깊이를 기르게 하고, 다양한 문명의 공존 속에서 새로운 문명의 탄생에 대한 연습이 가능한 도시,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의 도시는 아날로그의 시대를 끝내고 있다. 그것이 과연 좋은 방향일까? 아니, 그것은 좀 더 느끼고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상상하고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여유를 잃고 있는 도시다. 그곳에서 우리는 문명의 죽음을 목격하게 된다. 역사의 지층을 파손하고 문명의 기록을 삭제해가면서 세우는 도시란 상상력이 거세된 인간을 만들어낼 뿐이다.
도시 안에서 역사와 철학, 미술과 음악, 그리고 시와 노래가 문명의 힘으로 자라나는 걸 보고 싶다. 밤하늘 풍경 자체가 예술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그곳에서 은은히 울리는 소리가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 저녁을 일깨우는 그런 축제 같은 꿈을 꾸고 싶다. 이제 우리의 도시는 문명을 만드는 상상력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