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수난 공동체가 아니다. 그건 교회에만 국한되는 현실이 아니다. 고난의 역사적 의미나 인간이 겪는 고통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마련하는 정신적 노력은 낯선 것이 되고 말았다. 대신 금전에 대한 욕망과 그 욕망의 사다리로 올라서는 각종 지침서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인간의 고통이 그친 것은 아닌데도 말이다.
김은국의 <순교자>(도정일 옮김, 문학동네 펴냄)는 우리가 직면한 이런 현실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시도하게 한다. 그것도 매우 치열하게. 시대는 달라졌으나 그가 던진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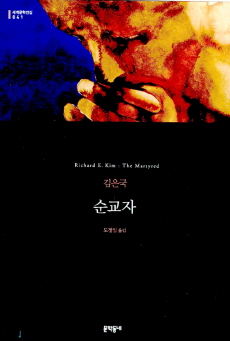
|
| ▲ <순교자>(김은국 지음, 도정일 옮김, 문학동네 펴냄). ⓒ문학동네 |
일제 식민지 시절부터 평양은 조선 기독교의 본산이라고 할 만한 위상과 위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전 상황은 매우 나빠지기 시작한다. 작중의 사건은 그런 현실에서 벌어진 열네 명의 목사들에 대한 집단 처형의 진상을 파헤쳐가는 각기 다른 시선을 가진 인물들의 관계가 중심이 된다.
전쟁 초기 북이 우세했던 전선은 역전되면서 남쪽의 군대가 평양에 입성하게 된다. 평양의 정세를 관리하게 된 장 대령은 집단 처형 사건을 접하면서 살해된 목사들을 순교자로 만드는 작업을 추진하려 든다. 그런데 문제는 처형당했다고 여긴 열네 명 가운데 두 명이 살아남았던 것이다. 생존한 목사 가운데 작중의 주인공이 되는 신 목사는 대다수의 존경을 받은 위치에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처형장에서 미쳐버리고 만다.
처형장의 진실, 증언자인가 아니면 배교자인가?
모두가 죽임을 당했는데 살아남았다면 이들은 처형장의 진실을 증언할 수 있는 최후의 증언자이거나, 또는 배교를 대가로 살아남은 자들이 된다. 신 목사는 처형장의 진실에 대해 계속 침묵하고, 장 대령의 부하인 이 대위는 "진실은 뇌물을 먹일 수 없다"며 장 대령의 국가주의적 요구에 따른 순교자 날조 작업에 가담하지 말도록 촉구한다. 이 대위는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밝히고 넘어서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
한편, 이 대위의 친구 박 대위는 자신의 아버지가 처형당한 목사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 최후를 궁금해 한다. 박 대위는 신앙의 문제로 의절해버린 아버지가 죽음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그의 믿음을 지켰는지가 알고 싶었던 것이다. 순교자가 되어버린 아버지인가, 아니면 인간의 고통과 신의 부재를 받아들이고 역사에 희망을 거는 인간으로 돌아간 아버지인가가 그에게 중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신 목사는 그런 의문과는 전혀 다른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다. 약속이 깨지고 희망이 실종된 현실에서도 여전히 약속을 믿고 희망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이는 처형 현장에 대해 그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거짓을 꾸미는 편이 나은지를 결정하는 선택과 직결되는 사안이었다. 박해받는 기독교 편에 서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국가가 요구하는 순교와, 인간의 본질적 구원을 위해 필요한 순교의 차이는 명백하다.
인간을 지켜내는 약속과 희망이란?
사실에 바탕을 둔 진실이 구원이라고 여기는 이 대위 앞에서 신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절망이 어떻게 사람들의 정신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어둔 감옥으로 던져 넣고 있는지를 보았소. 마을은 폭격과 포격을 당하고 석 달 사이에 두 번이나 털려 모두 알거지가 돼 있소. 젊은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 죽고 딸, 누이, 아내 어미 할 것 없이 여자들은 죄 강간 당하고 먹을 건 없고 병자가 생겨도 돌봐줄 길이 없소. 지옥이 따로 없었다오."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말에 이 작품의 모든 고뇌가 녹아 난다.
"나는 인간이 희망을 잃을 때 어떻게 동물이 되는지, 약속을 잃을 때 어떻게 야만이 되는지를 거기서 보았소. 그렇소. 당신이 환상이라고 부르는 그 영원한 희망 말이오. 희망 없이는, 그리고 정의에 대한 약속 없이는 인간은 고난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 희망과 약속을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면 (하긴 이게 사실이지만) 다른 데서라도 찾아야 합니다.
(…) 나의 희망? 될수록 많은 이들이 절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될수록 많은 이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이 세상의 고난을 이겨내고, 될수록 많은 이들이 평화와 믿음과 축복의 환상 속에서 눈을 감을 수 있으면 하는 것, 그게 내 희망이오."
진실이 아닌 환상으로라도 인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걸 택하겠노라는 신 목사와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던 이 대위는 병상에서 떼로 죽어가는 이들의 신음 소리를 들은 신목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다.
"저 환자들 소리 들리오? 나는 저들이 아파하는 소리와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소. 지금도 계속 듣고 있소."
"그런 데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는 사정했다. "어서 주무시도록 하세요."
"저 사람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지요?" 그가 속삭이듯 말했다. "많이들 죽게 되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나는 거짓말을 했다.
희망은 때로 사실과 다른 진실인가? 고통의 신음 소리에 귀를 열고 있는 신 목사는 오늘의 교회의 목사들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오늘의 교회가 유포하는 희망은 매우 현실적인 환상이다. 그건 고난을 이기는 진실이기보다는, 이웃이 내지르는 고통의 신음 소리에 귀를 막고 혼자 욕망의 성취를 완성시키기 위해 필요한 마약이 되고 있다.
인류의 운명, 그 무거운 짐에 대하여
작중에 등장하는 이 대위와 그의 친구 박 대위는 대학에서 인류 문명사를 강의한 지식인 출신이다. 이들이 인류 문명사를 가르쳤다는 것은 작품의 전체 주제와 본질적으로 연결된다. 인류가 그 삶을 시작한 이래 겪어온 고난과 그 운명의 짐에 대한 작가의 주제의식이 표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은국은 휠덜린의 <엠페도클레스의 죽음>의 한 대목을 작품이 시작되기 전 인용한다.
"그리고 신성한 밤이면 나는 이 엄숙한 대지, 괴로워하는 대지에 내 가슴을 맡기고, 운명의 무거운 짐을 진 이 대지를 죽을 때까지 충실하게, 두려움 없이 사랑하며 그의 수수께끼를 단 하나도 경멸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노라. 그리하여 나는 죽음의 끈으로 대지의 품에 들었노라."
김은국은 이러면서 허무주의를 이겨내려 한다. 그건 인간의 삶에 대한 끈질긴 사랑과 책임을 지켜내려 그가 몸을 던진 정신의 참호 속에서 얻은 성찰이기도 하다. 작품이 까뮈에게 헌사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그건 쉽게 얻은 것이 아니다. 작품의 첫 장에서 이 대위와 박 대위는, "우리는 살아남았으나 둘 다 부상당했다"고 묘사된다. 대구 방어전투와 서울 탈환전에서 각기 얻은 포탄과 총알의 흔적이 그들의 육신에 박혀 있다.
우리도 그렇게 지난 세월을 살아남았으나 그들과는 달리, 여기저기 부상당해 상처투성이인 것을 모른다. 그래서 우리를 다치게 한 현실에 대한 질문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삶을 방어하고, 권리와 의미를 탈환해가는 과정에서 어느 무릎이 깨지고 어느 팔이 저격당했는지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그건 살면서 으레 있는 일이라는 투다. 그래서 전쟁 자체를 용인하면서 산다.
이 책을 처음 읽었던 것은 어느새 30년도 더 되는 청년의 때였다. 그 시절 내 손에 들렸던 <순교자>는 우선 그 제목이 주는 심상치 않은 종교적 무게와 함께 "처형장의 진실"을 캐는 추리 소설처럼 긴장감 넘치게 전개되는 구성이 하나로 어울린 기묘한 이야기라는 느낌을 주었을 뿐이다. 책은 흥미와 주제라는 점에서 다소간의 지적 충격을 주긴 했지만, 그 여운은 그리 길진 않았다.
그 시절 우리에게 보다 강하게 다가온 현실은 권력의 무자비한 억압에 대한 싸움이었기 때문이었기에 그랬는지 모르겠다. 공산주의에 의한 기독교 박해라는 소재가 자칫 반공주의로 이어지는 판에 박힌 논리를 은근히 숨겨놓은 작품이 아닐까라는 의심도 한 몫을 했을 게다. 그러나 그것은 이 작품을 제대로 읽지 못했던 탓이다.
1970년대의 교회가 이미 수난과 결별하고 자본의 수중에 몸을 던지고 있던 상황에서 <순교자>는 열정을 가지고 읽기에는 낡은 작품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역사의 변화 속도에 점차 관대해지는 동시에 보다 본질적인 정신사의 기원과 그것으로부터 길어 올려야 할 힘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김은국의 <순교자>는 다르게 다가왔다. 그것은 번역자 도정일이 고백하듯이 "<순교자>의 재발견"이라고 할 만하다.
<순교자>의 재발견
도정일의 고백이다.
"<순교자>는 인물, 시간, 장소 같은 외적 요소들은 한국의 것으로 임차하고 있으되 정신과 의식 갈은 결정적인 내부 요소들은 서구적인 것들로 채우고 있다는 것이 지난 날 이 소설에 대한 나의 의견이었던 셈이다. 물론 나의 이런 견해는 한국 독자들이 <순교자>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는 제한된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래했을 때의 것이지 반드시 이 소설에 대한 나의 전체적 평가를 담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순교자>를 다시 읽는 동안 나는 내 견해의 상당 부분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순교자>를 재발견한 것이다."
<순교자>는 1964년 삼중당에서 장왕록의 번역으로 나왔었고, 이후 작가 김은국은 새로운 번역과 재출간을 도정일에게 부탁한다. 1978년이었다. 그러고 나서 30년이 흐른 2010년, 도정일은 자신의 번역을 새롭게 손대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질문과 만난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에 의미가 있는가? 고통이 의미가 없고 인간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면 인간은 그 난국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자기존재의 품위를 확보할 수 있단 말인가?"
이로써 그는 이 문제들과 내면에서 난상토론을 하는 자신을 보게 된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다.
1970년대 당시 비슷한 시기에 읽은 엔도 슈사쿠(遠藤周作)의 <침묵>이 17세기 일본의 기독교 수난사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과 신앙을 지켜내기 위한 배교라는 주제를 다루었다면, <순교자>는 한국 전쟁 시기에 평양에서 일어난 기독교 수난사의 한 장면에 얽힌 하나님의 부재와 인간의 고통을 깊숙이 응시하게 하는 작품이었다. 그러면서 고난의 벼랑 위에서 어떤 선택으로 인간의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묻는다.
두 작품 모두 인간이 처절한 궁지에 몰릴 때 하나님은 어찌하여 아무런 말씀도, 행동도 없으신 건가라는 질문 앞에 서 있다는 유사성을 보이는 한편, 김은국의 <순교자>는 미스터리로 짜인 사건만이 아니라 작중 인물의 내면으로 보다 치밀하게 파고드는 힘을 가졌다. 그래서 이 책은 출간 당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서평이 언급했던 바대로 "눈부시고 강력한 소설(brilliant and powerful novel)"이라는 격찬을 받을 만하다.
시대적 시선의 차이
김은국의 <순교자>는 이걸 읽는 시대의 사회적 시선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을 취하게 되는 힘을 갖는다. 1950년대의 전쟁과 수난의 현실에서 붙들려는 희망과는 달리, 이 작품이 출간된 1960년대는 기존의 수난 공동체의 해체와 함께 어떤 희망을 중심으로 재건 또는 재구성이라는 미래를 만들어 낼 것인가라는 주제와 마주하며 <순교자>를 읽게 된다. 1970년대 말이면 교회는 자본의 성채가 되어가고, 오늘날에 와서는 그 성채의 부패와 사회적 지탄 속에서 <순교자>는 전혀 다른 빛을 발하며 우리의 현실에 대해 발언한다.
수난이 없으니 그에 따른 희망도 더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믿는 시대에, <순교자>는 고난을 이겨내는 인류의 역사와 깊숙이 만나 대화를 하는 노력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그 노력이 맺어가는 성찰의 열매를 함께 나누는 즐거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번역이란
<순교자>는 또한 번역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일깨우는 즐거움도 선사하고 있다. 순교자의 첫 대목 원문이다.
"The war came early one morning in June of 1950, and by the time the North Koreans occupied our capital city, Seoul, we had already left our university, where we were instructors in the History of Human Civilization."
도정일은 이렇게 번역해놓았다.
"1950년 6월 어느 이른 아침 전쟁이 터졌고 북한 인민군이 수도 서울을 점령했을 무렵, 우리는 인류 문명사 담당 강사로 재직했던 대학을 이미 떠난 뒤였다."
우리는 그의 번역이 매우 박진감 있게 원작을 살려놓았고, 영어로 써진 이 작품이 문체와 표현이 단단한 한국어 작품으로 변신하는 것을 보게 된다.
박 대위가 친구 이 대위에게 보내는 글이다.
"I have been clinging onto the precipice of History, but I give up. I am prepared to take leave of it."
이에 대한 번역은 <순교자>가 본래 우리말로 쓴 작품이라고 착각할 정도다.
"역사의 벼랑에 그동안 매달려 왔지만,
이젠 포기하네. 손 놓을 준비가 됐네 그려."
순교자의 마지막 장면은 부산 이 대위가, 피난처의 신 목사의 친구 고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를 보고 나온 후 난민천막들 사이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다.
"I walked away form the church, past the rows of tents where silent suffering gnawed at the hearts of people-my people-and headed toward the beach, which faced the open sea. There a group of refugees, gathered under the starry dome of the night sky, were humming in unison a song of homage to their homeland. And with a wondrous lightness of heart hitherto unknown to me, I joined them."
"나는 걷기 시작했다. 줄지어 늘어선 난민 천막들… 수많은 고난이 소리 없이 사람들의, 내 동포들의 가슴을 쥐어뜯고 있는 그 천막들을 지나 나는 넓은 바다가 와서 출렁이고 있는 해안 모래밭 쪽으로 걸어갔다. 거기에는 또 다른 한 무리의 피난민들이 별빛 반짝이는 밤하늘을 지붕삼고 모여 앉아 두고 온 고향의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러자 나는 그때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신기하리만큼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들 사이에 섞여 들었다."
뛰어난 문학성을 가진 번역으로 다시 태어난 <순교자>, 전쟁이 끝난 뒤, 겨우 10년이 지난 시점에 그것도 서른 두 살의 청년이 쓴 작품이라고 보기에는 경이로운 이 작품이 다시 읽혀지는 것은 이 시대의 축복일 수 있다.
순교의 시대는 아니지만, 수난의 역사는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는 오늘날에도 인간에겐 여전히 희망이 필요하지 않는가?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