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볼 수 있는 것은 산뿐이었다. 이산과 저산 봉우리에 빨랫줄을 매고 옷을 빨아 그 줄에 널어 말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산은 서로 가까이 서 있었다. 그래서 해가 늦게 떴고, 일찍 기울었다. 아이는 산이 키웠다. 산은 먹을 것을 감추어 두었다가 아이의 눈앞에 내놓았다. 송구, 칡뿌리, 오디, 으름, 뱀딸기가 지천이었다. 그래도 아이는 늘 배가 고팠다. 배가 고프다고 징징대는 아이에게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그건 니가 시상에 나오자마자 배를 곯아서 그런 거여."
원천적인 허기까지 보태져 아이는 배가 더 고팠다.
산 속에는 벼농사를 지을 논이 없었다. 그 이유로 이밥(쌀밥)은 구경도 하지 못했다. 아이는 옥수수를 말려 맷돌에 갈아 만든 것이 쌀인 줄 알고 자랐다. 옥수수쌀로 지은 밥이 식으면 숟가락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딱딱해졌다. 아이는 밥이란 다 그런 것인 줄 알고 자랐다. 나중에 쌀밥을 먹게 되었을 때 아이는 정신없이 퍼먹으며 말했다.
"야, 입에서 살살 녹아서 씹을 것도 없네. 난 이담에 쌀농사 지어서 이런 밥 실컷 먹고 살 테야."
하지만 아이가 사는 마을엔 논은 고사하고 옥수수를 심을 땅조차 부족했다.
산 속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해가 지면 그대로 잠이 들었다. 그렇지만 아이는 잠이 오지 않았다. 하늘 가득한 별빛을 두고, 방안까지 날아 들어오는 반딧불이를 두고 잠 잘 수가 없었다. 아이는 누워 이런저런 공상에 빠졌다. 그렇게 새벽까지 깨어 있던 아이는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가 없었다.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고개를 몇 개나 넘어야 도착하는 거리에 있었다. 뜀박질을 한다 해도 1시간은 족히 걸렸다. 아이는 늘 지각을 했다. 밤에 시작하는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이는 생각했다.
여덟 살이 되었을 때. 아이는 태를 묻은 그곳을 떠났다. 아이의 이삿짐은 책가방 대신 커다란 무 두 개였다. 돌부리에 걸려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신이 난 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고향을 떠났다. 아이의 나이 여덟 살은 그리움보다는 지긋지긋한 고향을 떠난다는 기쁨으로 충만할 나이였다. 처음 읍내에 나온 아이는 깜짝 놀랐다. 그렇게 세상이 넓은 줄 몰랐었다. 하늘이 그렇게 넓은 줄 처음 알았다. 밤에 그렇게 환한 불이 있다는 것도 처음 보았다.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했다. 아이는 무겁게 들고 온 무 두개를 내려놓고 말했다.
"나는 더 넓은 세상에 나가 살 테야."
아이는 가끔 학교를 가는 대신 기차를 탔다. 물론 차비는 없었다. 그래도 아이는 기죽지 않았다. 자기가 타지 않아도 기차는 가는 것이고, 어차피 비어 있는 자리에 당당히 앉아 떠났을 뿐이었다. 기차는 아이를 싣고 달렸다. 아이는 점점 더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었다. 공부하라고 강조만 했던 학교에서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아이는 스스로 깨우쳤다.
'공부를 해야겠어.'
학교에 다니는 동안 한번도 공부 잘 한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던 아이는 대학에 합격했다. 지방에 있기는 했지만 국립대학이었다.
아이는 강의실보다 도서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아이가 본 그 어떤 세상보다 더 넓은 세상이 책 속에 펼쳐져 있었다. 어느 날, 도서관을 나오면서 아이는 중얼거렸다.
"세상은 너무 부조리해."
이제까지 한번도 해보지 못했던 생각이었다.
대학을 졸업한 어른이 된 아이는 도시로 향했다. 어른이 된 아이는 가진 것이 없어서 지하에 방을 얻어야만 했다. 습기가 가득한 지하에서는 가을이 오기도 전에 귀뚜라미가 찾아왔다. 찌르찌르, 귀뚜라미 노래 소리는 아련히 잊고 살았던 산골의 새소리를 떠오르게 했다. 도시의 지하방에서는 별을 볼 수가 없었다. 어른이 된 아이는 더 높은 곳을 찾아 옥탑방으로 이사했다.
"이제 하늘이 더 가까우니 별이 더 잘 보이겠지."
하지만 도시의 별은 더 이상 하늘에 떠 있지 않았다. 어른이 된 아이는 별들이 떨어져 빛나는 거리를 밤마다 내려다보았다. 어쩐지 서글펐다. 드디어 어른이 된 아이는 그리움을 앓았다. 예기치 못했던 아픔이었다. 어른이 된 아이는 그리움을 부정하고 고개를 저어보았다.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곳은 고향밖에 없다는 것을 어른이 된 아이는 몇 번의 실패 후에 인정해야만 했다. 어른이 된 아이는 마침내 고향에 돌아와 둥지를 틀었다. 그렇게 작고 초라해 보였던 고향이었지만 그 어떤 곳보다도 고향의 품은 넓었다. 어른이 된 아이는 그 어떤 곳에서도 느끼지 못한 편안함을 느꼈다. 고향은 세상의 시작이었고, 마지막이 되는 곳이었다.
어른이 된 아이가 아는 한 사람이 있었다. 세상의 아픔을 노래하는 시인이었다. 시인의 고향은 평택 땅 대추리였다. 시인의 태가 묻혀 있는 그곳에 미군기지가 들어선다고 했다. 시인은 고향을 지키려고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이미 시인의 할아버지 때 일본놈들에게 땅을 빼앗긴 적이 있었기에 땅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필사적이었다.
먼 길을 돌아 마침내 고향에 돌아온 아이는, 고향을 지키려는 시인의 눈물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 없었다. 어른이 된 아이는 미군기지가 들어서려는 대추리로 향했다. 너른 들에 황새가 날아오른다는 것은 이미 옛말이 되어 있었다. 대추리 하늘에는 황새 대신 미군 헬기가 쉴 새 없이 날아오르고 있었다. 먼지를 일으키며 하늘을 나는 헬기를 바라보는 시인의 눈은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분노였다.
볍씨를 뿌릴 수 없는 넓은 들을 바라보면서 어른이 된 아이의 몸에도 피돌기가 빨라졌다. 평생을 어루만져 주던 농부의 손길 대신 군인에게 짓밟히게 된 땅, 씨앗을 품어 키우지 못하게 된 들이 흐느끼고 있는 소리가 어른이 된 아이의 귀에 들렸다. 그리움의 땅, 강제와 억압에 밀려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조상들의 울부짖음이 서려 있는 땅, 그래서 물러설 수 없는 땅에서 시인은 절망했고 아파했다. 시인은 시를 쓰는 대신 미군과 그 땅을 허락해준 정부와의 싸움을 택했다. 시인의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많은 이들이 시인의 친구가 되어 대추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총칼 대신 촛불과 노래와 그림과 시로 저항했다. 어른이 된 아이는 그들의 아름답고 순한 저항이 무시되는 세상이 슬펐다.
대추리 분교가 무너지고 난 후 시인이 눈에 핏발을 세우며 말했다.
"대한민국에 씌어져 있는 민주주의 탈은 이제 그만 벗겨내고 참된 민주를 위해 문화혁명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요?"
어른이 된 아이는 "그래, 필요하지."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 선택밖에 없는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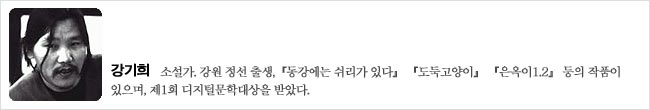
|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