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통이 제시하는 형식보다는 전통이 주목하는 주제에 집중합니다."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2025년 프리츠커상 수상자로 선정된 중국의 건축가 리우지아쿤의 수상 소감이다.
아직까지 한국인 수상자는 한 사람도 없지만 국적으로 보면 이제 중국이 둘, 미국이 8명이고, 일본이 9명으로 가장 많다. 그중 한 사람이 <탈주택_공동체를 설계하는 건축>의 공저자인 야마모토 리켄.
'탈주택(脱住宅)'은 '1가구 1주택 시스템을 대신하는 새로운 주거 형식의 제안'이다. 부연하자면 "현재의 1가구 1주택이라는 주택의 형식이 얼마나 자유롭지 못하고 얼마나 특수한 주택인가 하는 점이다. 이 주택은 20세기가 되어 발명된, 20세기라는 시대에 어울리는 주택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이 특수한 형식의 주택에 강하게 구속되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란, 예를 들면 주택을 제안하는 건축가다. 그리고 행정이며 시행사다. 그리고 주택에 사는 주민이다. 나아가 이 특수한 주택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의 사회라는 공간을 그대로 승인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역사적 맥락과 철학이 뒷받침한다. '1가구 1주택'이란 "임금노동자를 위한 전용주택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기 위해 특별하게 설계된 주택이었다.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주택이기에 그때까지의 주택과 비교하면 사생활(밀실성)에 대해 이상할 정도까지 신경을 썼다. 성현상(성적 욕망의 총체)을 위한 밀실성이다."
이에 기반한 주택은 더 이상 역할이 끝났다는게 저자들의 생각.
야마모토 리켄이 철학을 담아 설계한 건축물이 한국 땅에 둘 있다. '성남 판교하우징'과 '서울 강남하우징'. 책의 이 부분만을 천천히 읽어도 유용하다.
생각해보니 '의·식·주'에 관한 책 중에서 '주'에 대한 책을 가장 소홀히 했던 것 같다. 무지를 절감한다. 무지는 읽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세상 모든 일은 철학의 산물일진데, 주택과 건축에 대한 철학 없이 어떻게 한 몸을 뉘일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시대가 이토록 몸살을 앓는 이유 중에 하나도 '철학이 거세된 정치의 비루함' 때문 아니던가. 문제는 철학이다.
이 책 이전에 프리츠커상 수상자의 또 다른 책에 빠져든 적이 있다. 강력히 추천하고 싶은, 프리츠커상 최연소 수상자인 중국의 건축가 왕수의 <집을 짓다>라는 책이다. 철학이 있는 건축가의 전형이다. 내뱉는 것을 줄이고 되새김질하는 시대여야한다. 시대정신과 철학에 좀 더 성실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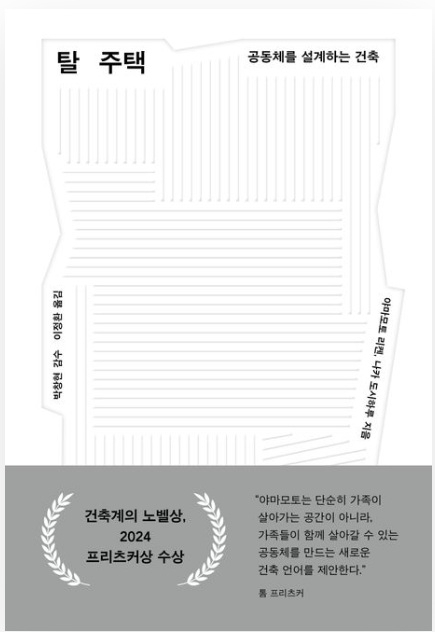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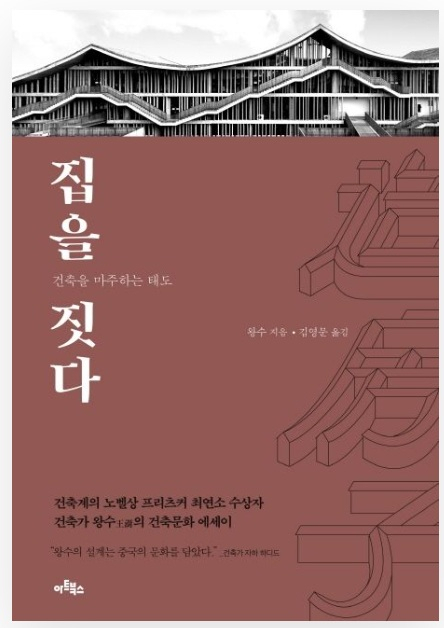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