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computer'라는 단어는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기계가 아니라 인간을 지칭하는 단어였다.
1838년 8월 어느 날 아침, 열일곱 살의 에드윈 던킨(1821-1898)과 그의 형은 그리니치 왕립 천문대에서 왕실 천문학자의 지휘 아래 컴퓨터로 일하기 시작했다.
"오전 8시에 우리는 근무지에 있었다. 나의 예상과 매우 다르게, 팔각형 방의 중앙에 놓인 널찍한 책상 앞 높은 의자에 앉자마자 내 앞에 거대한 책이 놓였다. 인쇄된 형태의 이 거대한 2절판 책은 적경 표와 린데나우의 표에 등장하는 수성의 적경과 북극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것이었다.…… 그러나 표에 제시된 예시를 잠시 차분히 공부하고 나니 모든 불안감이 곧 사라졌고, 하루 일과가 끝나는 저녁 8시가 되기 전에 몇몇 경력직 컴퓨터들이 나의 성과를 칭찬해주었다."
지금의 컴퓨터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다. 기계가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소프트웨어다. 콘텐츠다. 인공지능이다. 한편 알고리즘이다.
이런 알고리즘은 산술 연산만큼이나 오래되었다. 하지만 고대 지중해로부터 유래한 지적 전통에서 규칙의 주요 의미에 해당한 적이 없다. 19세기에 출간된 독일의 방대한 수학 백과사전에는 '알고리즘'에 대한 항목조차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19-20세기에 걸쳐서 알고리즘으로서의 규칙은 패러다임으로서의 규칙을 점차 압도하기 시작했다. 알고리즘은 수학적 증명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었고 20세기 중반에는 컴퓨터 혁명을 주도하고 인공지능에서 인공생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꿈을 이루어냈다.
미국의 과학사학자 로레인 대스턴은 이렇게 규정한다. "이제 우리 모두는 알고리즘 제국의 신민이다." 그렇다. 통치 불능 상태에 빠진 2025년 2월 한국 사회는 유튜브 알고리즘의 신민이다. 누군가는 불행하게도 '노예'를 자처한다. 더 누군가는 알고리즘의 주술에 빠져 폭력과 갈등과 무질서를 교사한다. 그래서 규칙으로서의 알고리즘의 역사와 본질을 따져본다는 것은 시대적 교양이 되어야한다. 책은 정독을 요한다. 상당히 묵직하다.
책 뒷표지의 요약이 좋다.
"간단한 수식부터 요리법, 맞춤법, 통치 체계, 자연법칙과 인공지능까지 우리는 언제나 규칙의 그물망에 얽혀 있다. 로레인 대스턴은 계산하고 측정하는 알고리즘, 기준을 제시하는 패러다임, 사회를 통치하는 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규칙들을 살펴보면서, 질서와 제약의 세계를 깊이 있게 탐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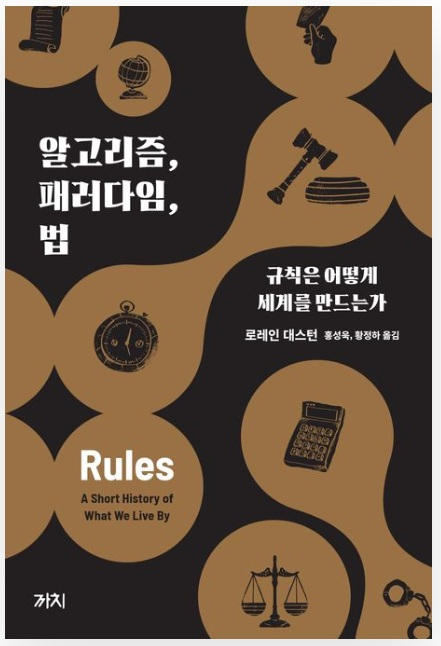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