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S. 엘리어트의 시를 읽을 때마다 나는 이런 생각에 잠기곤 한다. "우리에게는 엘리어트보다 더 훌륭한 시인이 있었다."
시인을 놓고 누가 누구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을 할 수는 없는 이야기이지만, 최소한 시라는 것은 일상적 언어가 미칠 수 없는 감정이나 느낌의 향연이 바로 지금 여기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의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 향연을 위해 일차적으로 필요한 사태는 언어의 공유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한국인의 시는 한국어로, 다시 말해서 한국인의 마음으로 쓰여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다고 엘리어트의 시가 단순히 영어로 쓰여졌다는 이유로 김지하의 시보다 못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아니할까?
우선 나는 한국의 고명한 영문학자일수록 그 고매한 번역이 그 오리지날한 문맥을 유실하고 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겠지만, 번역의 상응성을 벗어난 곳에서 양자를 비교해도 엘리어트는 너무도 현학적이고, 신화적이고, 불필요한 인유의 숲속에 독자들을 헤매게 만든다. 뭔 개소리인지 알 수가 없다. 물론 나의 무지를 탓해도 항변할 생각은 없다. 원래 나는 무지한 사람이니까. 사월은 가장 잔인한 달. April is the cruellest month, 이 한마디밖에 나에게 남은 것은 없다.
겨울을 오히려 따뜻하다고 예찬하게 만드는 봄의 잔인함은, 탄생되는 뭇 생명의 고통과 더불어 더욱 혹독하게 느껴진다. 그 느낌은 나에게는 64괘의 진정한 시작인 준괘(屯卦)의 간난에서 나는 더 리얼하고 절실하게 느낀다. 그런데 지하의 시는 훨씬 더 다이렉트하고, 고귀한 수식이 없이, 신화적 장난이 없는 오늘 여기 현장의 느낌으로 그 미묘한 감정을 인간세 만천하 모두에게 선포한다.
엘리어트에게 생명이라는 것이 백작부인의 사치였다면, 지하에게 생명은 우금치에서 쓰러져가는 소복의 민중들이 흘린 피를 먹고 자라나는 잡초의 영원한 솟음이었다.
지하의 시는 너무도 쉽다. 그러나 현란한 언어의 포장 속에 자기를 감추는 여느 시인의 시보다도 격조가 높다. 시대의 아픔을 처절하게 느끼고 끝까지 변절하지 않은 김수영은 위대한 시인으로 영원히 기억되겠지만 지하에게서 느끼는 사유의 폭이 느껴지지는 않는다.
지하에게는 동학이라는 "다시개벽"이 있었다. 지하에게 동학은 배움의 대상이 아니라 발견의 대상이었다. 지하는 동학을 발견했다. 수운의 생명력이 해월의 치열한 도바리 속에서 꽃을 피웠다면, 해월의 꽃은 지하의 시를 통하여 장엄한 화엄세계를 구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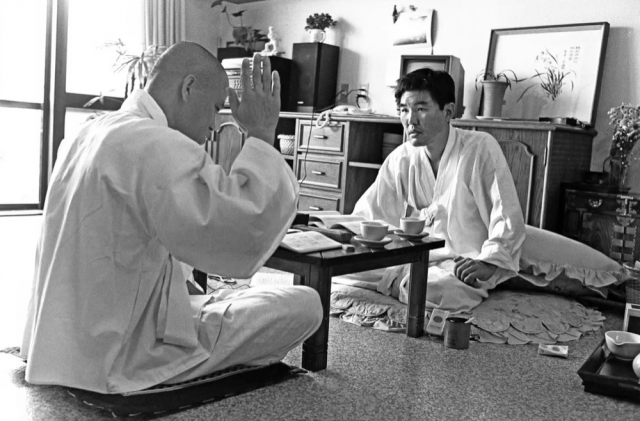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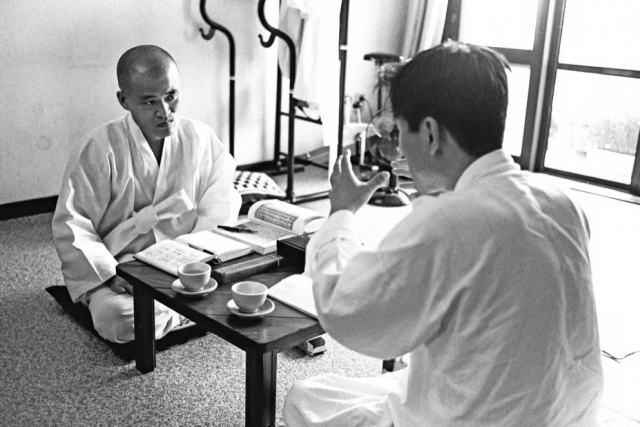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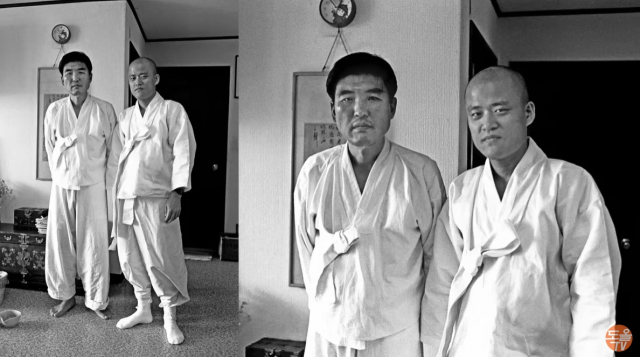
나는 지난 세기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애고에서 열린 특별한 사상가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때 일본을 대표하는 지성으로서 오오에 켄자부로오(大江健三郞)가 초청되었다.
우리는 라호야 코우브 해변의 아담한 호텔에서 며칠을 묵었는데, 그의 방은 바로 내 방 곁에 있었다. 나는 첫인사를 나눌 때 그에게 나의 책 <여자란 무엇인가>의 일본어판을 선물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그날 밤으로 나의 <여자란 무엇인가>를 정독하고 완독했다는 사실이었다. 아침에 만났을 때 그는 말을 건넸다.
"한번 눈을 붙이니 떼지를 못하겠더군요. 밤새 다 읽었어요. 당신의 책에는 보통 사상가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통찰이랄까, 정직함이랄까,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언어를 소화해서 내뱉는 방식이 아주 독특하더군요. 금기도 없고…… 하여튼 내 생각에는 당신이 소설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나 보고 소설을 써보라고 권유한 사람은 오오에 켄자부로오와 김훈(당시 한국일보 문화부 기자) 두 사람이었다. 그런데 켄자부로오는 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줄곧 대화의 초점을 지하로 가지고 갔다.
"당신의 글쓰기에서도 느꼈지만 한국인의 감성에는 어느 민족도 따라갈 수 없는 생명력 같은 게 있어요. 김지하의 시는 단순한 시가 아니라 생명의 약동 그 자체에요. 감옥의 조그만 창틀에 낀 먼지 사이에서 싹트는 파아란 풀, 그 풀의 새싹이 우주 전체를 밀치고 나오는 듯한 그 힘, 그 힘 속에서 무한한 민중의 의지를 발견하는 김지하! 김지하는 정말 특별합니다."
"일본의 선적인 세련미를 가진 시인들에 비하면 너무 거칠지 않나요?"
"뭔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김지하의 시는 바로 그 거침 속에서 우주적 생명이 발랄하게 뛰어놀아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신선한 바람이 그의 언어를 감돕니다. 김지하는 정말 특별한 시인입니다. 언어를 거치지 않은 귀신의 놀이에요. 저는 정말 김지하를 존경하고 흠모합니다. 한국인들이 김지하를 보다 깊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러한 지하의 유산이 "죽음의 굿판 걷어치우기"에서 끝난 것일까? 모로 누운 돌부처를 산산조각 낸 임옥상의 처사는 매우 정당하다. 허나 변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지하에게 그가 남긴 위대한, 정의로운 문화유업까지 산산조각 내어버리는 것은 불가하다.
나는 지하와 오래 사귄 사람이다. 그의 비극은 강일순이 말한 "해원"을 심도있게 실천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다. "짜식들이, 의리가 있어야지!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가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내가 누군데를 말하는 그의 푸념이 말년의 생애를 덮었다. 참으로 딱하다. 인간의 최대의 죄업은 "고독"이다. 지하는 너무 고독했다.
엊그제 친구 이부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김지하 추모제를 하는데 나의 참석을 요구하는 전화였다. 이부영은 참으로 의리가 있다.
나는 사실 안 나가도 그만이다. 그러나 지하의 과거사는 과거사 나름대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그의 요청은 매우 진실한 요청이다. 나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발걸음을 아낄 이유가 있나?
지하(芝河)라는 이름은 일본의 출판인들이 한자를 우아하게 고쳐 만든 이름이다. 김지하는 대학시절부터 하도 지하써클을 많이 하고, 지하다방에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자기 이름을 그냥 "지하(地下)"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지하에게 직접 들은 얘기다.
지하는 지금 자업자득일지는 모르지만 억울하게 지하에 갇혀있다. 우리는 지하를 정당하게 지하로부터 끌어내야 한다. 그러한 기회를 만들고 있는 이부영과 그의 친구들에게 나는 경의를 표하고 싶은 마음밖에는 없다.(2022년 6월 11일 오후 2시 탈고, 낙송암에서)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