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종이가 사라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 한 편이 떠오른다. 1949년에 발표되어 전체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과 자유의 소중함을 시사하였던 소설로 알려진 조지 오웰의 <1984년>이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텔레스크린(Telescreen)을 통해 세상의 정보를 얻고, 즐거움을 얻고 사람과 소통한다. 또한 사람들은 텔레스크린을 통해 빅브라더(Big Brother)에게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 그걸 당연시 하면 살아가고 있다.
텔레스크린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굳이 기억하고 기록할 필요가 없다. 필요한 모든 정보를 빅브라더가 텔레스크린을 통해 다 제공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뭔가를 읽고 잡다한 생각은커녕 고민도 할 필요도 없다. 빅브라더의 세상에서 종이나 종이책은 사라진 지 오래다. 종이나 펜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한 일이다. 책을 읽는 내내 종이책과 펜이 사라지고 자유롭고 비판적 상상력을 펼칠 수 없는 세상이 두려워 졌다. '결코 이런 세상은 있을 수 없을 거야' 혼잣말을 했던 것 같다.
종이와 활자는 근대 문명의 견인차이다. 종이가 활자를 만나, 왕과 귀족의 독점물이었던 정보와 지식이 사회적으로 보급될 수 있었다. 서구에서 시민혁명의 분위기가 들끓던 무렵 세상 사람들에게 로크나 루소와 같은 자유주의자들의 자유와 평등의 정신을 확산시킬 수 있었던 것도 종이책, 종이신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제 강점기나 독재 시절 청년들은 비밀리에 독서회를 열어 책을 통해 독립과 자유의 꿈을 키웠다. 소위 종이책은 민주주의의 원동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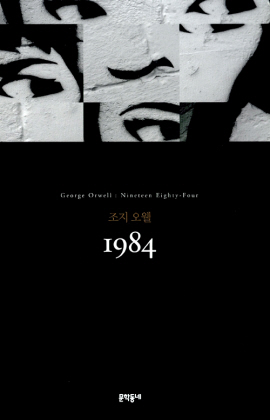
|
| ▲ <1984>(조지 오웰 지음, 김기혁 옮김, 문학동네 펴냄). ⓒ프레시안 |
사람의 지식이 진화해온 것처럼 '책'도 진화해 왔다. 최근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전자책은 정보화 시대의 자연스런 산물일 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전자책을 읽는 동안 나는 뭔가 잃어버리는 것 같다. 보통 종이책을 읽는 동안, 저절로 동서고금으로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고 있다. 때로는 저자와 논쟁도 하고, 또 때로는 연상되는 것을 기록하기도 하고 인용하고 싶은 부분에 밑줄 '쫙' 치기도 한다. 독서삼매경에 빠질 때면 '나'는 사라진다.
그러나 전자책을 읽으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 입을 반쯤 벌린 채 그저 쳐다볼 뿐이다. 더욱이 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수많은 정보는 사고력을 정지시킨다. 고민스럽게 종이책을 일일이 고르고 넘기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에 길들여 질수록, 사람의 지적 능력은 퇴보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 문맹률 '0' 시대에 사실상의 문자 해독률은 더 떨어지고 있고, 비판적 지성은 둔화되어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의 손에서 책이 떨어지지 않던 시절은 추억이 되었는가? 종이책이 필요 없는 <1984년>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를 정보화 시대에 낮은 목소리로 외쳐본다. "독서는 힘이다."
(이 글은 <한성대신문> 2009년 10월 12일자에도 실렸습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