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워낙 심각한 고장이라 전화번호를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는 것이다. 일순 패닉 상태에 빠졌다. 아니 이걸 어쩐다. 사람들 번호가 순식간에 날아간다는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해졌다. 전화번호가 없어진다는 것은 그동안 쌓았던 관계가 상실된다는 의미다. 20년 사회생활 공염불이 될 판이었다. 그때부터 동분서주, M사와 A사의 서비스센터를 왔다갔다하며 간신히 고장난 기기에서 새로 구입한 휴대폰으로 번호를 옮기는데 성공했다. 그때 들었던 안도감이란. 휴, 정말 큰일을 치른 느낌이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웃기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거 완전히 조그만 기계 하나에 매여 사는 꼴이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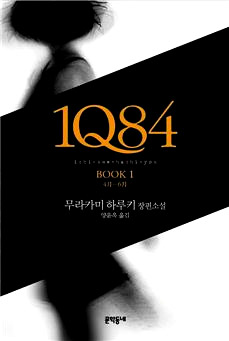
|
| ▲ <1Q84> |
흥미로운 것은 이 소설의 배경이 1984년이라는 점이다. 거기엔 휴대폰이 없다. 컴퓨터도 없다. 주인공 가운데 한명인 덴고라는 인물은 작가 지망생인데 이제 막 워드 프로세서를 쓰고 있는 정도다.
휴대폰에 내장된 천여명의 전화번호를 잃어버릴 뻔, 안절부절했던 상황과 하루키가 선사한 '1984년'이라는 시대적 알레고리, 그리고 그에 대한 상상력은 좋은 대조를 이룬다. 현대생활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첨단 기기들은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를 우리에 가두고 덫에 빠뜨리게 하는 요망스러운 장치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편리함을 택하고 상상력을 버렸다. 빠르고 손쉽게 사람들과 접속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지만 사실은 관계 자체의 중요한 의미를 잃어버렸는지도 모를 일이다. 파트리스 셰로의 영화 <인티머시>처럼 사실은 서로가 전혀 '친밀하지' 못한 상황에 빠져, 홀로 외롭게 허우적대며 살고 있을 뿐이다.
일본의 또 다른 작가 무라카미 류는 <69>란 작품에서 과거 러시아 혁명을 이끌었던 블라디미르 레닌의 말을 살짝 비틀어서 '권력은 상상력에서 나온다'는 표현을 썼다. '총구(군부 혹은 무력투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갖고 있었던 천여개의 전화번호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우월적 위치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진짜 권력이 아니다. 진정한 파워는 '전화번호=사람'이라는 인성(人性) 회복의 의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전화번호를 복원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전화를 받을 때마다 이 번호의 주인이 누굴까를 놓고 당황해 했을까. 그런데 그게 사실은 '즐거운 불편함'이 되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한명한명 이름을 입력해 나갈 때, 그 사람과 새로운 사귐을 시작하는 기분이 들게 되지는 않았을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내장된 전화번호를 '모두 삭제'해 버리면 어떨까. 에이, 뭘 또 그렇게까지. 지금부터라도 휴대폰 속 전화번호의 소중함과 그 의미를 잊지 않으면 될 터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준 무라카미 하루키에게 건배를!
(*이 글은 모바일 매거진 '엠톡'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