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작곡하는 음악을 통해 자신의 분노와 더 나은 사회에 대한 꿈을 표현하는 런던 작곡가의 이야기이다.
그것은, 자연 파괴에 투쟁하기 위한 정원을 만드는 촐룰라의 정원사의 이야기이다.
그에게 의미와 기쁨을 주는 활동을 하기 위해 저녁에 그 정원사의 정원 텃밭으로 가는 버밍햄의 자동차 (공장) 노동자의 이야기이다.
자율적 자치 공간을 만들고 그들을 괴롭히는 준 군사조직들(사병들)에 맞서 매일 그것을 지키는, 오벤틱, 치아빠스의 원주민 농민들의 이야기이다.
비판적 사상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 틀 바깥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아테네의 대학 교수들의 이야기이다.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책을 출판하는 일에 자신의 활동을 집중하는 바르셀로나의 출판업자의 이야기이다.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합창단을 꾸리는 뽀르또 알레그레의 친구들의 이야기이다.
색다른 유형의 학교, 색다른 유형의 교육을 위해 싸울 목적으로 경찰 억압과 대치하는 뿌에블라의 교사들의 이야기이다.
자신의 연극을 보는 사람들에게 색다른 세계를 열어주기 위해 나름대로의 기법을 사용하려고 결심하는 비엔나의 극장 연출자의 이야기이다.
남는 시간이 생기면 언제나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드니의 콜센터 노동자의 이야기이다.
물이 사유화되지 않고 그들 자신의 통제 하에 놓이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군대에 맞서 함께 모여 싸우는 꼬차밤바의 주민들의 이야기이다.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는 서울의 간호사들의 이야기이다.
공장을 점거하여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네우껜의 노동자들의 이야기이다.
대학은 세상에 대해 질문을 하는 시간이라고 결심하는 뉴욕의 학생들의 이야기이다.
자본주의의 잔인성에 격노하여 세상을 바꿀 무장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정글로 가는 멕시코시티의 청년의 이야기이다.
자본주의적 세계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는 베를린의 은퇴교사의 이야기이다.
에이즈와 싸우기 위해 자신의 자유 시간 전부를 바치는 나이로비의 정부 노동자의 이야기이다.
행동주의와 사회적 변화에 관한 과정을 개설하기 위해 몇몇 대학들에 아직 남아 있는 빈 공간을 사용하는 리즈의 대학 교수의 이야기이다.
베이루트 교외 평지의 흉측한 블록에 살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콘크리트에 대항하는 반란으로 자신의 창틀에서 식물을 가꾸는, 노인의 이야기이다.
세계 전역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자신의 삶을 더 나은 세계를 위한 새로운 투쟁 형태를 발명하는 일에 던지는, 류블랴냐의 젊은 여성, 플로렌스의 젊은 남성의 이야기이다.
자신의 작은 과수원이, 팔리지 않은 자동차들을 세워놓을 커다란 주차장에 흡수되는 것을 거부하는 우에호칭고의 농민의 이야기이다.
빈집을 점거하고 집세 지불을 거부하는 로마의 한 무리의 집 없는 친구들의 이야기다.
자신의 거대한 에너지 전부를 색다른 세계를 위한 새로운 전망을 여는 데 바치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열성주의자들의 이야기다.
오늘은 일하러 가지 않겠다며 이런저런 책을 들고 공원에 쉬러 가는 도쿄의 소녀의 이야기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에 대한 헌신으로서 건조 화장실을 짓는 데 헌신하는 프랑스 청년의 이야기다.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일자리를 그만둔 할라빠의 전화 기술자의 이야기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사랑과 상호부조의 세계를 만듦으로써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는 에딘버러의 여성의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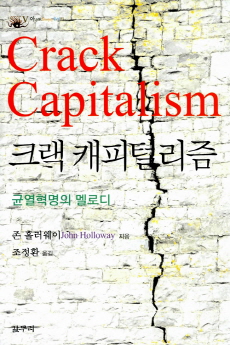
|
| ▲ <크랙 캐피털리즘>(존 홀러웨이 지음, 조정환 옮김, 갈무리 펴냄). ⓒ갈무리 |
주인공들의 행동이 극적으로 보이지만 이 책은 결코 소설이 아니다. 주인공들은 지금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다. 사실 이런 주인공들보다는 우리 사회가 한 편의 소설 같다.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망루와 철탑, 옥상에 올라 수십, 수백 일 동안 농성을 해도, 하루에 한 명 이상의 청소년이 자살을 해도, 8년 동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온갖 모욕을 견디며 송전탑을 반대해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한국사회이니 말이다. 소설 같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쩔 도리가 있냐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홀러웨이는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를 파괴하는 사회를 만들어 내는 것은 우리이다. 그렇게 하기를 멈출 수 있는 것도 우리이다."
다른 일상을 살려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은 국가와 자본주의에 균열을 내고 무너뜨리려면 "온갖 방식으로 거부-와-창조의 공간들이나 순간들"을 만들고, "아니오, 우리는 거부하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할 것이오"라고 선언하고, 그러면서 "세계가 거부들-과-창조들로 가득 차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사소하게 보이지만 앞서의 주인공들은 잠재력을 가진 존재들이다. 일하러 가기를 거부하고 공원에서 책을 읽던 소녀가 희망버스를 타고 '함께 살자 농성촌'에 드나들며 자신의 잠재력을, 그리고 "자본주의 속에서-대항하며 넘어서는 투쟁"의 의미를 깨달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어진 사회를 거부하고 창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접합,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진다. 물, 대기, 숲과 같은 생태적 공유지, 복지, 건강, 교육 같은 사회적 공유지, 통신수단 같은 네트워크화된 공유지를 다시 탈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세울 수 있다. "평범한 반란성의 상호 공명이야말로 혁명을 코뮌화하는(communising) 유일하게 가능한 기초"이고 "노동에 대항하는 행위의 반란의 핵심"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 자신의 책임을 짊어진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행한다."
그런데 기존의 사회 운동은 이런 잠재력에 주목하지 않았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물에만 주목하는 운동은 "억압당하는 주체의 창조력"을 인정하지 않고 주체를 대상화한다. 홀러웨이는 이런 경향을 강하게 비판한다.
"이것은 존엄의 정치(학)이 아니라 빈곤의 정치(학)이며 대화의 정치(학)이 아니라(예를 들어 정치적 지도자들의 연설의 길이 속에 반영되는) 독백의 정치(학)이다. 민중은 행위자로 이해되지 않고 희생자로, 가난한 사람들로 이해된다."
그리고 기존의 사회 운동은 국가와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무너뜨리려 했지만 "대항하며-넘어서기"라는 "대항-성"에 주목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회관계에 균열을 일으키지 못하고 외려 그것을 지탱하는 역할을 했다. 다른 사회적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이들의 구상은 언제나 자본주의 내에 머물렀다.
그런 점에서 홀러웨이는 '다른 정치(학)'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자신과 타자를 행위자와 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표현할 적절한 조직 형식을 찾아야 한다. 즉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수평성을 실현할 수 있는 조직, "능동적 참여의 증진, 직접 민주주의, 그리고 동지애" 등을 갖춘, 새로운 주체를 담을 새로운 부대자루가 필요하다.
나아가 홀러웨이는 노동과 행위를 대비시키며 "노동-과-자본에 대항하는 행위의 투쟁"을 강조하고, "노동과 비-노동 사이의 구분을 극복"해서 "의식적인 삶-활동(성)"을 회복하길 원한다. 자본주의의 추상노동을 구체적인 노동과 유용한 노동으로 바꾸고 노동을 행위로 바꾸길 원한다. 더 이상 자본주의나 국가를 위해 일하거나 그들을 지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관계를 맺으며 다른 시간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삶은 전적으로 새로운 언어에 기반을 두고 기존의 문법에 얽매이지 않는다.
"새로운 언어가 문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문법은 규칙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행위의 언어의 유일한 규칙은 규칙들을 깨뜨리는 것이다. 아마도 우리는 반-문법에 대해, 아니 오히려 리듬이나 멜로디를 생각해야만 할지 모른다. 새로운 언어의 멜로디를 배우는 것은 탐구, 질문, 자극, 토론의 과정이다. 멜로디를 창조하는 것은 투쟁의 움직임이다."
우리도 균열을 낼 수 있을까?
홀러웨이는 그런 삶과 투쟁이 지금 당장 가능하다고 본다. 아직 눈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잠재된 것, 부정되는 존재양식에는 여전히 행위(doing)의 가능성이 살아 있다. "우리는 아직 실존하지 않는 세계를, 그 세계를 삶으로써 창조한다.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의 세계를 주장할 뿐이다." 홀러웨이는 "그 다음에는 무엇이?"라는 물음과 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답은 없다. "물으면서 걷기"만 있을 뿐.
나는 이 책을 읽으며 많은 위로를 얻었고 많은 가능성을 보았다. 요즘 나의 고민은 미래를 살아가는 삶, 사소한 고민들이 모여 큰 줄기를 만드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그런 삶과 운동을 고민하는 동지를 찾은 느낌이어서 매우 반가웠다.
그러나 순수하지 못한 현실을 사는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사실 나는 이 책이 한국에서 어떻게 소화될 수 있을까, 아니 우리가 소화를 시킬 수나 있을까 걱정한다. 잠재성보다는 지금 당장의 결과와 결론만을 강조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기존의 문법을 파괴하는 새로운 언어와 행동을 수용할 수 있을까? 차이를 아주 거북해하는 우리가 이런 독특함에 주목할 수 있을까? 거부와 창조가, 대항하기와 넘어서기가 이어지는 과정임을 이해할 수 있을까? 진정 수평성을 실현하는 새로운 조직 형식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국가와 자본이 손잡고 기본적인 규칙조차 무시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한국사회에서 균열은 끊임없이 봉합되지 않을까? 이런 물음이 계속 꼬리를 물었다.
사실 보수의 강고함도 걱정되지만 그보다 더 걱정되는 건 진보의 취약함이다. 다양한 실천을 문학의 영역으로 제한하려는 건 국가나 자본주의만이 아니라 그와 맞선다는 사회 운동의 뒤틀린 자의식이기도 하다. 자본주의를 균열내기는커녕 자기 안의 균열에 시달리다 무너지기를 반복하지 않았는가?
물론 홀러웨이가 말하듯이 답은 없다. 끊임없이 묻고 답하는 과정이 있을 뿐. 이 책이 우리 사회에 좀 더 많은 물음을 던지길 기대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