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여행의 사고>는 보수화된 한국 사회를 벗어나 세계사적 시야를 넓히는 기능을 한다. 대선의 결과로 인해 참담한 심정이라면 <여행의 사고>를 통해 신선한 에너지를 수혈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 책은 주체의 입장에서 여행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체를 최대한 폐기한 상태에서 여행지를 사유한다. 새로운 주체가 발아될 사고의 토양이 이 책에는 무궁무진하다. 이것이 '여행의 사고'가 지닌 진정한 의미이다.
전반적으로 이 책의 구성과 편집은 매우 훌륭하다. 여행지의 풍경과 인물 사진이 아름답게 편집되어 있어 시각적인 즐거움 또한 크다. 모두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은 멕시코와 과테말라, 제2권은 인도와 네팔, 제3권은 중국과 일본을 다룬다. 제각기 다른 각성과 흥미를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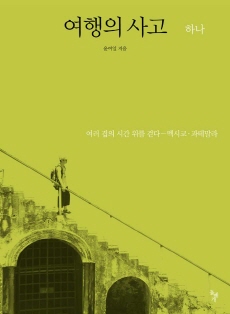
|
| ▲ <여행의 사고-하나>(윤여일 지음, 돌베개 펴냄). ⓒ돌베개 |
제2권은 인도와 네팔에 강제된 외부인의 시각을 걷어낸다. 인도의 종교에 대한 풍부한 식견은 여행의 현장성과 절묘하게 결합된다. 인도의 불교철학이 유럽 지성사에 남긴 영향은 지적으로 흥미롭고, 네팔의 '에베레스트'라는 이름에 남아있는 제국주의적 흔적은 아프게 읽힌다. 티베트의 독립 문제에 대한 중립적 태도 역시 여행의 단순한 감상에서 벗어나려는 '여행의 사고'에 걸맞다. 그 외의 다양한 여정이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이어지고 있다.
제3권은 중국과 일본의 근대 사상사 여행이다. 저자의 학문적 관심이 철저히 묻어난다. 그런 만큼 제3권은 동아시아 사상의 흔적을 아주 밀도 있게 추적한다. 다케우치 요시미가 루쉰을 통해 일본 사회의 개혁을 도모했던 사상의 흔적이 그 중심이다. 당연히 루쉰의 사상 또한 밀도 있게 향유되고 있으며, 중국의 사상가 쑨거와의 개인적 인터뷰를 통해 동아시아 담론이 갖추어야 할 주체의 윤리를 사유하기도 한다. 루쉰과 다케우치 요시미의 구체적 삶의 풍상 역시 위대한 사상가에 대한 인간적 호기심을 충족시킨다.
<여행의 사고>는 저자가 말한 것처럼 여행의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한국'을 떠나서 세계를 두루 여행함으로써 자명하다고 여겼던 우리 사회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자가 이 책의 서두에서 인용하고 있는 레비스트로스의 말은 울림이 크다. '만성적 고향 상실증'. 인류학자에 대한 정의라 할 수 있는 이 말은 제2권에서 생 빅토르 후고의 문장으로 이어진다. 내가 아는 번역으로 고쳐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고향을 감미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허약한 사람이다. 모든 곳을 고향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이미 상당한 정신의 소유자다. 전 세계를 타향이라고 느끼는 사람이야말로 완벽한 인간이다."
사실 이 책은 레비스트로스와 생 빅토르 후고의 말을 근간으로 삼는다. "전 세계를 타향이라고 느끼는" "만성적 고향 상실증"이야말로 저자가 취하는 여행의 근본적인 태도다. '나'라는 주체를 타자로 인식하는 방법으로서의 여행. 자문화와 타문화의 경계를 수없이 횡단하면서 타문화를 통해 자문화에 감추어진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것이 '여행의 사고'의 목표다.
그런 까닭에 저자는 단순한 여행자의 포즈를 취하지 않는다. 그에게 여행자란 그저 몸만 가져가는 존재가 아니라 "물리적·역사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경제적 의미의 자장"에 둘러싸인 "하나의 세계"로서 움직이는 존재다. 세계를 해석하는 주체, 그 주체마저 부단히 폐기하는 사고의 윤리를 갖춘 여행자다.
여행지를 단순한 심미적 대상으로 전락시키거나 자기 과시적 고백에 빠져있는 여행기에 물린 독자라면 <여행의 사고>가 안성맞춤이다. 저자의 인문사회학적 식견이 독자의 여행을 깊고도 드넓은 사유의 세계로 인도한다. 하지만 어떤 근사한 해답이나 결론을 바라서는 안 된다. 앞서 말했듯이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 비로소 진정한 여행이 시작될 테니까 말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