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식은 단순하다.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 얘기해 줄 철학자를 섭외한다. 그리고 15~20분 정도 인터뷰를 하는 것이다.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 해도 혼자 철학 강의를 해버리면 지루해질 수 있으니, 인터넷 방송에는 인터뷰 형식이 어울리겠다. 게다가 철학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쉽게 풀어내려 할 때 인터뷰 형식이 갖는 장점도 있다.
"질문자는 말의 흐름을 끊고 좀 더 명료하게 얘기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혹은 상대방 말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일견 명백해 보이는 반례를 제기할 수도 있다." (10쪽)
{#89329158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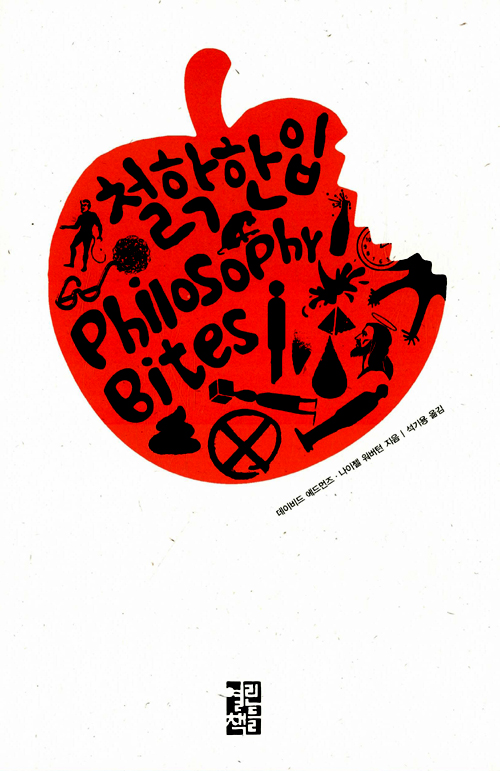
|
| ▲ <철학 한입>(나이젤 워버턴 지음, 석기용 옮김, 열린책들 펴냄) ⓒ열린책들 |
워버턴은 초청한 철학자에게 쟁점이 되는 사안이 무엇이며,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를 묻는다. 그리고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요점을 정리하기도 하고, 보충 설명을 부탁하기도 하고, 짐짓 반론을 펴기도 한다. 그의 주도적인 개입 덕택에 이 책은 강의록보다는 대화록에 가까운 모양새를 띠게 되었다.
이렇듯 인터뷰라는 형식도 흥미로운 데다, 인터뷰이와 인터뷰어가 모두 쟁쟁한 선수들이니 꽤 그럴 듯한 판이다. 그렇기는 해도 (<나는 꼼수다> 같은 시사 비평이 아니라) 철학 팟캐스트가 굉장한 인기를 누렸다니 우리 감각으로는 의아한 일이다. 아무튼 다운로드 수도 엄청났고, 인터뷰 대본을 보고 싶다는 요구가 폭주했다고 한다. 그래서 가장 인기 있었던 인터뷰들을 골라 다듬어 낸 것이 이 책이다.
그렇게 인기 폭발 콘텐츠였다는데, 정작 책을 읽고 난 나의 만족도는 기대보다 높지 않았다. 재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신이 나서 남에게 권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유가 뭘까? 일단 내 생각은 이랬다.
"호흡이 짧다는 것이 인터넷 방송으로서는 장점일지 모르지만 책으로서는 단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팟캐스트는 '듣기'를 위한 매체지만, 책은 '읽고 사색하기'를 위한 매체잖아. 호흡이 너무 짧으면 사색에 힘이 실리기 어렵지."
확실히 '무한'이나 '시간'과 같은 사변적인 주제들을 짧은 인터뷰를 통해 다루는 것은 무리였던 것 같다. 게다가 이 책에서 다루는 비슷비슷한 주제들을 더 자세하게 다루는 다른 입문서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은가. 이를테면 인터뷰이 중 한 명인 스티븐 로가 쓴 <철학 학교>(창비 펴냄) 같은 책 말이다. 그에 비하면 이 짧은 인터뷰들은 뭔가 얘기를 하다마는 듯한 느낌이다.
그런데 꼭 분량이 문제였을까? 철학이든 뭐든 '한입'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 <철학 한입>이라는 제목을 내세운 이상 어차피 이 책은 배 부르자고 읽는 책은 아니다. 그저 입맛을 돋우고 식욕을 자극하는 애피타이저 정도면 족하다. 다시 말해 독자에게 철학적 호기심이 생겨나도록 자극하는 것까지가 이 책의 역할이다. 그렇다면 이 정도 분량도 괜찮지 않은가? 5분짜리 <지식채널e>도 주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충분하지 않던가.
실제로 이 책에서 다루는 어떤 주제들을 나는 분량과 무관하게 재미있게 읽었다. 이를테면 내가 가장 즐겁게 읽은 주제는 '우정'이었다. 인터뷰이는 알렉산더 네하마스인데, (역시 짧은 분량이라) 그가 우정에 대한 체계적인 견해를 제공해주지는 못했지만 곱씹어볼 만한 화두를 몇 가지 던져주었다. 이렇게 내 스스로 숙제를 갖게끔 해준 것만으로도 책을 읽은 보람은 있는 셈이다.
그러니 어쩌면 이 책의 관건은 주제 선정이겠다. 내 편에서 보자면, 대체로 절반 정도는 관심이 가는 주제들이었다. '다문화주의'라든가 '신뢰와 차별', '관용' 등 대체로 윤리학과 정치학 범주에 속하는 주제들이 많은데, 서구의 특수한 정황을 염두에 둔 주제들이긴 하지만 한국 사회와도 무관하지 않은 주제들이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 정도는 재미가 없었는데 (이게 책에 대한 만족도를 깎아먹은 요인인 셈이다) 주로 영어권 철학 교양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식상한 주제들이었다. 의례적으로 데카르트를 출연시키곤 하는 '회의주의'나 '마음과 육체' 같은 주제들, 또는 뒤샹의 변기가 예술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지치지도 않고 등장하는 '예술의 정의' 같은 주제 말이다. 하물며 '신에 관한 비실재론'이나 '무신론' 같은 케케묵은 주제들에 이르면 "대체 이 자들은 언제쯤 이 레퍼토리를 벗어날 작정일까" 하고 중얼거리게 된다.
그러다 든 생각. 우리가 공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어쩌면 저 철학적 진부함 또한 저들의 저력이 아닐까? 저들은 자신들의 철학적-종교적 전통이 야기한 문제들에 대해, 그것들이 아무리 낡아 보일지라도 철저하게 따져묻고 또 따져묻는 일을 지겨울 정도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 됐든 저 문제들은 자신들의 토양과 역사 속에서 생겨난 자신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상상을 해 본다. 한국에서 이와 같은 방식의 팟캐스트나 책을 기획한다면 누구를 모셔다가 무엇을 물으면 좋을까? 옮긴이는 <철학 한입>이 배를 충분히 불려주지 않는 것은 "오히려 진취적인 독자들에게는 기회"라고 하면서, "각각의 주제마다 그들과는 다른 나만의 질문을 던지고, 나만의 답변을 마련해 보자"고 권한다(348쪽). 짧은 책을 나름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런데 아예 그들과는 다른 우리만의 '주제'를 생각해볼 수는 없을까? 한국인들이 신체-정신 이원론이나 신 존재 증명 같은 주제를 통해 철학적 사유에 입문하기란 퍽이나 막막한 일이니 말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