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7월 31일 창간호를 낸 '프레시안 books'가 2년 만에 100호를 냅니다. 이번 프레시안 books는 100호 그리고 2주년을 자축하면서 숫자 '100'을 열쇳말로 꾸몄습니다. 또 100호를 내면서 프레시안 books 100년을 상상합니다. 2013년 100주년을 앞둔 일본의 출판사 이와나미쇼텐을 찾아가고, 100년이란 시간을 견딘 서점, 도서관 등을 둘러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열두 명의 필자는 자신의 추억과 '100'을 엮은 글을 선보입니다. 여러분도 프레시안 books가 펼쳐 나갈 100년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편집자> |
에든버러에 있을 때는 존 쿳시(쿠체)의 <야만인을 기다리며>(왕은철 옮김, 들녘 펴냄) 한 권을 갖고 가 조금씩 아껴 읽었다. 식민 통치 아래에서 비정상적으로 만난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였다. 야만으로 산다고 여겨지는 한 여자를 통해 자신의 야만을 알아 가던 영국 장교의 이야기였다.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작은 다리 하나를 놓고 양쪽으로 펼쳐지는 에든버러에서, 나는 공원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벤치 아래에서 사진 속에서나 보아왔던 낯선 꽃을 발견해서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한 송이를 꺾어 책갈피에 끼워두었다. 낯선 장소에서 만난 반가운 꽃이나 이파리를 간직해두는 일은 낯선 장소에서 처음 읽었던 그 책과 함께 조용한 화학 작용을 일으키며 내 기억의 저장소에 보관되곤 했다.
에든버러에서 갖고 온 그 들꽃은 품종을 알아낼 수 없었고 나는 그 꽃을 '야만의 꽃'이라고 불렀다. 나의 용어로 '야만'은 길들여지지 않고 본성 그대로를 간직한 채 살아가는, 내가 동경하는 삶의 형태에 가까운 것이었다. 하얀 곰팡이가 몽글몽글 묻은 듯한 그 이상한 꽃은 내게 붉고 선명한 색과 형태를 가진 여느 꽃보다는 훨씬 더 원시에 가까운 것으로 보였고, 그 이름은 그래서 어울렸다.
나는 여행 준비를 할 때 내가 가져갈 단 한 권의 책을 고르기 위해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곤 한다. 여러 후보들을 정해두고 며칠이고 고민을 거듭해서 최종 후보를 정한다. 여러 번 읽고 싶은 책일 것. 책에 대한 사전 정보가 거의 없을 것. 아주 천천히 읽히는 책일 것. 나의 여행지와 어느 정도의 인연이 있을 것. 무겁지 않을 것. 작가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 때에 나의 동행자로 작가는 어느 면에서든 든든할 것. 무서움이나 외로움 같은 감정을 부추기지 않을 것 등등의 까다로운 조건들을 적용한다.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오면 여행에 동반했던 책들만을 꽂아둔 책꽂이에 그 책을 꽂아둔다. 그 책 속에는 통성명을 하고 대화를 하고 사귀었던 사람의 명함과 내가 묵은 숙소의 브로슈어와 끄적거렸던 낙서 종이와 낯선 버스 티켓과 내가 찾아간 곳의 입장권 같은 것이 함께 들어 있다. 종이로 된 이 기념품들은 책을 펼치면 그 페이지를 저절로 벌려 자신을 드러낸다.
하지만 꽃잎이나 풀잎 같은 것은 책 속에 얇디 얇게 스며들어 어디에 끼워두었는지 한참이나 뒤적여야만 한다. 그래서 나는 번번이 100번째 페이지에다 그것들을 끼워둔다. 낯선 도시와 낯선 날씨와 낯선 지형에서 내가 발견한 그 꽃은 명함이나 브로셔나 티켓 같은 것과 함께 내가 누렸던 방목의 시간들을 선명하게 상기시키곤 한다.
특히, 꽃잎이나 풀잎은 어느 장소에서 가장 한가롭게 그 장소를 누렸을 때에나 채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개를 수그리고 양지 아래에서 오래 서성였던 내 모습과 그날의 날씨와 하늘과 땅으로부터 배어나오는 냄새 같은 것과 디디고 있는 신발 아래에서부터 느낀 감촉 같은 것들을 고스란히 상기시킨다. 책꽂이의 그 칸에 꽂혀진 책을 종종 꺼내어 펼칠 때면, 종이의 물성에선 박제된 기억만이 재생되지만, 이 납작하게 말라버린 생물에게선 어째서 갖은 감각들이 함께 묻어나오는지 언제나 그게 신기하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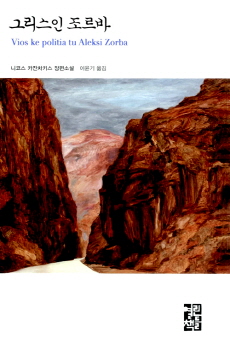
|
| ▲ <그리스인 조르바>(니코스 카잔차키스 지음, 이윤기 옮김, 열린책들 펴냄). ⓒ열린책들 |
그런데 이번 여행은 좀 길어서 배낭을 가볍게 하기 위해 종이책이 아닌 전자책을 다운받아 왔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길가 카페에 앉아 이 생각 저 생각을 할 때에나 잠 안 오는 낯선 방에 누워서 눈만 껌벅이고 있을 때마다 생각하곤 했다. 내가 모은 명함과 티켓과 브로셔는 어디다 꽂아두어야 할지를. 그리고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무덤에서 내가 만날 이름 모를 꽃잎이나 풀잎은 또 어디에 꽂아야 할지를.
아무리 생각해도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어제 100번째 페이지를 지나가며 묘안을 찾아냈다. 100번째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오그레 삼촌, 나는 쑥쑥 자라나는 뿔이에요. 그래서 참 기뻐요."
100번째 페이지에는 꽂아두었던 꽃잎이나 이파리처럼 언제나 펼쳐 보아도 변함없을, 하지만 쑥쑥 자라나는 기억을 선물해줄 수 있는 문장이 꽂혀 있었다. 101번째, 102번째 페이지를 읽으며 그 뿔이 자신만의 빛깔로 피어날 것을 상상한다. 이 100번째 페이지를 나는 '뿔꽃'이라고 부르면 되는 것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