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얼마 전, 또 'SF 판타지' 띠지를 단 책이 한 권 나왔다. 흥 하는 기분으로 표지를 들여다보니, 어라, <브레인 웨이브>(유소영 옮김, 문학수첩 펴냄)다. 설마 하고 판권을 펴 보았다. 정말 폴 앤더슨의 1954년 작품 그 <브레인 웨이브>였다.
폴 앤더슨은 인기 있는 시간 여행 SF <타임 패트롤> 시리즈로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SF 작가이다. 옴니버스 연작 <타임 패트롤>은 시간 경찰의 활약을 역사, 추리 요소와 결합한 흥미진진한 소설이다. 준광속으로 비행하는 우주선 안에서의 시간 지연 효과를 사용한 하드 SF 걸작 <타우 제로>도 1990년대에 번역된 적이 있다. 단편 선집을 통해 출간된 작품도 몇 있으니, 척박한 SF 시장에서 그래도 꽤 많이 소개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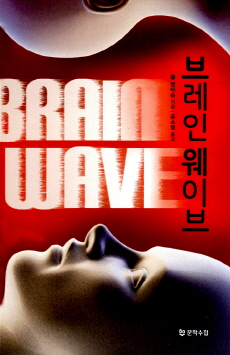
|
| ▲ <브레인 웨이브>(폴 앤더슨 지음, 유소영 옮김, 문학수첩 펴냄). ⓒ문학수첩 |
자그마치 반세기 전에 쓰인 소설이다 보니 '과학인 척 하는 장광설'과 '박사님과 연구실' 같은 낡은 장치가 남아 있다. SF가 아직 과학을 좁고 안이하게 정의하던 시대의 흔적이다. 오늘날의 눈으로 얼핏 보면 "이건 'SF'가 아니라 'SF 판타지'"라는 말에 정색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나 한편, 이 이야기는 단순하고 가감없는 '사고 실험'이라는 면에서 정통 SF의 미덕을 한껏 보여준다. 어쩌고저쩌고한 전기 화학적인 역장이 지구를 통과하자, 모든 사람들의 지능 지수(IQ)가 상승한다. 똑똑하던 사람들은 IQ 500의 천재가 되고, 평범하던 사람들은 똑똑해지고, 어리석던 이들은 평범해진다.
자, 이렇게 모두 다 더 똑똑해지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사람들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도시는 어떻게 될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세계는 어떻게 될까? 다른 생명체들과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까? 인류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앤더슨은 하나의 가정에서 시작, 여러 층위의 질문을 떠올린 다음, 이야기의 틀에 담아 차근차근 풀어간다. 우선 똑똑해진다는 것은 뭘까? 폴 앤더슨은 '똑똑해짐'을 문제에 대한 이성적인 해답을 쉽고 정확하게 찾아내고, 문제에 빠르게 대처하는 능력으로 설정했다. 추리 소설을 즐기던 이는 고전을 읽고, 텔레비전을 보던 이는 책을 읽는다. 어린아이들이 미적분을 떼고, 정신 장애인은 '옛날 보통 사람'처럼 대화하기 시작한다. 돼지는 울타리 빗장을 열고 원숭이는 인간과 의사소통을 한다.
그러나 지능지수가 높아진다고 더 현명해지는 것은 아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신흥 종교가 탄생한다. 너무 많은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정신을 감당하지 못해 무너지는 이들이 생긴다. 모두 다 더 똑똑해졌으니 해결책을 찾기는 쉬워졌을지 몰라도, 모두가 '나'가 아니라 '우리 '가 함께 살아날 길을 찾는 데 그 머리를 쓰는 것은 아니다. 혼란스런 상황에서 대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성격인 사람도 있고, 일단 도망치는 사람도 있다. 지능이 변하며 달라진 관계 앞에서 체념하고 절망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돌이킬 수 없는 변화는 인류를 변화시킨다.
이 책은 오랜만에 나온, '과학 소설'이라는 말에 독자가 떠올릴 만한 정통적이고 모범적인 SF이다. 고리타분하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이 이야기는, 잘 쓰인 모범적인 소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무척 재미있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브레인 웨이브>는 SF가 좋은 소설이기 위해서는 좋은 가정만큼이나 좋은 질문이 중요함을 새삼 깨닫게 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사고 실험으로서의 SF가 갖는 가장 큰 힘은 신선한 설정이나 그럴듯한 정답에 있지 않다. 우리에게 질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 있다. 바로 이 가능성을 통해, SF는 하나의 장르인 동시에 하나의 이야기로서의 힘을 얻는다.
그 힘에 몸을 싣고, 작가가 보여주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삶을 읽고, 나의 질문과 답을 마음껏 생각해 보는 즐거움은 독자의 몫이리라.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