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와 한문은 엄연히 다르다. 성어와 한시도 많이 다르다. 한시는 대부분 5언이나 7언으로 이루어진다. 글자 수로는 고작 1과 3의 차이뿐이다. 허나 그 차이의 정도는 기하급수적이다. 막연하게나마 한문과 나와의 관계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하기는 했다.
예술의 전당에서 '청명 임창순 10주기 전'을 본 것은 2년 전의 일이었다. 인제대학교에서 중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님과 동행했다. <적벽부>를 줄줄 외우는 교수님한테 경구나 한시에 대한 해석을 듣는데 여러 생각이 일어났다. 어느 액자 앞에선 뜻은 잘 모르는 채 붓글씨에만 고개를 끄떡이자니 어느 소설가의 말마따나 "가죽장갑 끼고 애인의 젖가슴을 만지는 기분이었다."
한문 공부를 겸해서 뒤늦게나마 한시의 세계에 한 발을 걸치자고 했다. 살다보면 한시 한 수 눈에 들어오는 건 흔한 일이다. 그러나 더듬더듬 읽어내기조차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총중에 흩어진 구슬을 한 목걸이로 꿴 것처럼 우리 한시가 한 자리에 집합했으니, 나에게 정말 맞춤한 책이라는 생각부터 들었다.
시란 시인의 가슴에서 튀어나온 마음이요, 시인이란 시대의 조류 속에서 호흡하고 헤엄치는 물고기와 같은 존재라 할 수 있겠다. 그러니 이 한 편의 말 꾸러미는 시인은 물론이요 시인의 당대와 결코 유리될 수가 없다. 보통 우리가 접하는 시 해설이 자구 해석에 치중하고 인용된 고사의 설명에 머무는 데에 비해 <한국 한시 작가 열전>(한길사 펴냄)의 저자 송재소는 이런 맥락을 철저히 파고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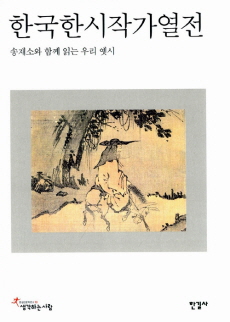
|
| ▲ <한국 한시 작가 열전>(송재소 지음, 한길사 펴냄). ⓒ한길사 |
이 책에는 신라의 최치원에서부터 한말의 신채호까지 26명의 시인이 등장하여 한국 한시의 26곡을 이룬다. 그러기에 우리 조상들이 천 수백 년 동안 창작해 온 한시의 빼어난 조감도라 할 만하다. 이 조감도에는 그 자체로 다양한 요소와 굽이굽이 굴곡을 포함하고 있어 한시 자체의 유장한 역사만큼이나 은근하고 깊은 맛이 곳곳에 배여 있다. 그 몇몇을 골라본다.
시간으로는 신라 시대로 거슬러 간다. 그 유명한 최치원의 <秋夜雨中(추야우중)>으로 첫 수를 연다. 높이로는 지리산까지 오른다. 지리산 아래에서 평생을 칩거한 조식의 <德山卜居(덕산복거>에는 단호한 유학자의 개결한 품성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春山底處無芳草 只愛天王近帝宮 白手歸來何物食 銀河十里喫有餘." (봄산 어딘들 방초가 없으리요만 / 천왕봉이 제궁과 가까움을 사랑할 뿐 / 맨손으로 돌아와 무엇을 먹을 건가 / 십리길 은하를 먹고도 남겠네.)
넓이로는 중국은 물론이요 일본까지 간다. 고려시대의 정몽주가 지은 <洪武丁巳奉使日本作(홍무정사봉사일본작)>의 제3연은 다음과 같다.
"梅窓春色早 板屋雨聲多." (매화 핀 창가엔 봄빛이 이르고 / 나무로 지은 집 빗소리 요란하네.)
저자는 이를 이렇게 해설한다.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낮기 때문에 빨리 찾아온 봄과 일찍 핀 벚꽃들, 그리고 요란한 빗소리를 빌려서 묘사한 일본 특유의 목조 건물이 자아내는 이국정취를 열 글자로 간결하고 깔끔하게 그려내고 있다."
뿐인가. 깊이로는 아득한 숲속의 한가한 정취를 쫓는다. 김시습의 이런 한 구절은 어떤가.
"花是山中曆 風爲靜裏賓." (꽃은 산속의 달력이요 / 바람은 고요 속의 손님일세.")
이어지는 저자의 말.
"세상과 인연을 끊고 깊은 산속에서 홀로 살기에, 꽃이 피고 꽃이 지는 것이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리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고요한 곳이기에 문을 두드리는 손님은 바람밖에 없다."
또한 뿐인가. 우리 한시의 강물은 밋밋한 직선의 흐름을 싫어하는 모양이다. 사대부, 혁명가, 방랑객, 선비만을 찾아간 것도 아니다. 끊임없이 사람의 마을을 돌고 돌아 천천히 흐르더니 담장을 넘기도 한다. 그러다가 허난설헌의 허운한 이불을 들추고 새벽잠을 깨워놓기도 하였으니.
"絳紗遙隔夜燈紅 夢覺羅衾一半空 霜冷玉籠鸚鵡語 滿階梧葉落西風." (붉은 비단 저 너머 밤 등잔 붉은데 / 꿈을 깨니 비단이불 한쪽이 비었구려 / 새장의 앵무새, 서리 차다 울어대고 / 섬돌 가득 오동잎, 서풍에 떨어지네.)
이렇듯 한시의 역사를 꿰뚫다보니 한시를 대하는 태도와 작품의 변화도 한눈에 들어온다. 우리나라에서 한시를 평가하는 기준은 그 작품이 얼마나 당시(唐詩)에 근접하느냐였다. 그러나 이러한 안목은 박제가에 이르면 변화하기 시작한다. "시를 쓰려는 사람들은 으레 당시를 시의 전범으로 여겼고 당시 중에서도 두보의 시를 으뜸으로 여겨 이를 모방하는 데에 급급했다. 그래서는 좋은 시를 쓸 수가 없다고 했다. 시인은 모름지기 자기 목소리를 내는 개성적인 시를 써야 한다는 것이" 박제가의 생각이었다.
이어 정약용의 "조선 사람이 조선 땅에서 조선 사람의 정서를 조선식으로 표현하면 되지 구태여 중국적인 기준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는" 인식에 이른다. 그리고 신채호를 거치면 유교는 철저한 부정의 대상이 된다. 신채호가 쓴 <매미의 노래>는 6연으로 된 장시(長詩)로서 이러한 파격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요즘 말로 한다면 실험적 한시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다.
"하늘이 무엇이냐 매암매암 / 땅이 무엇이야 매암매암 / 바람도 구름도 매암매암 / (……)"
연암의 시를 읽다가 놀란 게 있다. 이 책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는 연암의 <燕巖憶先兄(연암억선형)>을 대단히 좋아한다.
"我兄顔髮曾誰似 每憶先君看我兄 今日思兄何處見 自將巾袂映溪行." (형님 모습 누굴 닮으셨던가 / 아버님 생각나면 형님 바라보았는데 / 그 형님 그리운데 어디에서 뵈올까 / 흐르는 시냇물에 내 모습 비춰보네.)
아버지 보고 싶을 때 형님 모습 보았는데, 이제 그 형님마저도 세상을 떠나셨다. 그리운 모습들을 어디에서 찾나. 냇물에 비친 내 모습에는 아버지 얼굴도, 형님 모습도 다 들어 있다. 아버지와 형님과 나는 모두 서로 닮았다! 나는 이 시를 읽고 연암은 유전법칙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다소 엉뚱한 생각을 하였었다. (유전의 비밀을 간직한 이중나선 구조는 우리나라의 새끼 구조와 굉장히 닮았다!) 그런데 이 책에서 다음의 시를 읽으면서 나는 놀랐던 것이다. 일출을 관찰하고 묘사한 다음의 시를 보라. 이를 연암의 과학적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어디 지나친 비약일까.
"圓來六萬四千年 今朝改規或四楞." (육만이라 사천 년을 둥근 모습 지녔으니 / 오늘 아침 원을 바꿔 사각 모양 될는지도.)
연암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창작론을 전개한다. 본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동네 아이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는데 읽기를 싫어한다고 나무랐더니 그 아이가 말하기를 '하늘을 보니 푸르고 푸른데 천(天)이란 글자는 푸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읽기가 싫습니다'라 했습니다. 이 아이의 총명함은 창힐(蒼頡)을 기죽일 만합니다."
이 대목에서 아주 오래 전에 들었던 문학평론가 도정일의 한 마디가 생각났다. '영상 세대의 출현과 인식론의 혁명'이란 포럼에서였다. 그는 말했다.
"우리는 낡은 기억과 흑백 사진을 보고 과거를 재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은 그 옛날대로 총천연색의 세계였지요!"
아하, 그랬다. 듣고 보니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었고 새기고 보니 또한 너무나도 당연한 문장이었다. 그동안 내가 착각하여 과거를 무채색으로 칠하였던 셈이었다.
따지고 보면 옛날에는 그래도 중국에서 시정(詩情)이 왔다. 그러나 요즘은 황사(黃砂)가 온다. 어느 시대가 자연의 색감을 더 즐길 수 있는 조건에 놓였는가. 옛 시 또한 흰 종이에 검은 활자의 세계가 아니라 "까치 하나 외로이 수숫대에 잠자는데 / 밝은 달, 하얀 이슬, 밭골 물은 졸졸 우네 / 나무 아래 오두막은 둥글기 바위 같고 / 지붕 위 박꽃은 별처럼 반짝이"는 풍경이란 것을 알았다. 좋다고 밑줄 그으며 읽기보다는 머릿속에 물감 풀어 넣고 즐겨야 한다는 것을 저 어린아이의 순진무구함에서 다시 한 번 터득했다.
다산의 시는 저절로 읽는 이의 마음을 흥건히 적신다. 다산은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상과 지방 관리들의 횡포를 직접 목격했고, 이것이 그의 전 생애를 일관하는 민중 지향적인 사고의 출발점이 된" 시인이다. 참으로 우연하게도 이 책을 읽으며 서울에 있는 한남대교를 건너다가 아래 구절을 만났다.
"不有天雨粟 何以救世飢." (하늘에서 곡식이 비처럼 오잖으면 / 무슨 수로 이 흉년을 구한단 말인가.)
책장을 잠시 덮었다. 최근 비가 많이 왔다. 비는 하늘에서 오는 물질이다. 근데 이 물질이 그만 너무 많이 와 버렸다. 그런 와중에 어느 위정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이렇게 비가 온다면 당해낼 도시가 없을 것이다." 옛날로 치면 치수를 담당했을 관청에서는 "이것은 인재가 아니라 천재이다" 이러며 아예 말뚝을 박았다고도 한다. 아직 물도 다 안 빠진 마당에. 그이들의 흉중에서 뱉어진 이런 언사를 아주 쉽게 순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이번 일은 내 탓이 아니야!" 정도가 될 것이다.
이번 수해는 말하자면 하늘이 때리고 땅이 맞은 것이다. 얻어터진 땅에는 비명이 낭자한데 왜 먼저 하늘부터 가리키는 것일까. 나중엔 어디 "惰農自乏貲(게으른 놈 굶는 것은 모두 다 제 탓이지)"라고 할 텐가. 마음의 끌탕이 고작 그것뿐이었던가.
세상의 근심을 아랑곳하지 않고 한강의 흙탕물은 넘실넘실 흐르고 있었다. 한남대교 부근이 이 정도라면 두물머리에는 소용돌이가 아주 심할 것이다. 사나운 기세의 물소리에 밤잠을 설치고 마음의 고개를 계속 하류로 빼고 있을 다산 정약용. 시심(詩心)이라고는 4대강에 떠내려 보낸 자들의 저런 언사를 접한다면 뭐라고 하실까. 책의 마지막 쪽을 넘기며 나는 몹시 궁금해졌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