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서평이란 무엇인가?" '프레시안 books'로부터 이런 주제로 원고 청탁을 받았을 때만 해도 이게 그토록 어려운 논제일지는 미처 생각지 못했었다. 하지만 글을 써보겠다고 책상 앞에 앉으니 이야기가 달라졌다. 나 자신 서평을 적지 않게 써봤다고 하지만, 막상 좋은 서평의 자격이 무엇인지 따지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서평만큼 그 유형이 천차만별인 장르도 달리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구도 그 중 어느 한 유형만 떼어서 이것이 서평의 본래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고 이야기하기 힘들다.
가령 어떤 서평은 책 소개에 중점을 둔다. 책의 주제를 밝히고 그 전체적인 구성을 일별하며 그것이 성취한 바는 무엇이고 부족한 구석은 무엇인지 따진다. 평자의 평가가 반영되더라도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서평 대상인 그 책이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서평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런 서평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서평은 곧장 논쟁으로 달려든다. 그리고 이것은 대개 저자와 평자 혹은 여기에 끼어든 제3자 사이의 긴 논쟁으로 이어지곤 한다. 이 경우에는 이미 책 소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책에서 어떤 부분을 인용하더라도 그것은 소개가 아니라 논박을 위한 것이다. 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원하는 독자들에게는 좀 난데없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런 유의 공방을 즐기는 독자들에게는 또 이것만큼 흥미로운 읽을거리도 달리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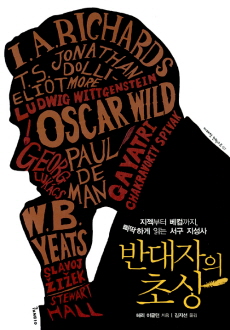
|
| ▲ <반대자의 초상>(테리 이글턴 지음, 김지선 옮김, 이매진 펴냄). ⓒ이매진 |
이러한 서평의 여러 유형들 중 어느 것을 '좋은' 서평이라고 해야 할까? 책에 대한 정보 제공에 충실한 쪽인가, 아니면 지적 논쟁을 자극하는 쪽이거나 서평 자체가 한 편의 읽을 만한 에세이의 품격을 갖춘 쪽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중 어느 한 유형만이 서평이라는 장르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다. 어느 쪽이든 제 나름의 방향에서 충실한 읽을거리를 제공한다면, 다 '좋은' 서평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내가 "좋은 서평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내린 답은 이렇게 맥없고 절충적인 것이다.
문화 전반의 파수꾼인 서평 문화
하지만 이게 꼭 내용 없는 결론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각기 제 나름의 방향에서 충실한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서평들은 "제 나름"의 다양성을 가지면서도 또한 "충실함"의 기준에서 뭔가 공통된 것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이 공통된 무엇을 얼마나 잘 구현했는지에 따라 서평의 좋고 나쁨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 공통된 무엇이란, 독서, 즉 책 읽기라는 사회적 과정에 대한 기여다.
그렇다. 문제는 하나의 사회적 '과정'이다. 서평이 다루는 서적들, 흔히 저자의 생산물로 환원되는 이 대상으로부터 일단 눈을 돌려 보자. 그러면 책의 출간으로 마감되지 않는 더 길고 역동적인 여러 주체들(물론 그 중 대다수는 독자 대중이다)의 지적 활동들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 읽고 해석하고 인용하고 논쟁하고 심지어는 베끼는 온갖 활동들이 있다. 책의 운명은 출간까지의 역사보다도 오히려 그 이후의 이러한 활동들 속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의 연쇄는 일종의 '보장 없는' 과정이다. 책의 값어치가 그 값어치 그대로 평가받고 그래서 인간들 사이의 대화에서 그에 합당한 만큼의 주목을 받는다는 보장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책들은 독창성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는데도 출간되자마자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는 과분한 축복을 받는다. 반면 어떤 책들은 10년 혹은 100년 후의 복권을 꿈꾸며 도서관 한 구석에서 긴 잠에 빠지기도 한다.
서평이란 이 보장 없는 사회적 과정 속의 한 실천적 계기다. 그것은 인류 문화라는 인간들 사이의 유구한 대화에 없어서는 안 될 끼어들기(개입)다. 그것은 제 값어치 이상의 환영을 받는 책들 혹은 마땅히 화제 거리가 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책들에게 새로운 운명을 열려는 시도다. 이 시도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시도들이 그나마 존재하기 때문에 책 읽기라는 사회적 과정은 지적 가치의 대공황이나 초인플레이션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다.
'좋은' 서평이란 곧 이러한 서평의 역할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글일 것이다. 그래서 어떤 서평은 책에 대한 친절한 설명으로 일관한다. 또 어떤 서평은 논쟁을 만들어내는 데 주력한다. 그리고 어떤 서평은 그 책이 진지한 사색의 실마리 역할을 함을 실증한다. 저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접근을 통해 책들이 그 값어치에 부합하는 운명을 누리게끔 애쓴다.
어쩌면 "좋은 서평이란 무엇인가"란 물음이 독서인들 사이의 한가한 잡담거리만일 수는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위의 논지를 따른다면 좋은 서평이란, 아니 그런 서평들이 활발히 생산되는 서평 '문화'란 결국 문화 전반의 질을 지탱하는 파수꾼과도 같다. 서평 문화가 제대로 발전해야만 책들이 담고 있는 지적 가치들이 그 가치 그대로 통용될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기 때문이다.
오늘날 서평 문화의 이러한 역할은 더욱더 중요하다. 우리 시대가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도리어 그 범람이 문제인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 정보들 속에서 참된 지식, 더 나아가 지혜를 길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지식의 민주화가 실현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가 사실은 인류 문화의 재난의 시대라는 반동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좋은' 서평이란 곧 이러한 반동에 대한 지속적인 투쟁이다. 지식의 민주주의가 천민주의로 귀결되는 것이 아님을 실증하려는 끊임없는 개입이다. 그리고 다름 아닌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서평을 쓰고 읽는 일은 책을 짓고 탐독하는 일에 못지않은 또 다른 중요한 정치적 실천인 것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