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틀러는 SF가 미래나 우주뿐 아니라 시간 그 자체에 대해, 공간에 대해, 역사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특히 그의 '도안가' 시리즈는 고대 이집트에서 먼 미래까지 이어지는, 특별한 사람들의 장구한 비밀 역사를 다룬 걸작이다. 독자의 심장을 쥐었다 놓았다 하는 섬세하고 고통스러운, 그러면서도 더없이 새롭고 아름다운 이 시리즈를 처음 접했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다.
너무나 압도적이라 두 번 읽을 엄두가 나지 않지만, 이미 한 번 읽은 순간 나의 세상이 변해버린 것만 같은 (그리고 결국은 또 다시 읽게 되는) 강렬한 감각이었다. 그런데 한국에서 마침내, 바로 이 '도안가' 시리즈 중 시간상 제일 첫 권인 <야생종>이 출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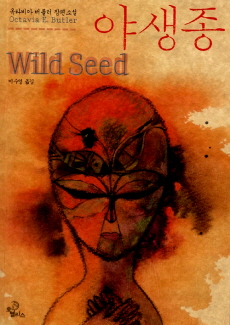
|
| ▲ <야생종>(옥타비아 버틀러 지음, 오멜라스 펴냄). ⓒ오멜라스 |
도로가 '씨앗'의 기운을 찾다가 만난 특별한 존재가 바로 안얀우이다. 안얀우는 도로만큼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수백 살은 족히 된 여자로, 남을 죽이고 그 몸을 취하는 도로와 달리 자신의 몸을 무엇으로도 바꿀 수 있고 어떤 상처도 치유할 수 있다.
도로는 수천 년을 살며 많은 자손을 만들었지만 그들 중 도로와 같이 완전한 불사인은 없었다. 그러던 중에 나타난 안얀우는 도로의 자손이 아닌 완전히 다른 존재, 즉 '야생종'이었다. <야생종>은 안얀우라는 귀한 씨앗을 지배하고자 하는 도로와, 자유롭게 떠나고 싶지만 자손을 치유하고 보호하려는 욕구에 묶여 도로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얀우의 수백 년에 걸친 대립을 따라가며 아프리카인들의 역사와 미국의 노예 제도, 우생학, 가족과 어머니됨의 의미, 목숨의 가치와 같은 굵직한 주제들을 실감나고 아름답게 짚어간다.
도로와 안얀우는 서로를 미워하지만, 서로를 죽이지도 버리지도 못한다. 도덕적인 증오와 육체적인 끌림과 모두가 결국은 죽어가는 현실 앞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불멸자라는 동지감이 이들 사이에서 요동친다. 버틀러는 <야생종>의 두 주인공이 "현실 세계에서 '선'과 '악'이라는 개념은 결코 완전하지 않고 언제나 단계적이며", "무언가를 얻을 때는 무언가를 잃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자신의 가치관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태양을 뜻하는 '안얀우'라는 이름과, 누비아 어로 '햇빛이 오는 방향'을 뜻하는 '도로'라는 이름은 실로 상징적이다.
옥타비아 버틀러의 죽음은 갑작스러웠다. 자신을 "염세주의자, 언제나 페미니스트, 흑인, 조용한 에고이스트"라고 소개하면서도 그는 마치 자신과 같은 아이들을 모아 가족을 이루어 모두의 어머니이자 치유사로 살아가는 안얀우처럼, 과학 소설계에 더 많은 다른 목소리를 불어넣기 위해 애썼다. <야생종>을 집필하면서도 수많은 아프리카 부족들의 역사와 언어를 조사하고 최대한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유색 인종 SF 작가 지망생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구상했고 새뮤얼 딜레이니와 함께 흑인 SF 작가들의 모임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활동이 막 현실화되기 시작했던 2006년 겨울, 버틀러는 집 앞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쳐 어이없이 세상을 떠났다. 사망 원인은 아직까지도 확실하지 않다. 세상에 할 말이 아직 많았던 작가는 우리에게 한 줌의 소설과 그의 이름이 붙은 유색 인종 SF 작가 지원 장학금만을 남기고 사라졌다.
작가는 글을 통해 영원히 산다는 말은 그가 다 쓰지 못한 이야기들을 생각하면 공허하다. 그러나 SF가 말하는 인식의 확장이 어느 방향으로든지 이루어질 수 있고, 어떤 이야기들은 '정말로' 새로울 수 있고, 누군가의 과거가 나의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보여주는 <야생종>을 읽으며, 어쩌면 버틀러가 이야기를 통해 불멸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것도, 도로가 아니라 아얀우와 같은 방식으로.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