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종의 책은 대부분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로 씌어져 있다. 옆에서 말하는 듯해 술술 읽혀 친근하다. 그렇다고, 그의 책이 쉽다는 것은 아니다. 만담하듯 의도적으로 쉽게 쓴 <헤이, 바보 예찬>(동아시아 펴냄) 같은 책도 있지만, 차분한 어조로 실크로드의 역사를 전복적으로 재구성한 <실크로드, 길 위의 역사와 사람들>(사계절 펴냄) 같은 책도 있다.
이야기는 문어투와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문어투의 글쓰기가 이성의 힘을 강조한다면, 이야기는 감성의 힘이 넘친다. 어떤 독자들은 김영종의 책에 '비호감'을 표명할 수 있다. 책이 엄격한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있고, 달변으로 장황한 느낌을 주며,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구술성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
김영종은 의도적으로 구어체로 이야기하듯 글을 쓴다. 그는 비서구적 방법론으로써 비위계적인 태도로 글을 쓰는 전략을 구사한다. 그는 분명한 어조로 서구의 이성 중심주의가 제국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공박한다. 그래서 자본주의적 세계관이 '인정의 욕구'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냈고, 인간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포박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 담화를 집요한 구술의 언어로 풀어낸 것이 <너희들의 유토피아>(사계절 펴냄)다. 그는 이 책에서 '노가리' '구라' '횡설수설' '야부리' '수다' '말놀이' '허풍' '황당무계' '잡담' '우스개'가 펼쳐 보이는 아수라장을 옹호한다. <너희들의 유토피아>에 수록된 글들도 '잡설'이라는 이름으로 연재된 것들이다. 이는 김영종이 글과 세계관을 연결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원시성에서 생명성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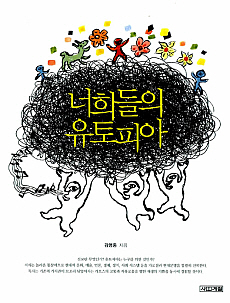
|
| ▲ <너희드의 유토피아>(김영종 지음, 김용철 그림, 사계절 펴냄). ⓒ사계절 |
1부에서 김영종은 자신의 애니미즘 미학관에 비추어 '근대의 예술, 한국의 소비 미학'을 뒤흔든다. 그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두 축제를 비교하며, 근대의 제도적 평가가 신성을 어떻게 훼손하는가에 대해 논평한다. 이러한 견해는 한국의 예술 제도, 자기도취적 예술, 예술의 상품화와 같은 구체적 현실 비판으로 나아간다. 그는 애니미즘 미학이 갖고 있는 원시성을 옹호하며, 근대 제도 예술에 대한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힌다. 예술은 자아 바깥의 타자와 만났을 때라야, 속물주의(snobbism)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가 강조하는 것도 '원시 미술처럼 생명감'이 넘치는 활력 같은 것이다.
2부는 동시대의 사건들을 논평하면서, 자본주의 바깥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탐색하는 사회 비평으로 채워져 있다. 그는 용산 참사와 근대적 합리성의 공모 관계를 밝히고, 진보가 근대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자본주의 체제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래서 그는 유토피아의 환상에 대해 공격적으로 분석하고, 무엇보다 한국의 진보를 자처하는 운동권 엘리트들에게 분명한 불신 의사를 전달한다.
파우스트 만행의 심오성
'용산 참극과 파우스트'는 이 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글이다. 그는 이 글에서 '용산 참사'와 '나봇의 포도원', 그리고 <파우스트>를 병치한다. 이는 '뉴타운'의 이면에 존재하는 합리적 거래가 실제로는 영혼의 매매 행위와 같은 것임을 신랄한 어조로 비판하기 위해 포석이다.
양심적인 시민이라면, 용산 참사에 모두 분노했을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도시민들이 도심 재개발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김영종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현대 자본주의의 일상성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순간 '합리적 정당성'이라는 테제에 갇히고 만다.
그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고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동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상황에서는 '용산 참사'에 대한 책임을 현 정권에게 물을 수 없다. 정치권력도 결코 용산 참사의 희생자들이기도 한 철거민들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모두 파우스트 편에 서 있다"는 것이 김영종의 주장이다.
이 책의 가치는 이러한 '근본주의적 태도'로 '바깥에서 객관화한 자본주의 세계'를 바라보게 한다는 데서 빛을 발한다. 김영종의 비판은 신랄하기에 통쾌하다. 그는 자신이 이렇듯 당당한 어조로 '합리주의적 세계관'과 '한국의 진보'를 비판할 수 있는 이유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바깥"에서 아웃사이더로서 세상을 대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다. 이러한 그의 위치 때문에 진보가 근대의 합리성이라는 틀 속에 갇혀 있다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김영종이 이 책에서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에게 '진보는 퇴보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인간의 감성이 갖고 있는 긍정적 힘을 거부하고, 오로지 이성에 의지한 채 이뤄지는 진보의 대안의 '생명성이 거세'된 것이다. 김영종은 감성의 영역의 해방시킬 수 있는 힘, 그것을 바로 격정적 파토스인 애니미즘 미학에서 찾고 있다. 그렇다면, 애니미즘 예술은 무엇일까? 그것은 근대의 제도적 틀에 갇혀 있는 '인식의 예술'에 대비되는 것이다. 근원적 예술 체험과 연결되어 있는 원시 예술은 신과 교감하며, 생명성을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는 원시 예술을 "사회 예술이자 순수 예술이자 초월 예술"이라고 규정한다.
<너희들의 유토피아>는 당당한 어조로 '원시 예술'의 힘을 이야기하고, '합리성의 메커니즘'을 비판하며,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함정을 묘파한다. 길 바깥에서 길을 바라보는 자의 새로운 감각을 이 책을 통해 살필 수 있다. 그것은 아웃사이더의 감각이고, 애니미즘 미학의 힘이며, 다른 세계에 대한 상상이다.
발화와 대화 사이
김영종의 <너희들의 유토피아>가 오직 통쾌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김영종의 이야기가 귀에 속속 감겨 온다 하더라도, 그의 이야기는 대화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 부분은 꼭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그의 위치는 체제의 바깥인데, 그 체제의 바깥에 누구와 더불어 함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좀처럼 찾을 수 없다. 바깥에 있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결단하고, 감성에 자신을 내맡기며, 체제 바깥으로 뛰쳐나오는 것이면 되는가? 체제를 뒤흔들기 위해 바깥에서 저격수처럼 '잡설(독설)'을 쏟아내면 되는 것일까?
비판의 곤혹스러움은 반향(反響)만을 생각할 뿐, 더불어 '연대'할 수 있는 여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그는 애니미즘 미학의 근대 합리성의 메커니즘에 대항할 수 있는 도구로 제기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어떻게 감정적 교감을 이뤄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빠지면 '애니미즘 미학은 예술가 개인의 해방'만을 가능하게 하는 알리바이일 뿐이다.
<너희들의 유토피아>는 저격수가 자본주의 체제에 가하는 심각한 충격이기는 하지만, 테러리스트처럼 파괴적 효과만을 불러일으키는데 그치고 있다. <너희들의 유토피아>를 읽다보면, '화'가 난 자의 목소리를 듣는 듯한 부분도 많다. 차분한 어조로 이야기의 힘이 살아 있던 <실크로드, 길 위의 역사와 사람들>에 비해 자기 세계에 닫혀 있는 듯한 양상이어서 아쉽다.
그런 의미에서 마쓰모토 하지메의 <가난뱅이의 역습>(꾸리에 펴냄)은 이 책과 대비되는 부분이 많은 듯하다. 마쓰모토 하지메는 보다 적극적으로 체제 바깥에서 사는 법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는 '미학적 차원'과 '담론의 측면'에서는 김영종의 견고함에 못 미칠지 모르지만, 자본주의 바깥의 다른 삶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에 있어서는 훨씬 구체적이다. 그 구체성은 자신의 위치를 비판적 지식인이 아닌, 민중과 더불어 호흡하는 생활인으로서 구체화했을 때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