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와 분쟁을 겪은 한남동 '테이크아웃드로잉'. 지난한 과정 끝에 싸이의 사과를 받았다, 그리고 자발적인 회복 기간을 가지는 것에 합의했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한 합의를 하기까지 1년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 시간 동안 여러 차례 강제집행이 있었다.
지난 8월 31일자로 드로잉은 싸이 건물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이들은 지난 1년여 동안 자신들이 겪은 일을 '재난'으로 칭했다. 말 그대로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한 변고였다. 문제는 이러한 재난이 자신들에게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점을 지난 1년여 동안 체화했다는 점이다. 서울 곳곳에서 '건물주-세입자' 간 분쟁이 일어난다. 그들의 언어를 빌리면 곳곳이 재난현장이다.
<프레시안>에서는 테이크아웃드로잉에서 준비한 기획기고를 게재할 예정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겪은 재난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재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한 일종의 '재난유산'을 글의 형식을 빌려 정리했다. 여기에는 재난을 직접 겪은 이들부터 재난을 목격한 사람들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예정이다. 인터뷰는 최소연 디렉터가 진행했다.

최소연 : '재난유산'은 우리가 재난이라고 부르는 현장에서 목격한 마음을 발굴하는 작업장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재난현장에서 만난 초심입니다. 그 마음의 이름을 돌멩이 위에 적어주시고, 어떤 모습의 마음인지 설명해 주세요.
신제현 : 지난해 강제집행 때부터 지금까지 테이크아웃드로잉에서 레지던시(Residency, 예술가의 창작 및 거주를 지원하는 것)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인사동이랑 서교동 쪽에서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된 작업을 계속해왔어요. 동네 주민들에게 인터뷰도 하고, 서교동과 문래동으로 넘어가면서는 사운드를 채집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때는 거리를 많이 두면서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노력했어요. 철저하게 예술 작업을 위한 활동이어서 오히려 침착하고 냉철한 마음으로 접하고 있었죠. 연대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테이크아웃드로잉 와서도 사실 저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소송이 들어와서 연대를 시작했죠. 우리는 모두 소송으로 묶인 사이예요. 강제적으로 강한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초심은 답답함이에요.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가 있었어요. 두려움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따뜻함도 있었죠. 사실상 테이크아웃드로잉 사건은 끝나지 않았어요. 어두운 서막의 시작인 셈이에요. 한 단락 마무리는 됐지만, 세간에 알려진 것에 비해서는 답답한 상황이죠.
드로잉을 처음 만난 시기는 2014년 11월이고, 크기는 140센티미터(cm), 제 심장의 높이거든요. 작업을 디스플레이할 때 140cm를 기준으로 했을 때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의 모든 마음의 높이죠. 색은 파랑이에요. 테이크아웃드로잉에 있으면서 유독 파랑색을 많이 봤어요. 처음 미팅도 낮이었는데, 그날 구름 하나 없는 파란 하늘이었거든요. 하늘이 너무 파래서 밖에서 하늘을 한참 보다가 미팅을 들어갔죠. 그 이후로는 테이크아웃드로잉이라는 단어 안에는 소리든 냄새든 촉각이든 저에게는 파랑색이 강하고요. 처음 집행도 낮이었는데 그날도 하늘이 파란색이었어요. 막연한 두려움이 시간이 지나면서 답답함이 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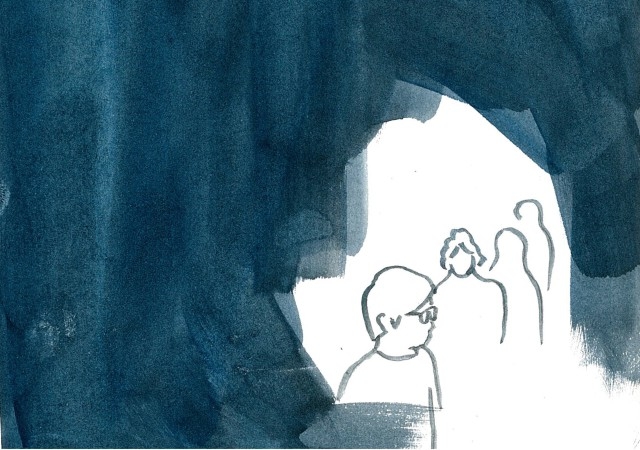
최소연 :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재난의 장소에서 만난 괴물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목격한 괴물의 '마음'을 돌멩이에 적어주세요. 괴물을 가시화하기 위해 괴물의 색깔과 크기, 환경과 역사를 상상해 봅니다. 괴물이 먹어치운 우리의 권리도 함께 적어주세요.
신제현 : 괴물의 이름은 '나'예요. 예전부터 제가 점보는 것과 '사주팔자'를 좋아했는데, 저에게 50세가 넘으면 엄청난 건물주가 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건물을 한두 개가 갖는 정도가 아니라, 구 단위 건물주가 될 거라고…. 반은 농담이고요.
학교 다닐 때부터 액티비즘(activism)이라고는 하기엔 뭐한데, 삐딱한 작업을 했어요. 보통 액티비스트(activist)는 시스템이나 국가·사회·기업을 적으로 상정하고 괴물을 향해 돌을 던지는 형태를 많이 취하는데, 저는 공범자가 되는 역할을 자청했거든요. 시스템 안에서 공범자가 되면서 오히려 욕을 먹으면서 아이러니함에 의문을 던지는 거죠. '내가 싸이라면 어떨까?', '리쌍이라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항상 건물주의 입장에서 작업을 했어요.
심지어 제 작업은 용역을 환대하는 이들이나 용역을 관객으로 삼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처럼 실험음악을 하는 사람은 관객이 적어요. 하루에 30~40명 정도 오면 성공한 날인데, 싸이가 용역을 200명 데려온다니까 '그러면 관객이 200명이네', 이런 마음이었죠. 크기는 140cm, 환경은 조금 편해지려는 욕망, '나'라는 괴물은 어마어마한 대가보다는 약간 편해지려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싸이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싸이도 조금 더 편해지려고 변호사를 쓰고 용역을 썼을 거예요. 막상 싸이가 여기 왔을 때 별거 아니었잖아요. 싸이가 사과하고 한 시간 동안 대화했는데, 그 자리가 예상보다 일반적인 자리였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는 불편했을지도 모르죠. 괴물은 조금 더 편해지려는 욕망에서 탄생하고, 먹이는 타인의 시선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여러 사람에게 해당될 텐데, 싸이도 타인의 시선을 무마시키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연대하는 사람도 타인의 시선에 따라서 시선이 달라졌을 수도 있죠.
이건 다양한 예를 드는 거예요. 색은 역시 '파랑'이에요. 괴물들을 마주하는 순간에는 항상 파랑색이 많았어요. 세 번 집행이 모두 하늘 파란 날이었어요. 누구나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점점 결과에 대한 기대보다는 힘든 과정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꼼수를 부려 더 편해지려 하죠. 거기서 생기는 꼼수들이 괴물이 되어가고, 갈수록 내가 받아야 할 보상 이상의 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괴물이 완성된다고 생각해요.


최소연 : 괴물을 처리할 방법은? 해결 가능성을 간략히 구상합니다. 나머지는 재난유산 상속자들의 몫으로 남겨둡니다.
신제현 : 괴물은 법이 아니고서는 응징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연 :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재난 현장에서 괴물을 향해 던질 수 있는 유일한 물건으로, 모퉁이 돌이 있습니다. 그 초월적인 정령의 마음을 돌멩이에 적어주세요.
신제현 : 제가 만난 정령의 이름은 '연대'입니다. 고통과 불합리함이 공유되는 순간에서 만났어요. 용역을 대하는 건 처음이라 주위에서 용역이 사람을 때려 팬다고 하고, 외진 곳에 있으면 여럿한테 맞으니까 시선이 많은 곳에 있어야 한다는 무서운 얘기를 들었어요. 당장 내일 용역들이 온다고 했을 때 우리 사이에 두려움이 공유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대화를 하다 보면 두려움의 싱크(sink)가 맞는 순간이 와요. 내가 가진 마음을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이죠. 그래서 정령이 출몰하는 환경을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으로 봤어요. 제가 혼자여서 두려운 거잖아요.
어제는 '우장창창'에 용역들이 올 확률이 없었어요. 그런데 서윤수 사장님이 제 손을 잡고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가는 내내 "같이 있어주실 거죠?"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혼자 가게를 지키려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용역깡패가 들이닥칠 때 맞설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 또 외로운 거죠. 나는 혼자인데 저쪽은 다수가 올 거라는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령의 역사는 심연의 구멍이 열릴 때예요. 내가 심연을 볼 때 심연이 나를 보니까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죠. 정령의 색상은 마찬가지로 파랑이에요. 왜냐하면 서윤수 사장님 가게에 보낸 평상도 파랑색이었어요. 제가 싸이에게 소송을 당했을 때 입고 있던 점퍼도 파랑색이었고요. 소장에 뭘 쓸 때마다 파랑색 점퍼를 입은 고용된 '자칭 예술가'가 사진을 찍어서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모함했어요.
재난이 닥치면 두려움이라는 괴물이 탄생해요. 동시에 괴물을 마주한 동료를 보게 되죠. 다시 동료와 내가 '재난을 넘어보자, 이겨보자', 그 마음이 공유되는 순간이 왔을 때 '연대'라는 정령이 와서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식사를 거르지 마세요.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