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서가에 놓인 두 권의 신간 도서들이 어쩐지 낯설지 않다. 첫 번째 책, <상품의 시대>(권창규 지음, 민음사 펴냄)는 구한말부터 중일전쟁 시기까지 조선의 유력 신문과 잡지들에 게재되었던 지면 광고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현대 한국 광고의 근간을 이룬 식민지 조선의 광고 문안과 도상을 통하여 조선에 자리 잡은 근대 소비 자본주의의 양상을 살펴보는 책이다.
두 번째 책 <경성 모던타임스>(박윤석 지음, 문학동네 펴냄)는 일종의 '구보 씨' 역할을 담당한 가상의 인물 '한림'의 시선을 통해 1920년대 경성의 생활사 전반을 조망한다. 논픽션과 소설의 경계에 있는 <경성 모던타임스>는 경성을 산책하는 관찰자이자 주인공인 한림의 시선이 당대의 풍경에 단단히 매료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품의 시대>보다 더욱 낯익은 책이다.

<상품의 시대>는 일제 강점기 조선에 유입된 근대적 개념으로 '출세', '교양', '건강' ,'섹스', '애국'의 다섯 가지 주제를 제시한다. 건강을 위한 자양강장제 광고부터 입신양명을 위한 고시 수험서 광고까지 아우르는 다채로운 광고와 당대 문장가들의 세태 비평을 성실하게 분석하는 가운데 저자는 일제의 식민지 경영 방식과 나아가 소비 개념 자체를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상품의 시대>에 따르면 근대인은 상품을 통해 소비 인간(homo consumus)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했다. 소비하지 않는 자는 구시대의 유물이자 소비 위계의 하위 계급으로 전락하는 반면 소비하는 자는 새로운 시대의 상위 계급을 점유한다. 봉건 신분제가 소비 위계로 재편성되는 한편 제국주의가 광고와 캠페인을 통해 내재화되었다. 일제 강점기의 광고 문안에서 '국산'은 일본제 상품으로, '국민'은 일본 국민으로 통용되는 단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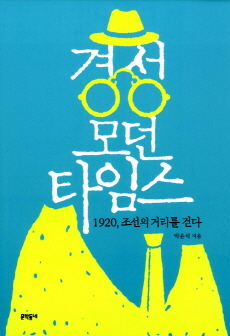
<상품의 시대>는 위에 언급한 대로 상품, 소비문화와 거리두기를 하는 책이지만 일개 독자 입장에서는 생생하게 소개된 당대 상품들에게 거리를 두기 어렵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상품의 시대>의 집필 계기로 1930년대 잡지 <조광>을 읽다가 지면 광고들이 현재의 광고만큼 다양하고 방대했다는 점에 경도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소비 인간'의 범주에는 21세기를 사는 현대인인 저자도 포함될 터이다.
일제 강점기라는 특정 시대는 근대성을 떼어놓고 논할 수 없다. 근대성을 대상화하는 행위는 고유명사 나열의 백화점적 쾌감을 제공한다. 아사히 맥주와 빅터 레코드의 광고판이 빛나는 대도시 경성의 일등 번화가 황금정(黃金町;현 을지로)과 본정(本町;현 충무로) 대로변을 활보하는 모던보이의 시대. 그러한 시대를 다룬 저작물에서 일본어와 영어로 쓰인 낯설고 매혹적인 고유명사들-근대를 구성하는 상품의 이름들을 빼 놓으면 무슨 즐거움이 남으며, 그 고유명사들을 백년이 지난 현재에 소환해 내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현대 국가의 국민(國民)으로서의 정체성을 탐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그러나 공화국 개국을 선포한지 겨우 60여 년 만에 대한민국은 저성장 시대라는 근대화의 과포화 상태에 안착하고 말았다. 배에 실려 온 물건이라 하여 박래품(舶來品)으로 불리던 최신 사치품으로 새로운 신분의 위계를 만들었던 소비의 위력은 빠른 속도로 쇠락하고 있다. 서울의 사무실 책상에 앉아 배송대행 사이트에서 마우스 클릭 몇 번을 하는 것으로 미국 니만 마커스(Neiman Marcus)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명품 백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외제품을 손에 넣기까지의 과정이 극단적으로 축약되었다는 뜻이다. '보따리 장사'로 불리던 밀수꾼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첨단의 유행을 읽는 감식안이 없어도 SPA 브랜드의 최신 명품 디자인 카피 원피스를 퇴근길에 살 수 있다. 세계 유명 맥주들을 대형마트에서 값싸게 살 수 있다. 이제는 현금조차 필요 없이 각종 포인트와 사이버머니로 물건을 살 수 있다. 그만큼 소비의 위계질서는 유명무실해지는 중이다. 소비의 위력이 쇠락함과 더불어 소비의 욕망도 사그라들고 있다. 비단 대한민국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