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버 색스의 글을 읽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바는, 이 의사가 환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것을 자신의 글로 서술하는 것에서 진정으로 무한한 기쁨을 찾고 있다는 점이다. 그가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나는 이것이야말로 훌륭한 의사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수가와 보험 제도에 발 묶여 있는 현재의 의료 체계에서 의사들에게 무조건 '환자야말로 너의 진정한 스승이다'라는 지당한 경구를 실천할 수 없도록 하는 상황은 무척 안타까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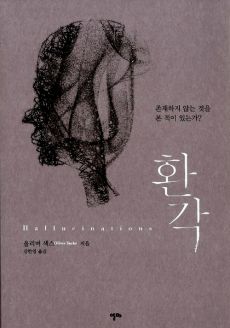
|
| ▲ <환각>(올리버 색스 지음, 김한영 옮김, 알마 펴냄). ⓒ알마 |
먼저 <환각>에 대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지적하고 싶다. 저자는 환각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신경학적인 증상과 상황들을 포괄적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경우의 케이스들을 예의 신중하고도 견고한 자세로 기술하고 있으면서도, 환각의 증상이 가장 자주 발생하고 동반되는 정신과적 질환들 – 정신분열증(대한 신경정신과 학회에서는 최근에 이 명칭을 조현병으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명칭이고, 일반 대중에게도 여전히 정신 분열증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듯 해서 사용하지 않았다.-글쓴이 주), 주요 우울증, 조울증 – 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신경과 의사로서 정신과적 증상과 질환들에 대해서 그다지 관찰과 진료의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일견 이해할 만하기도 하고, 어쩌면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신중하다고 칭찬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가 그 동안 주로 다루어왔던 신경과적 질환과 증상들이 주로 신경계에서도 최상위층, 그러니까 대뇌 피질과 관련된 경우들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정신과 의사로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 책의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색스의 다른 책들과 비교해서 자기 환자들과의 인간적인 관계나 개인적 체험에 대한 서술이 거의 들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의 다른 증례 보고들에서는 환자들과 직접 나눈 이야기들이나, 심지어 환자를 직접 찾아가기까지의 여정 같은 것들이 담담하면서도 진솔한 어조로 서술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가령 아스퍼거 장애 환자이자 저명한 동물학자 템플 그랜딘을 다룬 <화성의 인류학자>), 이 책에서는 자신의 환자들이 보고한 증상을 서술하는 부분들에서도 비교적 객관적이고 거리를 두는 듯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기에는, 환각이라는 증상 자체가 극히 주관적인 체험이고 따라서 그 체험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심적 부담이 가는 작업이라는 점이 이러한 책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다.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무시무시한 체험은 자기 자신 – 도플갱어 – 을 보는 경험이 아닐까 생각한다. 325쪽에 소개된 케이스는 웬만한 공포 영화는 비교도 되지 않는 섬뜩한 경험이었으리라.
그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현기증을 느꼈다. 뒤를 돌아보면 자신이 아직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이 보였고, "이 녀석은 나 자신인데 아직 침대에서 꾸물거리고 있다니, 아차 하면 직장에 늦을 텐데 싶어서" 화가 났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있는 몸을 깨워보려고 처음에는 소리를 질렀고, 그런 뒤 몸을 흔들었으며, 다음에는 분신에게 달려들었다. 누워 있는 몸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 침대에 누워 있을 때에는, 정신은 깨어 있지만 몸은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고 위에서 자신을 때리고 있는 자신의 형상이 무서웠다. 그 순간 그의 유일한 목적은 다시 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창밖을 내다보다가, 갑자기 "둘로 나뉘어 있다는 참을 수 없는 느낌을 끝내기 위해" 뛰어내리기로 결심했다. (…) 기억이 돌아왔을 때, 그는 통증과 함께 병원에 누워 있었다.
.JPG)
|
| ▲ <화성의 인류학자>(올리버 색스 지음, 이은선 옮김, 바다출판사 펴냄). ⓒ바다출판사 |
정신과 의사로서 항상 흥미롭게 생각했던 것은, 환자들이 환각을 인정하거나 이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거부감이나 심지어 공포심의 강도가 대단하다는 점이었다. 물론 정신과 환자로서의 사회에서 받는 차별과 낙인은 상당한 것이지만, 정신과 증상 중에서도 우울한 기분이나 불안 등과는 달리, 환청이나 환시와 같은 환각의 경험에 대해서는 소통하기를 거부하거나 감추려는 환자들이 경우가 월등히 많았던 것이 사실인 것이다.(이 때문에 환자의 행동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증상의 경중을 추측하는 것은 특히 입원 병동 치료진들의 주요 대화 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아마도 여기에는 문화적 요인도 작용할 것이다. 미국에서 진료한 환자들의 경우, 이러한 환각의 경험을 소통하는 어려움이 한국 환자들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었다. 환각의 증상을 경험하는 정신과 환자들의 증례들에 좀 더 지면을 할애했더라면, 이러한 주관적이고도 문화적인 이 증상에 대한 태도와 이해는 이 책의 상당히 중요하고도 비중 있는 주제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역시 좀 아쉬웠다.
환각의 경험은 일종의 존재론적 질문을 제시하기도 한다. 야스퍼스 같은 철학자가 동시에 정신 병리 현상학의 대가였던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내가 경험하는 것이 실재하는 것이 아니고 뇌의 신경학적 이상의 창조물이라면, 과연 '실재'의 경계는 어디서 시작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칸트와 쇼펜하우어도 이 문제에 천착하였지만, 아마도 최근의 신경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이러한 의문에 대한 '과학적 대답'에는 우리 세대가 가장 근접해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JPG)
|
| ▲ <깨어남>(올리버 색스 지음, 이민아 옮김, 알마 펴냄). ⓒ알마 |
그러나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아마도 흔히들 이야기하면서도 낯선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환각이라는 증상에 대해서 이만한 입문서를 발견하기도 쉽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환각>에 소개된 여러 가지 참고 문헌들로 독서의 범위를 넓혀 보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올리버 색스의 다른 여러 책들과 마찬가지로 이 책을 읽고 나서 의사로서 새삼 느끼게 되는 것은 환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 일반에 대한 경외심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양하고 복잡하면서 고통스러운 증상을 가지고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자신의 주어진 잠재력과 기회를 충분히 실현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저자 자신의 따뜻한 시선이야말로 이 사람의 책을 읽는 가장 큰 즐거움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