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슈비츠 이후에 서정시를 쓰는 것은 야만이다."
아우슈비츠! 1940년 폴란드 남부에 나치가 설치한 대략 10만 명가량을 감금할 수 있었던 강제 수용소였다. 이곳에서 1942년부터 1945년까지 대략 400만 명의 인간들이 무참하게 학살된다. 그렇다. 인간은 이토록 잔인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보다 역겨운 허영이 또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인간의 잔혹성 앞에서 우리는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러니 시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름다운 찬가라기보다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유럽 대륙의 반대편 한반도에서도 동일한 비극이 발생한다. 400만 명의 이상의 애꿎은 생명을 앗아간 한국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 대전 때 사용되었던 동일한 양의 폭탄들이 이 작은 반도에 모두 쏟아 부어졌으니 그 피해는 미루어 짐작이 가는 일이다.
잊지 말자. 아우슈비츠로 상징되는 제2차 세계 대전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한반도의 전쟁은 아직도 계속 중이다. 단지 휴전일 뿐, 냉전은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일까. 남북 양측 모두 정권에 대한 비판은 이적 행위로 간주되어 엄청난 탄압을 감내해야만 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냉전 중에 또 희생되었는가. 그렇다. 나는 말하고 싶다.
"6·25 이후에 서정시를 쓰는 것은 야만이다."
슬프게도 우리는 너무나도 남루하다. 아니 비루하기까지 하다. 한국 전쟁 이후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서정시가 쓰였기 때문이다. 마치 전쟁이 없었다는 듯이, 그리고 냉전도 없었다는 듯이, 정치는 나와는 무관하다는 듯이, 서정시는 오늘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1966년 시인 김수영이 우리 시단을 비판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고통이 모자란다고! '언어'에 대한 고통이 아닌 그 이전의 고통이 모자란다"고 말이다.
분단과 독재 그리고 이어지는 삶의 피폐함을 응시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어찌 하겠는가. 직면하고 부딪힐 수밖에. 그래서 온 몸으로 고통을 겪고 그것을 노래할 수밖에. 그럴 때에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흉내 내지 않은 글, 즉 진정한 시가 탄생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6·25 이후에 서정시를 쓰는 것은 야만이다." 김수영의 입장에 나는 동감한다. 하지만 어느 시인으로부터 배운 가르침이 내 뇌리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수영을 언급하며 시단을 비판했던 적이 있다. 그때 동석했던 시인 한 분이 웃으며 내게 말했다. "하지만 강 선생님. 그게 무슨 시였든 간에 시를 쓰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을 해치지 않습니다."
옳은 말이다. 시는 자신이니까 쓸 수 있는 글이다. 당연히 시를 읽는다는 것은 나와는 다른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타인의 속내와 그 삶을 읽는다는 것이다. 타인의 내면을 읽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해칠 수 있다는 말인가. 누군가의 목을 조르려면 우리는 그의 고통을 느껴서는 안 되는 법이니까.
그렇다. 이제 아도르노의 명제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 "아우슈비츠 이후에 서정시를 쓰는 것은 야만이다. 그렇지만 시를 읽지 않는 것도 야만이다"라고. 전쟁과 갈등 그리고 경쟁은 우리에게 사랑과 신뢰의 힘을 앗아간다. 제2의 아우슈비츠 그리고 제2의 6·25를 막고 싶은가?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힘을 되찾아야만 한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시를 읽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시를 읽는 것은 소설이나 산문을 읽는 것보다도 힘든 일이다. 한 사람의 속내를 완전히 안다는 것이 어떻게 쉬울 수 있다는 말인가.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혹은 신뢰한다는 것은 그를 알려는 의지에 다름 아니다. 사랑과 신뢰는 원하는 것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것을 꺼리는 감정이니까 말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사랑한다고 자임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지만 아무래도 시는 어려운 법이다. 너무나 추상적이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구체적인 것이 시이기 때문이다. 지금 눈앞에 서 있는 바로 저 사람은 다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이다. 1000년 전에도 없었고, 1000년 뒤에도 없을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이 자기니까 쓸 수 있는 글, 즉 시를 쓸 때, 그는 시인이 된다. 그러니 시는 소설이나 산문보다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지금 우리를 시의 세계로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는 좋은 가이드가 있으니까. 전작 <철학 카페에서 문학 읽기>(웅진지식하우스 펴냄)에서 철학자 김용규는 문학에 대한 섬세한 감성과 냉철한 이성을 동시에 보여준 적이 있다. 애독자 중의 한 사람으로 나는 그가 언젠가 시에 대한 글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마침내 내 손에 그토록 바라던 책이 한 권 들려 있다. <철학 카페에서 시 읽기>(웅진지식하우스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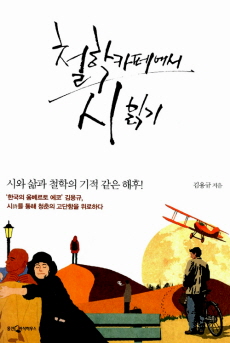
|
| ▲ <철학 카페에서 시 읽기>(김용규 지음,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웅진지식하우스 |
책장을 넘기면서 나는 다시 한 번 탄복했다. 우리 시대에 저자만큼 인문학적으로 박식하고 성숙한 사람이 또 있을까. '한국의 움베르토 에코'라는 출판사의 약간의 낯 뜨거운 홍보도 결코 허언은 아닌 셈이다. 덤으로 확인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다. 김용규는 나만큼이나 김수영을 좋아하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저자와 그의 글이 어찌 사랑스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지막 쪽을 넘길 때쯤 내게는 약간 아쉬운 마음이 남았다. 무슨 이유에서일까. 김수영의 표현을 빌리자면 "고통이 부족하다"는 인상이 들었던 탓이리라. 우리가 겪는 고통은 자신의 삶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 사이의 잘못된 만남으로부터 발생하는 법이다. 그래서 고통을 없애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다. 환경을 바꾸거나 아니면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전자는 힘들고 후자는 쉽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꾸면서 고통을 우회하려고 드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인지도 모른다. "나만 바뀌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물론 김용규는 7장과 8장에서 환경이 주는 고통, 즉 소비 사회와 위험 사회를 응시하려고 노력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조금은 절정에서 비껴나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숨길 수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용규의 책이 시의 세계로 우리를 제대로 안내해줄 수 있는 최상의 책이라는 사실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