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금슬금 어른용 책꽂이에 접근했고 검은색 표지의 세로 쓰기 세계 명작 선집을 하나씩 꺼내보기 시작했다. 모파상의 <비계덩어리>, 체호프의 <귀여운 여인>, 캐서린 맨스필드의 <가든 파티> 등을 대충 훑어보았지만 열두 살짜리가 그 행간의 의미를 이해하기엔 어림도 없었다. 그러다가 발견한 단편이 허버트 조지 웰스의 <녹색의 문>이었다.
아주 쉽고 간결하게 쓰인 이 소설은 열두 살짜리에게도 경이롭고 신비로운 동경의 감정을 처음 심어주었다. 이 세계 이면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감춰져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다가 집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옛날 책들은 죄다 쓰레기통으로 향했고, 그때까지 무언가를 보존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던 나는 <녹색의 문>을 그렇게 어이없이 잃어버렸다. 20대 초반에 이르러 다시 한 번 그 책을 찾아보려 했지만 국내에 번역된 웰스의 책들에는 그 단편이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주인공 라이어넬처럼 '녹색의 문'을 그리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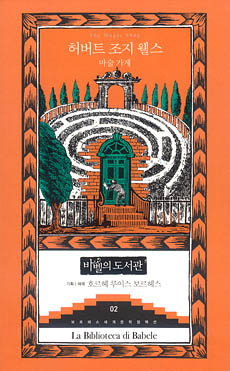
|
| ▲ <마술 가게>(허버트 조지 웰스 지음, 하창수 옮김, 바다출판사 펴냄). ⓒ바다출판사 |
'벽 속의 문'은 유명한 정치인 라이어넬 월리스의 고백담이다. 라이어넬은 5살 무렵, 가을날 런던 웨스트 켄징턴의 어느 거리에서 하얀색 벽에 도드라지게 보이는 초록색 문을 발견했다. 그는 그 문을 보자마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혔지만 동시에 이유를 알 순 없지만 "만약 문을 열고 들어간다면 아버지가 무척 화를 내시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한참을 망설이다 그는 녹색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고, "그 후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사로잡히게 되는 그 미지의 정원"을 보게 된다. "마음을 달뜨게 하는 어떤 기운, 막연히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느낌, 혹은 행복감 같은 것"으로 충만한 그 아름다운 정원에서, 라이어넬은 보드랍고 사랑스러운 흑표범과 놀았고 자신에게 따뜻하게 웃어 보이는 낯선 이들과 마음을 나누었다.
"난 마로니에 잎들이 떨어져있던 거리를, 마차와 장사꾼들의 수레가 지나가던 그 거리를 까맣게 잊어버렸다네. 그때 난, 머지않아 다시 규율과 복종 속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지. 나는 모든 머뭇거림과 두려움을 잊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도 잊고, 어쨌든 삶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까지 완전히 잊어버렸지."
그러나 원치 않게 그 정원에서 내쳐진 그는 이후 현실 세계의 법칙에 복종하는 어른으로 성장하며, 아주 가끔씩 그 문과 마주친다. 그때마다 그는 현실 세계에서의 다급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던 길이었고, 그 일을 해결하고 다시금 헐레벌떡 거리로 돌아오면 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이제 나이 들어 저명한 정치가가 된 라이어넬은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그토록 맹렬하게 추구했던 성공이 "너절하고 갑갑한 세상, 메마른 공허의 빛, 지독한 무의미"에 불과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소설의 마지막 순간, 독자를 무시무시한 의혹 안에 덩그러니 던져버리는 뜻밖의 결말 앞에서 독자 역시 라이어넬처럼 울음을 터뜨리지 않을 도리가 없다.
'하얀 벽 속의 초록색 문'이라는 단순한 알레고리만으로 인생의 쓰라린 비의를 단숨에 압축해버리는 웰스의 솜씨를 맛볼 수 있는 걸작인 건 분명하다. 하지만 역시 돌이켜보면 '벽 속의 문'은 아이가 읽을 만한 작품은 아니었던 것 같다. 어릴 때 이 작품을 처음 접하고는 "인생의 결론이 이토록 무상할 수밖에 없나" 하는 질문을 떠올리고는 두려워하며 바로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던 그 심정이, 성인이 되어 재독할 때에도 역시나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인생의 첫 걸음을 떼면서, 앞으로 온전히 충만한 행복과 조화를 이루겠다는 꿈을 꾸지 않았던 이는 없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러 우리 모두는, 아주 사소한 선택의 갈림길이라고 여겼던 과거의 모든 사건들이 지금의 불행한 나를 형성한 운명적인 한 걸음이었음을 깨닫고는 '가지 않은 길'을 내내 그리워하며 견딜 수밖에 없다.
'벽 속의 문'과 궤를 함께 하는 작품으로는 '마술 가게'와 '수정 계란'을 꼽을 수 있다. '마술 가게'는 원한다고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며, 들어온다 하더라도 마법의 세계를 순수한 환희로 즐길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을 명시한다. '수정 계란'에선 불행한 현실로부터 도피하여 수정 계란 속에 비치는 놀라운 형상에 마음을 빼앗긴 노인이 수정 계란의 진실을 깨닫는 순간 의문의 죽음을 맞는다.
나머지 단편 '플래트너 이야기'와 '고 엘비스햄 씨 이야기'는 훨씬 더 비극적인 결론으로 치닫는다. 플래트너 씨는 원치 않게 투명인간이 되어 다른 차원에 속하며 이웃의 탐욕을 생생히 지켜보는 운명에 처하고, 악마와의 거래를 수락한 청년은 '타인의 삶'이 지금-여기의 '나의 삶'과 진배없는 지옥임을 깨닫는다.
<타임 머신>, <우주전쟁>, <모로 박사의 섬> 같은 대표작을 아직 읽지 않은 독자라도 <마술 가게>를 통해 'SF의 조상' 웰스의 상상력을 맛있게 즐길 수 있다. 단, 웰스의 SF적 비전에는 '이쪽 세계'에 묶여있는 채 '저쪽 세계'를 아주 잠깐만 엿본 자의 우울함이 배어있다. 과학 문명의 진보를 향한 건강한 낙관주의라든가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기대감 같은 건 여기 없다. <수정 계란>의 마지막 문장을 기억해야 한다.
"어떤 환상도 현실을 충족할 수는 없는 법이다."
첨언하자면, 완전히 시력을 잃었을 무렵의 보르헤스가 온전히 기억에만 의지하여 골라낸 '바벨의 도서관' 시리즈는 전부 다 강력 추천작들이다. 훌륭한 취향을 갖고 싶다면 일단 훌륭한 취향을 가진 선생의 뒤를 밟을 일이다. 이 시리즈는 에드거 앨런 포, 길버트 키스 체스터튼,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너새니얼 호손, 잭 런던, 윌리엄 벡퍼드 등의 대표작들을 아우른다.
하루빨리 이 시리즈가 완간되어 '나의 도서관' 속에도 '바벨의 도서관'이 완벽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길.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