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 하나로 로버트 하인라인이 1942년에 발표한 단편 소설 '왈도(Waldo)'에서 나온 '왈도'라는 신조어가 있다. 왈도는 중증근무력증 때문에 머리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원격 조종 보조 기구를 발명해 손가락 끝을 조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동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소설 속 왈도는 우주에서 과학기술자로 활약하며 크게 성공했고, '왈도'라는 말은 이후 진짜 발명된 원격 조종 보조 기구를 일컫는 일반명사가 되었다.
과학 소설은 장르 초기부터 장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이는 장애가 다른 소수자 이슈와 달리 생활 속에 가시적으로 존재한 데서 비롯된다. 특히 과학 소설이 펄프문학으로 태동하기 시작했던 1930년대 많은 작가들은 대공황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젊은이들이었다. 그들에게 장애는 아주 가까이 있었고 세계 대전을 거치며 삶의 일부가 되었다. 의병 제대했던 전직 해군 하인라인은 장애와 장애인의 삶을 이야기 속에 당연한 듯이 담았고, 자신과 주위 상이군인들을 모델로 삼았다.
과학 소설이 장애를 '왈도'에서처럼 기술적인 극복 대상으로만 다룬 것은 아니다. 오히려 1960년대 이후 장애는 '소프트 SF'에서 널리 다루어지기 시작한다. 소위 '하드 SF'가 과학기술적인 수단을 통한 장애의 해소, 극복, 또는 수용에 집중했다면, 사회과학에 기반을 둔 '소프트 SF'는 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에 좀 더 초점을 맞추었다. 주인공이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가 있는 이러저러한 사람'으로 정의되면서, 과학 소설에서 장애는 주인공이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주인공이 가진 하나의 특성이 되었다. 장애는 중요한 특성이겠지만,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다. 인물의 장애만으로 그 사람을 정의하는 편견을 SF는 계속해서 배격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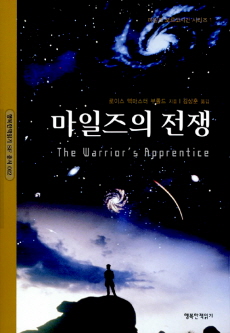
|
| ▲ <마일즈의 전쟁>(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지음, 김상훈 옮김, 행복한책읽기 펴냄). ⓒ행복한책읽기 |
주인공 마일즈 보르코시건은 바라야 황제의 친족으로 귀족인 '보르' 중에서도 으뜸 가는 대귀족 가문, '보르코시건' 가의 후계자이다. 아버지는 어린 황제 옆에서 사실상 제국을 직접 통치하는 총리이고 할아버지 표토르 보르코시건 백작은 전쟁을 이끌었던 군의 영웅이다.
그러나 정치와 군대 모두를 지배하는 이 거대 가문의 후계자인 마일즈에게는 할아버지가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 바로 신체 장애이다. 온몸의 뼈는 툭하면 부러지고 제대로 자라지 못한 몸은 작아 누구든 올려다보아야 한다. 어렸을 때부터 온갖 의학을 동원해왔지만 보조 기구 없이는 달리기는커녕 걷는 것도 벅차다.
어머니가 마일즈를 임신했을 때 솔톡신 가스 공격을 받았기 때문인데, 집안의 어른인 할아버지는 마일즈를 낙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래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받아야 하는 후계자 마일즈에게 표토르라는 이름을 붙이지 못하게 했다. 군대와 물리력, 계급이 중요하고 장애에 대한 의식 수준이 낮은 군국주의 사회 바라야에서 가장 위대한 가문의 외아들인 마일즈가 겪는 갈등과 모험은 독자를 사로잡는다.
이 시리즈의 가장 멋진 부분은 바로 마일즈가 단지 '장애인'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일즈의 장애는 분명히 현실이다. 마일즈는 끊임없이 편견을 갖고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그러나 마일즈는 장애가 있는 동시에 머리가 좋고, 성미가 급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알고, 야심이 있는 젊은이이다.
마일즈의 장점은 장애를 보상하거나 만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한다. 마일즈가 갖는 단점과 한계가 그 자체로 존재하듯이. 마일즈는 기적적으로 자신의 두 다리로 뛰어다니거나 근육을 키우지 못하지만, 그런 바람이 필요 없는 삶을 살고 그런 바람으로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의 영웅으로 성장한다.
20년 넘게 이어진 마일즈 보르코시건 시리즈는 여전히 독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마일즈의 전쟁>에서 사관학교 시험장에서 두 다리가 부러져 실려 나갔던 열일곱 살 마일즈는 2010년 신작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