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나 폴러스의 동화 『꽃들에게 희망을』에 나오는 것처럼 동료들을 짓밟고 탑의 꼭대기로 오르는 일에만 전력하는 나비의 애벌레들은 벌레로 생애를 마친다. 그의 말대로 "삶은 힘겹다. 그건 희망이며 동시에 상처이기도 하다. (.....) 하늘로 치솟는 욕망의 탑을 경멸하면서도 정점에 오른 이를 여전히 부러워한다. 줄무늬 애벌레의 깨우침이 소중함을 알면서도 그러다가 혹 길 위에서 나 혼자서만 무작정 기다리는 자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 근심한다."
그러는 사이 우리 인생은 벌레의 인생으로 가고 만다. 나비가 되고 싶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치를 짓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나비로 살겠다는 꿈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나비가 되지 못한 벌레는 벌레 자신에게도 절망이고 꽃들에게도 절망이다.
인간이 사는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저자는 개인과 사회 모두의 '성숙'을 주문한다. "성장에는 열을 올리지만 '성숙'에는 관심이 없는 사회"는 말로는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되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무엇이 행복인지를 묻지 않고 달려가기에 급급한 때문이다. "성장 제일주의와 속도경쟁 위주의 사회에서는,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본질에 대한 생각을 키우는 일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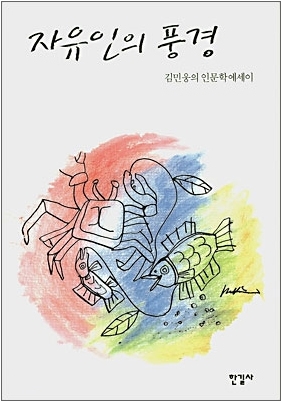
|
우리 사회가 성급하게 인문학과 철학을 버리고, 사회과학과 문학을 소홀히 여기며 자본이 쥐고 있는 권력만을 동경하는 동안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곧 노예의 삶에 지나지 않음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현실적 필요에 봉사하는 실용적 기능성을 앞세우는 지식인은 넘쳐나나, 이 사회의 근본에 대한 성찰적 질문을 던지는 지식인"이 드문 것을 안타까워한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인문학을 강조한다. 인문학이야말로 오랜 문명의 자산과 인류의 지혜를 담고 있는 나침반이기 때문이다. 그의 사유는 깊고 넓다. 인문학에서 그치지 않고 시와 연극 소설과 영화, 신화와 철학과 미술의 세계를 끌어온다.
"베르길리우스를 배척하는 사회는 스스로를 중세로 만든다. 연옥의 비극을 일깨우는 이성을 경멸하는 시대는 그 자체가 연옥이다. 단테를 핍박했던 피렌체는 자신을 구할 영혼의 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았다.(.....) 시와 역사가 하나 되는 곳에서 희망과 사랑도 잉태된다 "고 그는 말한다.
그의 말대로 "모순이 있는 한 비판적 성찰은 필수다. 강자의 승리만 존중되는 현실에서 약자를 지켜내려는 것은 기본 윤리다. 시장의 종교가 지배하는 곳에서 인간의 가치를 궁리하는 것은 철학의 책임이다.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대안의 모색을 포기하는 것은 주어진 대로 살라는 명령에 따르는 노예의 길이다."
금융위기 이후 급속도로 신자유주의체제로 편입되면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를 바라보며 저자는 칼 폴라니의 말을 빌어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공격하는 부자들의 혁명'이라 지적한다. 일찍이 마르크스도 노동으로 지쳐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의 아주 일부 시간에 하는 노동으로 사회 전체의 생계가 해결되고, 나머지 시간은 시를 읊고 음악을 즐기며 하고 싶은 낚시를 가는 그런 세상을 꿈꾸었다. 자본에게는 무한대의 자유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본의 자유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세상을 꿈꾸지 않았다.
"우리는 누구나 무수한 싸움을 치러오면서 현재 이 지점까지 이르렀다. 때로 우린 격투에 몰두하여 사랑을 잃었고 다급한 마음에 억지를 부렸으며 좌절이 깊어 용기를 버렸다. 세상이 이미 지어놓은 건물 속으로 먼저 들어가기 위해 자유는 더 이상 필요 없거나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기기도 하며, 도리어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믿기도 한다. 비굴해진 영혼으로 한 줌의 안락을 얻고, 냉혹해진 심장으로 소와 말과 포도나무와 이웃에게 거만하게 욕설을 퍼붓기도 한다. 그건 승리해도 패배한 자의 모습이다."
카잔차키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이런 말들에 나는 밑줄을 긋는다. 진정한 자유인의 삶, 성찰하고 성숙해지는 삶, 그런 삶의 자세만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할 것이다. 저자는 그런 예를 몽테뉴와 루소에게서도 찾는다.
'이성'을 앞세우며 새로운 사회건설을 부르짖었던 볼테르를 비롯한 백과전서파가 기득권층이 제공하는 사교생활에 익숙해져 갈 때, 루소는 여기에 섞이지 않았다. 무엇으로도 사육당하지 않는 지성, 홀로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상, 그리고 끝까지 자유로운 영혼에서 새로운 시대는 마침내 태어난다. "
이런 그의 말에 힘을 얻는다.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삶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면서도 그의 글은 섬세하고 유려한 문학적 문장으로 이어진다. 연극 <위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비비안에게 남은 시간의 토막은 매우 짧은 것이었다. 그걸 그녀의 뛰어난 지성의 칼로 다시 잘게 썰어 그 분할된 가닥들을 하나씩 길게 늘인 다음에 새것처럼 사용할 길은 보이지 않았다" 와 같은 문장 옆에 나는 별표 하나를 쳐 두었다. 밑줄은 그 페이지의 마지막 행까지 이어졌다. '세계체제론'만을 가르치지 말고 문학론을 가르쳐도 그 강의가 흥미진진하고 신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책이면서 시적인 문장으로 읽는 즐거움을 주는 책을 만나는 날은 한 주일이 즐겁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