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팽손의 우려와 달리 조광조는 진사시에 1등으로 합격했다. 평소에 사서오경을 공부해 왔던 조광조는 부(賦)와 고시(古詩)를 지어 합격자를 선별하는 진사시를 보아 당당히 1등으로 합격한 것이었다. 그것도 참시관의 묵인 하에 반정의 공신 자제들이 부정을 저지르는 불미스런 일도 있었지만 조광조의 탁월한 문장력은 시험을 주재하는 상시관(上試官)과 참시관(參試官), 그리고 감시관(監試官)을 놀라게 했다.
조광조는 시험장 밖에서 진사시 1등 합격이란 방을 보고는 박경의 옛집으로 돌아와 동지들의 축하를 받았다. 누구보다도 동갑지기인 김식이 기뻐했다. 김식은 용문사 계곡의 산방에서 미리 내려와 기다리고 있다가 어깨춤이라도 출 듯이 환호했다.
"정암이 생원시를 보지 않고 진사시를 본다 하기에 은근히 걱정을 했네. 허나 사서오경만 보아오던 자네가 보란 듯이 진사시에 1등을 했어. 오늘은 자네의 날이니 한 잔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모두 명경으로 가세. 초설이 누구보다도 좋아할 걸세. 자네를 사모하는 초설이 말일세."
박경의 옛집에는 김식을 비롯하여 박세훈, 기준, 김구가 와 있었다. 조광조의 부탁으로 시험장으로 가지 않고 박경의 옛집으로 와 있었던 것이다. 명경으로 가자고 재촉하는 사람은 김식뿐만 아니었다. 양팽손만 빼놓고 모두가 명경으로 가자고 소리쳤다. 그러나 정암은 완곡하게 거절했다.
"축하의 자리는 나중에 마련해도 늦지 않을 걸세. 양 동지가 며칠 후 생원시를 보는데 잔을 들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은가. 양 동지의 결과를 보고 나서 축하의 자리를 갖는 것이 어떤가."
조광조가 양팽손을 배려하여 축하연을 거절하자, 김식은 더 이상 강권하지 않았다.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은 대신 오늘 치렀던 진사시 시험문제를 놓고 화제 삼아 이야기를 했다. 김구가 물었다.
"정암 형님, 평소에 부를 지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훤당 선생을 만나기 전, 그러니까 도학을 익히기 전이었네. 어린 시절 그때는 나도 최치원이 지은 <영효(詠曉)>를 외우곤 했지."
"<영효>라면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부가 아닙니까."
"그렇다네.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아직 <영효>보다 먼저 발표한 부 형식의 글을 보지 못했네. 사마상여의 부보다 나는 최치원의 문장을 더 좋아했지."
부를 얘기할 때 한나라 시대의 한부(漢賦)를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한 무제 때 사마상여(司馬相如)가 탁월한 문장력으로 부를 중국이나 한국에 크게 유행시켰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부는 한반도에도 전래되었고, 신라의 최치원, 고려의 이규보와 이색, 조선의 서거정, 김시습, 신숙주, 김일손 등의 선비들이 즐겨 짓는 문장의 형식이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부 형식의 글이 사대부들 사이에 오랫동안 유행이 된 것은 진사시와 대과의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과거(科擧)의 전통 탓이 무엇보다도 컸다.
부는 형식적으로 서(序)와 본(本), 그리고 난(亂; 결론)의 논법을 취하는데, 난은 작가가 결론을 내리는 부분으로 '작가 왈(作家 曰) 식으로 서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조광조가 한훤당 김굉필을 만나, 그의 제자가 되기 전에 부를 지었다 함은 17세 이전의 일이었다. 그런데도 조광조는 진사시 시험장에서 마치 오랫동안 부를 익혀 온 사람처럼 시험장에서 제시된 제목인 <춘부(春賦)>를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지었는데, 붓을 들어 거침없이 일필휘지로 답안을 작성하였던 것이다.
"소싯적이네. 훈장님에게 <춘부>를 지어 바친 이후 처음으로 써 본 것이네. 갑자기 구상을 한 글이 아니고 평소에 품었던 생각을 글로 풀어본 것이네. 다만."
"다만 무엇입니까."
"상시관의 눈에 들기 위해서 지은 글은 아니었네."
"그럼 누구를 위해 지은 글이었습니까."
"세상과 전하를 향해서 하고 싶은 생각을 담은 글이었네."
김식이 또 말했다.
"세상과 전하를 위해서라, <춘부>를 어떤 문장으로 채웠는지 궁금해지는구먼."
"세상과 전하를 위한 발언치고는 누구라도 다 아는 상식적인 글이었어."
"동지들 앞에서 한 번 욀 수 있겠는가."
"무얼 대단한 글이라고."
성리학을 공부하여 진정한 유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으므로 조광조는 별 자랑거리가 못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춘부>는 때 묻지 않은 인격의 선비를 기다리는 중종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시험장을 주재한 상시관을 놀라게 한 명문으로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춘부>의 서(序)는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었다.

|
음과 양이 갈마들어 4시(四時; 사계절)의 순서가 되는데 봄은 하늘의 원(元)이다. 4시는 봄으로부터 시작되고, 4단(四端; 惻隱之心, 羞惡之心, 辭讓之心, 是非之心)은 인에서 발단이 된다. 봄이 없으면 4시의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인이 없으면 4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하늘은 욕심이 없어 봄을 운행하여 4시를 이루나 사람은 욕심이 있어서 인을 상실하여 4단이 충분해지지 않는다.
陰陽錯而四時序 春者天之元也 四時自春而始 四端自仁而發 無春序不成 無仁端不遂 然天無欲 而春行四時成 人有欲 而仁喪端不成
사계절이 봄으로 시작해서 운행하듯 측은지심이나 수악지심, 사양지심과 시비지심도 인에서 출발한다는 <주역>과 성리학의 대의를 서(序)에서 펴고 본(本)에서는 성리학의 이(理)와 기(氣)를 들고 나와 조광조 자신의 주장을 펴나갔다.
음양이 교대로 변함이여
이기의 묘한 요체에 의거함이로다.
이가 기를 타고 서로 느낌이여
원이 원으로 돌아가 소멸치 않는도다.
惟陰陽之交變兮 寓理氣之妙要
理乘氣而相感兮 元復元而不消
이어서 조광조는 맑은 선비들이 세상에 나서지 않는 현실을 비유의 문장으로 지적했다. 하늘의 도는 맑은 샘물처럼 흘러가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흙탕물 같은 무리들에 의해 인도(人道)가 바르게 펼쳐지지 못하고 현실은 늘 혼란스럽고 혼탁하다는 것이었다.
샘물이 흘러서 끝가지 가려고 함이여
흙탕물이 섞이어 맑을 수가 없도다.
위로 하늘의 밝은 명을 더럽힘이여
아래로 사람의 윤리와 기강에 게으르도다.
즐거이 아래로 흐르면서 깨닫지 못함이여
수많은 악이 쌓이는 바로다.
泉渭渭而欲達兮 被黃流而不淸
上褻天之明命兮 下慢人之倫紀
甘下流而不悟兮 羌衆惡之小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는 방편으로 조광조는 공자의 말씀을 수제자답게 금과옥조로 삼고 살았던 안자(顔子)의 태도에서 그 해답을 찾는 것으로 <춘부>의 본론을 끝냈다.
옛적에 공자에게 안자가 있음이여
인을 구하여 묻는 지극한 방도로다.
4대(도교의 道,天,地,王)와 5상(仁,義,禮,智,信)을 앎이여
또한 이에서 말미암아 번창해지도다.
부지런히 4물(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에 힘써서 조촐하게 있음이여
잠깐의 성함도 봄(春) 아닌 것이 없도다.
昔顔子於尼父兮 問求仁之至方
知四大與五常兮 亦由玆而乃昌
勤四勿而操存兮 方寸盎無不春
이리하여 조광조는 결론에 이르러서 도학을 권면하는 자신의 의지를 소신껏 발언하는 의문문 형식으로 <춘부>의 마지막 문장을 끝냈다.
하늘에 있어서는 봄이요
사람에 있어서는 인이로다.
모두가 태극을 근본으로 하여
다르면서도 같거니
이를 아는 사람 누구인가.
在天兮春 在仁兮仁
皆本太極 異而同兮 識此何人

|
혼탁한 세상에 화두를 던지듯 '이를 아는 사람 누구인가' 하고 끝을 맺은 것은 지금까지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것을 당당하게 제기하는 물음이기도 했다. 하늘의 도를 펼치려면 성리학, 즉 도학이 열쇠인데 그 열쇠를 쥔 자가 누구냐는 발언이었다.
조광조는 <춘부>가 짧은 문장이었기 때문에 단 한 자도 틀리지 않고 모두 외울 수 있었다. <춘부>의 내용을 다 듣고 난 김구는 조금은 송구한 얼굴로 한 달 전의 일을 진솔하게 사과했다.
"도학을 권면하려는 형님의 깊은 뜻도 모르고 경솔하게 행동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저는 <춘부>의 마지막 문장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점잖고도 단호한 문장이 마치 형님을 대하는 듯합니다."
김구는 천재답게 <춘부>의 마지막 문장을 금세 외우며 말했다. 김식이 시험관에게 들었던 얘기를 전했다.
"정암, 시관의 우두머리인 상시관이 전하께 자네의 답안지를 보여드렸다네. <춘부>를 본 전하께서는 용안에 미소를 띠시고 '조광조가 누구냐'고 재차 물었다고 하네. 아마도 자네는 머잖아 전하의 사람이 될 것이네."
"노천, 전하의 사람이라니, 큰일 날 소리 하는구먼."
"그게 왜 큰일 날 소리인가."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 자네는 들어보지 못했는가."
"자네 성품으로 보아 옳은 일이라면 모난 돌의 역할도 자처할 위인이라서 해본 말이네. 안 그런가."
"내게 그런 면이 있었는가. 하긴 돌아가신 아버님이 늘 그러셨네. 나더러 시비를 가릴 때는 부러질 줄도 알고 휘어질 줄도 알아야 하는데 내게는 그런 지혜가 부족하다고 말이네."
"무위를 말하고 다니던 노자가 유도를 설파하는 공자에게 그랬다던가. 단단한 이보다는 부드러운 혀가 더 오래간다고."
"타고난 천성을 어찌하겠나."
"아무튼 내가 임금이라도 자네의 문장을 보고 반했겠어. 그동안 전하는 무인 출신의 반정의 공신들에게 힘 한 번 크게 써보지 못하고 얼마나 시달림을 받아 왔는가. 그런 전하에게 하늘의 명대로 인(仁)으로 돌아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자고 하는 자네의 글은 분명 전하의 갈증을 해소시켜 준 샘물 같았을 것이네."
"난 아직 멀었네. 이번 진사시 장원은 거친 바다에 돌멩이 하나를 던져본 것에 불과하네. 그런 의미밖에 없어."
"돌멩이 하나라니."
"그래서 성균관에 입학하려는 것이고, 도학을 현실과 접목하는 방법이 무언지 새롭게 공부해보려고 하네."
"그런 다음에는."
"언젠가 말하지 않았던가. 세상에 나아갈 것이라고. 그리하여 하늘의 도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자네 생각대로 군자의 나라를 이룬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지. 허나 자네들 같은 동지들이 있으니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자네들도 나와 함께 성균관에 입학해야 할 것이네. 힘을 한 데 모아야 하니까. 그럴 수 있겠는가."
"좋아, 동감이네."
김식이 성균관에 입학하겠다고 말하자 기준도 동의했다.
"형님들, 저도 입학하겠습니다."
"대유(김구의 호) 아우님은 반대하는가."
"아닙니다. 물론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박경의 옛집을 찾아온 박세희도 박수로 화답했다.
"저는 지금까지 대사성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입학하지 않고 있었소만 동지들이 그리한다면 나도 소과(小科)에 합격한 사람이니 입학자격이 있는 것 아니겠소."
대사성이란 성균관을 관장하는 우두머리 관리인데, 학식이나 인품에 의해 천거받기보다는 반정의 공신들에게 줄을 잘 선 처세술로 임명을 받아 오기 때문에 유생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박세희는 그런 부조리를 용납하지 않았으므로 성균관을 외면해 왔던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 양팽손은 이야기에 끼지 못하고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생원시가 며칠 늦추어진 탓에 김이 빠져 있었다. 그제야 양팽손의 기분을 살핀 김구가 말했다.
"양 동지, 벼락치기로 공부해서 얼마나 머리에 들겠나. 양 동지 실력이면 틀림없이 합격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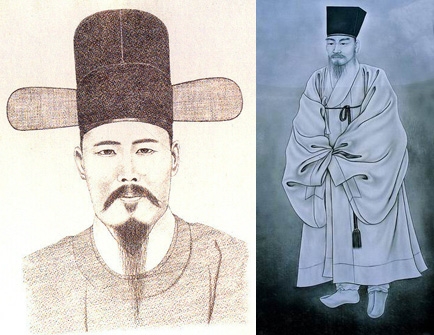
|
"대유, 시험이 연기됐네. 막상 연기가 되니 불안하기도 하고 안심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다네."
김구와 양팽손은 동갑지기로서 몇 번 만난 뒤로는 어느새 말을 올려다 놓았다 하며 허물없는 사이가 돼 있었다. 원래는 진사시를 시행한 다음 날 생원시를 보는데, 이번에는 생원시의 시험 문제가 사전에 누출되어 며칠 뒤로 늦추어졌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종2품의 상시관도 품계를 높여 뽑기로 했던 것이다.
"무엇이 걱정인가."
"대유, 시험 때문만은 아니네. 고향을 생각하고 있었네. 지금이 가장 바쁜 농번기라서 말이네."
양팽손 집안은 서울의 동지들과 달리 한미했다. 능주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힘겨운 처지였으므로 선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그들과 달랐다. 가족 모두가 논밭에 매달려야 하는 봄이 왔으므로 일손이 부족할 터였다. 양팽손은 논밭에서 고생하는 부모의 얼굴을 떠올라 얘기하는 좌중에 끼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여유가 있구먼. 시험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의 농사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말이네."
"일손이 부족해서 부엌에 있는 부지깽이도 논밭으로 나간다는 봄이네."
"생원시에 장원을 해보시게. 부모님이 더 좋아하실 것이오.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가 아니겠나."
"옳은 얘기지만 논밭에서 고생하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네."
"자, 효자 동지. 그렇게 청승맞게 앉아 있지 말고 이리 와 앉게나. 시험 문제가 유출되어 며칠 늦추어졌다고 하니 양 동지에게 유리했으면 했지 불리한 일은 아닌 것 같으이."
실제로 시험문제가 유출되어 시기가 연기되었다면 소위 권력 있고 돈 많은 자제들보다는 실력 하나만 믿고 서울로 올라온 양팽손에게 유리할 터였다.
"내 걱정을 해주니 고맙네."
"시험문제의 유출도 큰 문제지만 참시관이나 감시관과 짜고 사서오경을 옷 속에 넣어 숨겨 가지고 온 사람도 있다고 하더구먼. 허나 이번에는 공평무사한 상시관을 내정하겠다고 하니 믿어보시게."
조광조가 진사시를 볼 때도 이런저런 부정행위자가 적발되어 시험장에서 쫓겨 나간 응시생이 서너 사람이나 된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조광조는 부정행위가 은밀하게 자행되는 공평하지 못한 분위기 속에서도 보란 듯이 1등을 한 셈이었다.
"자, 오늘은 양 동지를 위해서 일찍 헤어지는 것이 좋겠소. 양 동지가 시험을 보고 난 뒤 회동을 하는 것이 좋겠소."
"내 걱정하지 말고 더 얘기를 나누다 가시오. 난 괜찮소."
양팽손이 만류했으나 소용없었다. 조광조를 축하하러 모인 동지들이 하나 둘 빠져나가고 나니 집은 어느새 빈집처럼 조용해져버렸다.
"고향의 부모님을 생각하는 양 동지의 마음을 알 것 같소. 내일 아침 일찍 나는 용인으로 내려갈 것이오."
조광조는 노환으로 누워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오늘 축하연을 받지 않은 것은 나의 시험공부를 걱정한 탓도 있지만 실제로는 병환중인 어머니 때문이었구려."
"맞소. 부모가 앓고 계신데 어찌 자식이 크게 소리를 내어 웃겠소. 얘기를 하면서도 내내 어머니 생각뿐이었소."
"아까 대유 동지가 나보고 효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정암 형이 진정한 효자이십니다."
조광조와 양팽손의 나이 차이는 6살이나 되었지만 이럴 때는 선후배가 아니라 지음(知音)의 지기가 되었다. 서로의 처지와 마음을 이심전심으로 위로하며 도반(道伴)으로서 교분을 깊게 쌓고 있었던 것이다.<계속>
*[정찬주 연재소설] "하늘의 도"는 화순군 홈페이지와 동시에 연재됩니다.
☞ 화순군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