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은 절대 '뚜이부치(對不起, 미안하다)'라고 하지 않는다."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일본과 중국에 대한 속설들이다. 전혀 틀린 평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를 일본과 중국에 대한 '이해'로 보기도 어렵다. 전자에는 '의뭉스러운 일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깔려 있고 후자에는 '무례한 중국인'에 대한 비아냥이 묻어나니 일본과 중국을 이웃 나라로 접근해 보려는 이들에겐 경계심만 잔뜩 높여놓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21세기 한중일 삼국지>는 '편견'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일본과 중국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이해'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에 도움이 되는 책이다.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중국에서 교수로 지내고 있는 저자 우수근 씨는 "각국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이해와 상생의 출발이 된다"며 '같은 듯 다른' 한중일 3국의 생활과 모습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별로 정리해 엮어 냈다.
한국의 '인맥', 중국의 '꽌시', 일본의 '코네'
한국의 '인맥'은 중국과 일본에서도 통용되는 개념이다. 국어사전이 '정계, 재계, 학계 따위에서 형성된 사람들의 유대 관계'로 정의하고 있는 한국의 '인맥'은 중국의 '꽌시(關系)'와도 일맥상통한다.
다만, 주로 인사나 정보 관계에서 활용되던 '인맥'이 '시스템'의 정착에 따라 의해 그 영향력이 약해지는 추세라면, '꽌시'는 여전히 사회 전반에서 '약발이 통한다'는 것이 차이로 보인다. 일본의 '코네(영어 connection의 줄임말)' 역시 비슷한 개념이지만 그 파워 면에서는 한국의 '인맥'보다도 훨씬 약하다.
"예를 들어, 중국 사회를 나타내는 표현 가운데 '중국에서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말이 있다. 이는 원칙이나 제반 규칙 등에 의해 안 될 것도 일단 '꽌시'를 잘 잡으면 술술 풀리기도 하고 관계 법령이나 규칙 등에 의해 문제 없을 것도 제대로 안되는 것이 중국 사회라는 것이다. 그만큼 예측 불허한 곳이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이에 비해 일본 사회는 다양한 법령과 규칙, 온갖 원칙 등으로 거미줄처럼 칭칭 둘러쳐져 있다. 그 속에서는 아무리 좋은 인맥이라 해도 원칙이나 규정에 위배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다시 말해, 일본사회의 '코네'라는 것은 '일을 조금 더 빨리 진행시키거나 관계자를 소개 받아 우호적으로 봐 달라고 부탁'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꽌시'와 '코네' 사이의 거리에서도 드러나는 중국 사회와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한 일본인들은 중국을 '경계의 대상'으로 조명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서 발간되는 중국 관련 책들도 거의 '13억을 조심하라'는 식이다. 한국에서 발간되는 중국 서적들이 13억 인구의 매력에 치중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저자는 "그 어느 것 하나가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며 "한 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고루 균형 잡힌 시각에서 중국에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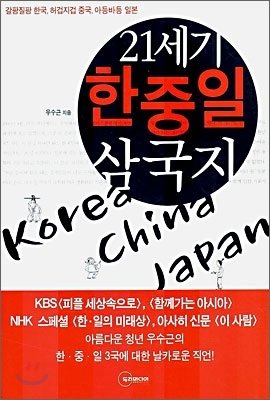
|
한중일 경제성장의 그늘, '과로사'
"1980년대 일본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과로사'란 용어는 한때 일본 사회의 한 특징을 나타내는 말이었다. 그러다가 고도성장의 끝자락에서 우리에게까지 엄습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과로사 세계 제1위라는 멍에 속에서 아까운 재원을 잃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로사가 이제는 일본과 한국을 거쳐 중국의 사회적 이슈로도 등장한 것이다. 한창 의욕에 넘쳐 일할 중국의 청장년들도 잇달아 과로사로 쓰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만디로 잘 알려진 중국. 사회주의 국가이니만큼 대충대충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일할 것 같지만 상황이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다."
저자는 '대국(大國)인'으로서 느긋한 풍모를 나타내던 '만만디(천천히)'는 더 이상 중국의 키워드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자본주의가 유입되면서 앞서나간 나라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 중국도 "콰이콰이(빨리빨리)"를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좀 더 일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 '좀 더 벌자'는 풍속도와 함께 '일하다 죽는' 과로사도 수입해 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전적 여유와 육체적, 정신정 편안함을 동시에 누리는 삶을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결국 생명과 돈을 맞바꾸는 삶을 불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행히 일본과 한국의 예를 거울로 삼은 중국 정부가 과로사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대적인 사회 캠페인을 벌여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스트레스 해소법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한다.
"'까치외교'로 국격을 빛내자"
저자는 이 외에도 '닮은 듯 다른' 한중일의 각 분야를 조명한 뒤 대륙과 열도 사이 놓인 반도국가 한국에 '까치국가'가 될 것을 제언한다.
정계나 외교 관계가 모든 현안의 주도권을 쥐려 하기 보다는 각 민간 활동 주체들이 스스로 부문별, 종목별 세계 일류를 개발해 나가는 동시에 우리만의 '매력'을 전파시킬 수 있도록 외교 역량을 지원해 나간다는 것이 '까치국가'의 개념이다.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만이 가능한 문화 대국으로, 우리 국민들이 최대한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행복 대국으로 만들어 나가자. 정치.경제와 같은 하드웨어적 측면에서의 대국만을 추구하지 말고, 정신문화와 같은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의 대국도 적극 지향해 나가자. 개인에게는 인격이 있듯 국가에는 '국격(國格)'이 있다. 대한민국을 고귀한 국격으로 빛내 나가자는 것이다."
'거칠고 무례하기 그지없는' 중국과 '13억 중국인이 침 한 번씩만 뱉어도 떠내려갈 조그만 섬나라' 일본이 으르렁 거리는 사이에서 양 자에게 모두 환영받는 '까치국가', 한국. 신바람 나는 상상임은 분명한데, 실제로도 가능할까? 판단은 독자의 몫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