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인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어린이책 작가모임' 사람들이 탄 세 번째 희망버스 번호는 44호였다. 그 버스에는 인문학 책을 만드는 사람들과 연극을 하는 사람들도 올랐다. 불온한데다 폭력적이기까지 한 무서운 세력일 거라던 희망버스 승객들은 이른 아침에 떡집에서 빼온 절편을 나눠 먹었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길을 내달리는 버스 안은 나른했다. 사람들은 졸다 깨서는 잠시 들른 휴게소에서 하드를 사서 베어 물었다. 막아서지만 않으면, 닦아세우지만 않으면 소풍과 다를 게 없었다. 부산에 닿아서 시내버스를 타고 영도다리를 건널 때, 아주머니 둘이 "뭣하러 부산 시민이 싫다는데 몰려오느냐?"고 타박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우리 여행이 소풍이 아니라는 걸 퍼뜩 깨달았다.
왜? 뭣하러 우리는 더운 날 푸른 물이 넘실거리는 해운대가 아니라 볼품없이 크기만 한 크레인이 즐비한, 그걸 지키겠다고 전경들이 새까맣게 늘어서 있는 영도로 가는 걸까. 85호 크레인 때문에 지긋지긋하다던 그 부산 아주머니들에게 미처 대답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영도에 간 건 85호 크레인에 있는 사람이 켜놓은 불빛 때문이다. 망망대해에 우뚝 서 있는 등대처럼 환한 그 불빛은 남의 희망을 갉아 내 희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의 일그러진 욕망을 드러냈다. 또 그 불빛은 일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수많은 사람이 상처와 눈물을 감춘 채 벌이는 아픈 싸움을 보여줬다. 그리고 언젠가 나 자신이, 내 가족이 그 싸움을 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일깨워줬다.
그러니까 영도 길바닥에서 밤을 지새운 사람들이 바라본 건 한 사람이 켜놓은 커다란 불빛이었다.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우리의 희망'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희망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생각했다. 그러면서 한 번도 높은 곳을 욕심내지 않았던 이들이 무엇인가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높디높은 곳에 오르지 않는 세상을, 굳이 희망버스라는 걸 타지 않아도 아침에 오른 버스가 모두에게 희망 버스인 세상을 꿈꿨다.
오늘도 85호 크레인에서 켜놓은 불빛은 꺼지지 않고 있다. 김진숙 씨가 그곳에서 내려온다 해도 그 불빛은 꺼지지 않을 것이며, 불이 켜있는 한 희망버스는 또 달릴 것이다. 욕심만 꽉 찬 세상에 맞서 외롭게 힘들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승객을 꽉꽉 채워 소풍 가듯 유쾌하게 달리는 희망버스! 이건 아마 오래전에 우리가 꿈꿨던 희망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곧 희망버스는 더 큰 희망에 닿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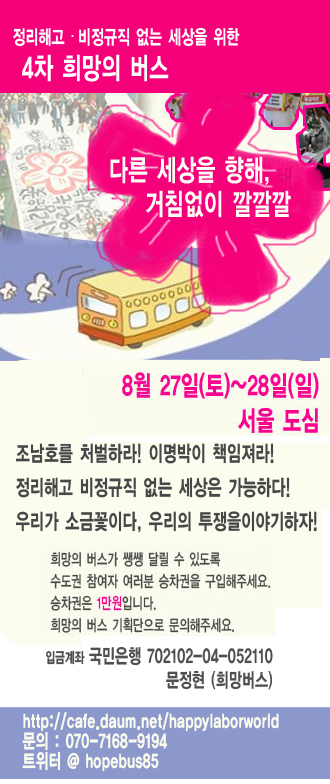
|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