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수의 형용모순
그 무렵, 어느 자리에서 '소망교회 금융인 선교회'(소금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주목받는 모임이다. 이야기를 듣다 문득 성서의 어느 한 대목이 떠올랐다. 성전을 더럽히는 환전상을 예수가 채찍으로 내쫓는 대목이다. 성서 속 환전상은 요즘 세상에서라면, 금융인이다. 주일 예배를 마친 뒤, 교회 안팎에 모여 금융권 뒷이야기를 나눌 소금회 회원들은 성서의 이 대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궁금증이 타올랐다.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게끔 하는 금융의 순기능을 부정하려는 게 아니다. '돈'을 다루는 일이 지저분하거나 천박하다고 여기는 것도 아니다. 인간은 욕망의 동물인데, 대부분의 욕망은 돈으로 매개된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내가 궁금했던 것은 우리 사회에서 '성(聖)'과 '속(俗)' 사이에 경계가 있는지였다. 종교학자 미르치아 엘리아데에 따르면, 성(聖)이 속(俗)에서 분리되는 순간 종교가 탄생한다. 그렇다면 소금회 회원, 소망교회 열성 신도인 그들에게 성과 속의 경계란 어떤 것일까. 이런 궁금증이었다.
하긴, 성(聖)과 속(俗)의 구분은 어쩌면 부질없는 짓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보수를 자처한다면, 함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분수를 지키고, 경계를 넘지 않는 것. 그리하여 자기가 맡은 바 본분에 전념하는 게 보수의 미덕이다. 그런데 성과 속이 일상에서 뒤엉킨 보수라니…. 솔직히 조금 혼란스러웠다.
'다움'의 논리와 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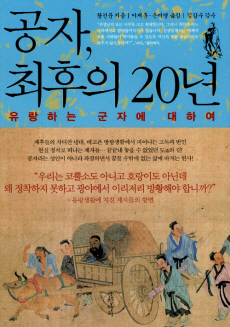
|
| ▲ <공자, 최후의 20년 : 유랑하는 군자에 대하여>(왕건문 지음, 은미영·이재훈 옮김, 글항아리 펴냄). ⓒ글항아리 |
이런 '~다움'의 논리에 대해 진보적인 이들은 종종 불편해 한다. 이유가 있다. 예컨대 과거 군사정권은 이런 논리로 학생운동을 탄압했다. '학생은 공부에 전념해야 학생답다. 사회 구성원이 각자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잘 지킬 때 사회가 평화롭다.'
1980년대를 살았던 이들이라면, 이런 주장이 헛소리라는 걸 몸으로 안다. 피로 얼룩진 광주, 숱한 의문사, 최루탄과 화염병으로 대표되는 당시가 평화로웠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게다. 그래서인지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띤 이들 사이에서 공자가 품었던 '정명'의 소신은 별 인기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달라져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눈앞의 모순을 바꿔서 세상을 조금 더 살 만한 곳으로 만드는 게 진보 정치의 역할이라면 말이다. 지금 우리는 이름과 실질이 엇갈린, 이름이 실질로부터 모욕당하고, 실질이 이름에 감춰지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보수'라 불릴 수 없는 게 '보수'라는 이름을 뒤집어쓴다. 노골적인 욕망이, 심지어 폭력이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2003년 당시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를 침략하며 '십자군'이라는 말을 쓴 것은 그래서 예사롭지 않다. 이게 우리 시대의 모순이라면, 그래서 피 흘리고, 눈물짓는 이가 있다면, 이른바 '진보'는 '정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
"명목에 실질을 맞추려다…", 유랑하는 군자의 삶
공자는 지금처럼 이름과 실질이 어긋난, 한마디로 '난세(亂世)'를 살았다.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실천적 지식인이었지만, 관운이 썩 좋지는 않았다. 51세가 돼서야 비로소 벼슬다운 벼슬을 했고, 54세에 정치 역정의 절정을 맞았다. 노나라의 대사구(법무부 장관 또는 대법관)가 됐다. 명목상으로는 대부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왕처럼 굴었던 삼환 씨를 토벌한 게 이때다. '명목과 실질의 일치'라는 신념의 적극적인 실천이었다. 공자는 실질에 어울리는 이름을 붙이는 것을 넘어 실질을 이름에 맞게 고치려 했다.
요즘이라면, 공자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 그래서 명분이 없는 권력이 선출된 권력, 즉 명분이 있는 권력을 압도하는 현상을 바로잡으려 들지 않았을까. 예컨대 재벌의 지나친 영향력 말이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기득권을 깨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삼환 씨 일파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고, 결국 공자가 졌다. 이듬해 공자는 노나라를 떠나 유랑 생활을 했다.
<공자, 최후의 20년>은 바로 이 시기, 공자의 유랑 시절을 다룬 책이다. 현실에 좌절한 이상주의적 지식인의 내면, 그러니까 오기와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그것을, 사료를 통해 잘 복원해냈다는 게 이 책의 미덕이다. 또 스승 잘못 만나 인생이 꼬였다며 툴툴대는 제자들에 대한 묘사도 흥미롭다.
예컨대 이런 대목이다.
"자로가 화가 나서 공자에게 물었다.
'우리는 이상을 품고 부지런히 도를 실천하였는데 군자도 이처럼 곤궁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자 공자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군자는 곤궁해도 도를 지키고 도를 실천하지만, 소인은 곤궁해지면 닥치는 대로 행하며 탈선하게 된다.'
공자가 곤궁에 처한 군자의 몸가짐을 일러주었지만 제자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래서 연이어 세 명의 제자가 찾아와 공자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
'우리는 코뿔소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닌데 왜 정착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이리저리 방황해야 합니까'"
공자의 난처한 표정, 그리고 제자들의 비참한 표정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하다.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는 제자들에게 공자는 '옳은 도리가 현실에서 꼭 이기거나 대접을 받는 것은 아니다. 어느 쪽이 현실에서 유리한가에 따라 입장을 정하는 것은 천박한 짓이다'라는 논리를 반복한다. 그러다 공자는 좋은 날 못 보고 죽는다. 제자들도 대부분 비슷한 운명이었다.
공자가 살았던 때와 마찬가지로, 이름과 실질이 제각각인 지금, '정명'을 꿈꾸는 이들도 어쩌면 비슷한 운명을 맞을지 모른다. 성(聖)과 속(俗)이 뒤엉킨 삶을 살면서, '신앙'을 내세우는 이들을 떠올리며 이 책을 덮었을 때 마음이 착잡했던 것은 그래서였다.
이름값 못하는 공공 기관…'21세기의 공자'가 할 일은?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서평을 쓰기 위해 이 책을 다시 꺼냈을 때, 눈에 들어온 뉴스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들에 대해 산업 재해 승인을 거부해 온 근로복지공단에 관한 것이었다. 이렇게 까다롭게 굴던 근로복지공단이 자기네 식구들, 그러니까 공단 직원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했다. 공단 체육 대회나 등반 대회에서 다친 것도 산재였고, 선반에 손가락을 베인 직원도 산재 보상을 받았다.
공자가 살아있었다면, 사익이 아닌 공공성(公共性)을 가리키는 '공(公)'이라는 글자를 이름에서 떼어 내야 한다고 꾸짖었을 게 뻔하다. 아니다. '근로복지공단' 이름을 내걸었으면서,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들보다 오히려 삼성 편을 들었다는 정황까지 보고 나면, 아예 공단 문패를 뜯어내려 들게다.
지금도 삼성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 편에 서서 산재 승인을 받으려 애쓰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 활동가들이 있다. 공자의 눈으로 보면, 이들이야 말로 '근로복지공단'이 '이름값'을 하게끔 이끄는 이들이다.
이들이 꼭 성공할지는 모르겠다. 마치 '이름 바로잡기'를 평생의 과업으로 삼았던 공자가 자신의 생애에서 성공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다.
2010년 현실의 승자는, 아마도 몇몇 소망교회 신자들처럼 신앙의 이름으로 출세를 도모하는 이들, 요컨대 이름과 실질을 교묘하게 분리하는 이들일 게다. 하지만 긴 역사는 다른 면을 보여준다. 우리는 공자를 몰아냈던 노나라 대부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공자는 현실에선 패배했지만 역사에선 승리했다. 적어도 역사에선, '반올림' 활동가들 역시 마찬가지일 게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