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은 중앙과 지방으로 이어지는 행정의 시대를 넘어 민간의 창의력과 시민의 감시력이 조화를 이룬 협치형의 새로운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11일 열린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 주최 제5차 새만금 대토론회에서 ‘새만금사업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거버넌스가 변해야 새만금의 미래가 바뀐다고 주장했다.
전북 전주 출신인 양기대 전 의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1991년부터 30여년간 새만금 거버넌스의 역사적 전개를 △중앙부처 주도의 개발관리 △제도화 단계 △다기관 협력형 체계기 등으로 구분했다.

1991년부터 2006년 방조제 완공에 이르는 1단계 시기는 중앙부처가 주도해 농업용지 조성사업 위주로 추진하면서 환경논란과 부처 간 갈등으로 장기 표류하는 과정에 ‘개발 추진체계의 불안정성’이 사업지연의 핵심 원인이라고 봤다.
이어 2007년부터 2013년까지는 ‘제도화 단계’로 이 시기에는 특별법이 제정되고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하면서 중앙정부 중심의 전담체계가 구축되었지만 지역 참여는 제한적이고 부처 간의 기능이 중복되고 권한이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지속됐다.
이어지는 3단계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로 이 기간동안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면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구조가 등장했지만 여전히 새만금청, 개발공사, 전북도간 권한이 분산되면서 ‘책임은 지역이, 결정은 중앙’이 내리는 구조적 모순이 고착화된 시기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양기대 전 의원은 “현 시점에서 새만금은 단순한 간척지가 아니라 지역분권과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시험하는 국가적 실험무대가 되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리더십과 지역의 실행력이 결합된다면 지금이야말로 새만금의 ‘골든타임’을 살릴 수 있는 결정적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이 ‘현장중심 거버넌스’로 전환해 대한민국 지역정책의 새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위원회는 정책·예산 조정 중심의 최고 심의기구였지만 지나친 중앙집중 구조로 현장 대응력 부족했던 만큼 대통령 직속 새만금위원회 전환도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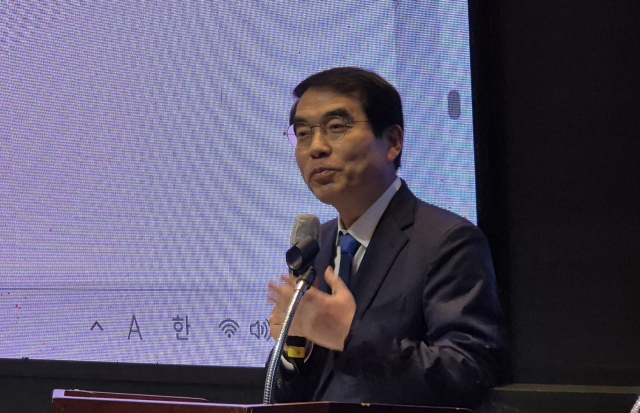
이어 전북도 주도의 ‘새만금 현장 실행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새만금청은 물론 새만금개발공사와 지자체, 기업,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각종 의사결정과 갈등을 관리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중앙 새만금위원회와 전북자치도 중심의 현장 실행위원회를 연결하는 상시 협의기구로 ‘새만금 통합협의체(가칭)’를 상설화해 공동으로 KPI(성과지표) 및 평가시스템 도입하는 한편 디지털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해 민간·정부·시민이 실시간으로 사업정보를 공유하는 투명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양기대 전 의원은 “새만금은 토지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로 당장의 바다를 메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과제는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메우는 일”이라며 “거버넌스의 진화 없이는 새만금의 성공도 없는 만큼 대통령의 리더십, 중앙의 조정력, 지방의 실행력, 민간의 창의력, 시민의 감시력이 조화를 이루는 협치형 모델로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