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동물권 옹호단체 PETA(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가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결정적인 시공간은 세계 패션 트렌드를 직조하는 뉴욕·런던·밀라노·파리 등 주요 패션쇼장 안팎이었다. PETA 활동가들은 1990년대부터 "모피를 입느니 아무것도 안 입겠어(I'd Rather Go Naked Than Wear Fur)"란 슬로건 아래 맨몸으로 패션쇼장 주변 거리를 행진하거나, "모피는 동물은 죽인다(Fur Kills")', "모피는 부끄러운 것(Fur Shame)" 등이 적힌 펼침막을 들고 패션쇼 무대에 뛰어들어 모피 입은 모델을 당황하게 하는 시위를 꾸준히 벌여왔다. 패션계는 시위대를 골칫거리로 취급하며 비웃곤 하지만("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냐", "또 나타났군", "너나 부끄러운 줄 알아"), 1994년 캘빈 클라인부터 시작해 랄프 로렌, 조르오 아르마니, 마이클 코어스, 구찌, 프라다 등 거물 명품 브랜드들이 하나둘 '퍼프리(Fur-free)'를 선언하고 있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는' 중인 것이다.
PETA의 패션쇼장 시위는 영국의 노예제 폐지론자 벤저민 레이(1682~1759)의 삶을 다룬 <벤저민 레이>(갈무리, 2021)를 읽으며 떠올린 장면들 중 하나였다. 백인 주인-흑인 노예 구조가 당연시되던 시대에 노예제의 잔혹성을 알리고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기 위해 그가 단행한 일련의 행위는 오늘날 '과격 시위', '급진적 운동', '직접 행동' 등으로 불리는 전략의 오래된 선례처럼 느껴졌다. 저자인 미국 역사학자 마커스 레디커의 "게릴라 연극(guerrilla theater)"이란 비유를 따르자면 주요 관객은 노예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동료 퀘이커교들이었고, 무대는 퀘이커교 집회가 열리는 예배당 안팎이었으며, 소품으로는 대체로 그의 '열광'에 찬 표정, 몸짓, 목소리가 전부였으나 때때로 노예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열매즙이 담긴 (유감스럽게도) 동물 방광 주머니, 저임금 노동 착취의 산물인 담배 파이프가 동원되기도 했다. 모든 이 안에 하나님이 "내면의 빛"으로 존재한다는 퀘이커교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에 충실했던 그에게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착취·억압하는 상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 '누군가가' 같은 신앙 공동체의 일원을 자처한다면 더욱 그랬다.
게릴라 연극을 거듭하며 동료들을 모욕하고 집회를 방해한 '죄'로 벤저민 레이는 결국 고향인 콜체스터를 비롯해 선원으로서의 삶을 시작한 런던, '제2의 고향'을 꿈꾸며 이주한 미국 필라델피아, 말년을 보낸 영국 애빙턴에 이르기까지 네 번에 걸쳐 퀘이커교 공동체에서 쫓겨났고, 그 어떤 공동체에도 속하지 않은/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삶의 지표이자 정체성의 토대인 신앙의 영토 밖으로 추방당하는 경험은 분명 큰 충격과 깊은 상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게릴라 연극을 그만둘 수 없었다. 그가 노예제와 노예제에 가담하는 이들에 느끼는 부당함과 분노는 '과격'하고 '급진적'인 행동-언어가 아니면 온전히 표출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생활인으로서도 당시 관점에서는(심지어 현재 관점에서도) 과격하고 급진적인 방식을 택했고 실천했다. 타자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며 노역으로 생산된 재화는 소비하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에서 얻은 산물 또한 포함돼 있었다. 그는 직접 삼베로 옷을 지어 입었고, 사과, 복숭아, 호두, 토마토, 순무 등을 농사지어 가볍게 조리해 먹었으며, 마차를 타지 않고 어디든 걸어다녔다. 과격하고 급진적인 생활 방식이 만들어낸 풍경은 이토록 평온하고 소박했다.
그동안 지식인-신사-비장애인 중심으로 쓰여진 영미 노예제 폐지 운동사에서 셋 중 그 어떤 조건도 충족하지 못한 벤저민 레이(그는 독학자-평민-저신장 장애인이었다)가 18세기 후반 노예제 운동이 열매를 맺기에 앞서 그 싹을 틔운 업적은 오랫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이것이 저자인 마커스 레디커가 여러 기록을 총망라해 벤저민 레이의 생애를 한 권의 책으로 남긴 이유다. 저자는 벤저민 레이를 노예제 운동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창적이고 진보적인 인물로 조명하며, 그를 "싸움꾼 투쟁가"나 "땅딸보 곱추"가 아닌 역사가 기억해야 할, "노예제에 맞선 투쟁에서 주요한 공헌자"이자 여러 사상을 결합해 자신만의 철학을 세운 "자유사상가"로 평한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그를 근대 전통의 '위대한' 사상적 계보의 연장선에 놓으려 거듭 시도하는데, 이 지점이 다소 불편하다. 특히 5장에서 고대 그리스 견유학파(Cynics)를 대표하는 디오게네스와 그를 연결짓는 대목(9쪽에 이른다)은 되려 그를 더욱 왜소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는다. 독창적인 자유사상가이자 혁명가다운 그의 면모는 그가 걸어온 여정이 담백하면서도 명쾌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원제는 'the Fearless Benjamin Lay(두려움 없는 벤저민 레이)'인데, 'fearless(두려움 없는)'란 단어를 'in spite of fear(두려움을 무릅쓰고)'로 읽고 싶다. 시류에 역행하고 다수에 맞서는 비주류 소수는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을 무릅쓰고라도 그렇게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방향으로 헤엄친다. 패션 산업이 모피를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 패션쇼 무대에 뛰어드는 것도, 불법 개 농장의 좁고 더러운 뜬장에서 짧은 생을 마감한 강아지들을 두 손에 안아들고 광화문 광장에 서는 것도, 고깃집에 들어가 "음식이 아니라 폭력"이라 외치는 것도 두려움을 무릅쓰게 만드는 절박함 때문이다 - 그래야 세상이 바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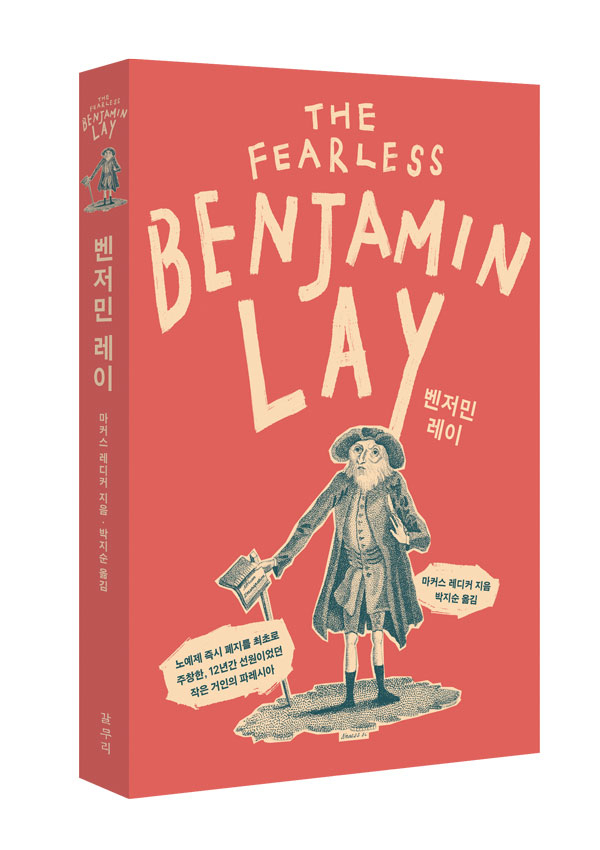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