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지하철을 탔다가 우연히 보았던 광고 문구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이 광고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 메트로는 서울에서 (비장애인들에게) 가장 빠른 대중교통입니다."
장애는 '비정상', 비장애는 '정상'으로 여겨지는 '비장애인의 천국' 한국에서, 이런 광고는 장애인의 존재를 마치 없는 것처럼 만든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따금 텔레비전에서 등장하는 장애인은 '불쌍한 존재'로 그려지기 일쑤다. 이같은 시각은 과연 올바른 것일까. '장애우'는 단지 배려해야 할 대상일 뿐일까?
아키야마 나미, 가메이 노부다카의 <수화로 말해요>(아키야마 나미·가메이 노부다카 지음, 서혜영 옮김, 삼인 펴냄)는 장애를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비장애인'의 시선에 일침을 놓는다. '청인'인 남편 가메이 노부다카와 '농인'인 아내 아키야마 나미가 한집살이는 그 자체로 장애인·비장애인 사이에 상호이해가 얼마나 큰 지를 보여준다.
"'청인들의 천국'에서 '농인'으로 산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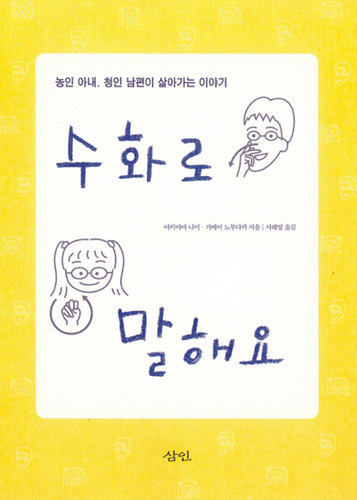
|
| ▲<수화로 말해요>(아키야마 나미·가메이 노부다카 지음, 서혜영 옮김, 삼인 펴냄) ⓒ프레시안 |
따라서 농인을 위해 수화 통역을 준비하거나 특수 설비를 마련하는 일은 청인들이 농인을 위해 희생하는 '봉사'나 '특혜'가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해 당연히 갖춰야 할 삶의 조건이다.
그러나 이 부부가 살아가는 일상은 녹록치 않다. 농인에게는 집을 빌려줄 수 없다는 집주인, 소리를 가늠할 수 없는 농인에게 다짜고짜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청인, 농인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는 부모…. 책의 1장과 2장에서는 이 두 사람이 사는 좌충우돌의 이야기와 동시에 '들리는 세계' 속에 살아가는 '들리지 않는' 농인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책의 3장은 '도움'의 관점이 아니라 '권리'의 관점에서 장애 문제에 대해 접근했다. 대학에 입학하게 된 아키야마 나미는 수업은 물론 입학식에서부터 수화 통역을 해줄 사람이 없는 등, 장애인에 대해 철저히 이해가 부족한 학교 당국의 처사에 놀라게 된다. 저자는 대학 생활 동안 겪은 불편부당한 사건, 장애인의 수강권을 보장받기 위해 애쓴 과정을 소개하며 농인의 '언어권'에 대해 이야기 했다.
농인들의 언어, 수화
아키야마 나미와 가메이 노부다카 부부가 집에서 쓰는 공용어는 바로 '수화'다. 아키야마 나미는 미국을 여행했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수화가 '흔하디 흔한 언어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는 상황을 보고 적잖이 충격을 받는다.
"미국 책방에서 본 실제 예. '각 언어의 교과서를 ABC 순으로 배열해놓습니다'라는 안내 글이 있어서 찾아봤더니, 수화(Sign Language)는 세르비아어(Serbian)와 슬로바키아어(Slovak) 사이에 있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그저 언어인 것이다"
그러나 청인들이 수화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은 여전히 견고하다. "구화를 사용하면 사람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며 은연 중에 구화 배우기를 강요하는 사람들. 이에 대해 저자들은 "장애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폭력"이라며 일침을 가한다.
"목소리를 내는 게 '한 걸음 다가가는' 거라구? (…) 이는 휠체어를 쓰는 사람에게 '필요하다면 손잡이나 지팡이를 이용해서 (필요하다면 보청이나 인공내이를 사용해서) / 비틀거려도 괜찮으니까 (발음이 불분명해도 괜찮으니까) / 자신의 발로 걸으세요. (스스로 얘기하세요.) / 그것이 상대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입니다. / 휠체어를 고집하면 건물을 개축해야 해요.(수화만 고집하면 통역을 준비해야 해요.) / 그러려면 돈이 듭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는 농인들에게 척박한 한국의 현실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청각 장애와 관련된 책은 수화 학습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한 한국의 상황에서, 이 책은 특수 교육과 청각 장애를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작은 안내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