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지고 보면 지금 '정의'라는 단어에 대한 대중적 열풍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의'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려주는 증표일 수도 있다. 서구의 개념으로 정의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원칙', 혹은 '치우침을 바로잡는 것'을 의미한다. 유교에서는 '의'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정의하는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과 '불의를 증오하는 마음'을 합한 개념이다. '수오지심'이란 것이 사회적 공동체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고 보면, 서양과 동양의 '정의' 개념의 차이란 정치적 활동을 중심으로 보느냐, 아니면 개인의 소양을 중심으로 보느냐는 정도다.
.JPG)
|
| ▲ <프레시안>, 김영사, 예스24가 공동 주최한 <정의란 무엇인가> 출간 기념 대담회에 모인 사람들.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뜨거운 반응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정의에 얼마나 목말랐는지를 보여준다. ⓒ프레시안(최형락) |
세 자녀를 모두 위장전입으로 좋은 학교로 보낸 신재민 후보자가 "아이들이 왕따가 될 뻔해서 자구책으로 했다"고 치졸하게 답변한 대목에서는 서양적 시각에서도 동양적 시각에서도 도저히 '의'라는 것은 찾아볼 길이 없다. 청문회장에서 본 우리 지도층의 '정의'는 빈사상태다.
만인이 만인에 대해 소비자가 되는 사회, 공동을 위해 옳은 것을 왜 옳은지 일일이 증명해야 하는 사회,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확인하는 데도 '지루한 협상'을 통해 한 꺼풀씩 진실을 벗겨야 하는 사회, 이런 사회를 '하류지향적 사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공정하고 정당한 요구를 하는 시민들이 정부와 짜증나는 협상을 해야 하는 나라, 뻔한 진실을 부정하다가 백일하에 드러나고서야 마지못해 인정하는 정부를 가진 나라, '오해다', '잘못된 보도다', '지금은 말해줄 수 없다'라며 발뺌을 일삼는 '그들만의 정부'를 가진 나라에서 '정의'의 열풍은 당연하다. 공동선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가진 나라가 더 효율적이고, 더 강한 공동체임을 시민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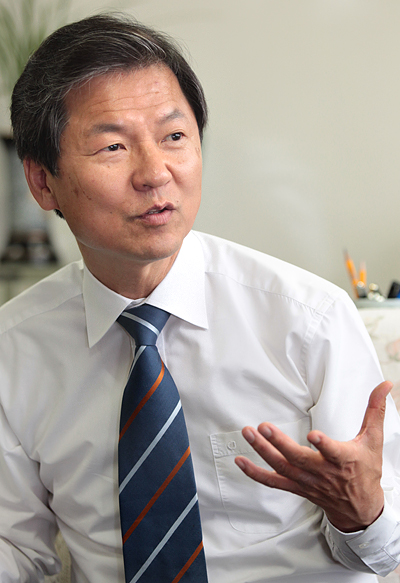
|
| ▲ 천정배 민주당 의원 ⓒ프레시안(최형락) |
공자는 어진 이와 유능한 인재를 어떻게 알아서 등용할 수 있느냐는 제자의 물음에 "내가 아는 어질고 유능한 사람을 등용하면, 내가 모르는 이를 사람들이 내버려 두겠느냐"고 답했다. 마찬가지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는 불의하고 무능한 사람이 등용되면, 앞으로도 이 대통령이 모르는 더 불의한 사람들이 더 많은 공직을 맡게 될 것이다. 지금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그칠 줄 모르는 '불의'가 부를 혼란과 향후 이를 교정할 때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의 크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라도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당장 필요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