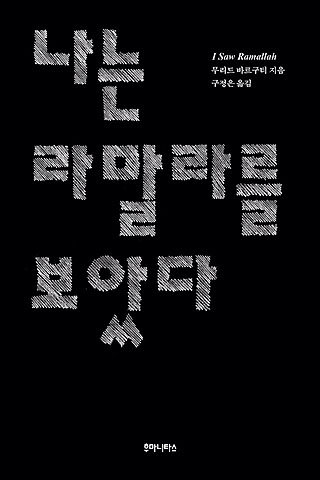
"올리브유 사는 게 정말 고통", 한 남자의 슬픈 사연
[프레시안 books] 무리드 바르구티 <나는 라말라를 보았다>
"이곳을 떠날 때에는 내가 라말라에 머물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번 방문에서 나는 내 아들이 라말라를 볼 권리를 얻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팔레스타인 시인 무리드 바르구티 씨는 고향인 라말라로 가기 위해 이스라엘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기 전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점령' 이후 팔레스타인도, 그의 고향도 그리고 그의 삶도 송두리째 변해버렸다.
<나는 라말라를 보았다>(후마니타스, 2014년 8월 펴냄)의 저자 무리드 바르구티의 고향은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의 중심 도시인 라말라 부근의 '데이르 가사나'라는 곳이다. 그는 이집트로 유학을 떠나기 전 청소년기를 라말라에서 보냈는데, 1967년 이후 라말라는 그에게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땅이 돼버렸다.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 1948년 5월 15일 유대인들은 유대 국가를 세우겠다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땅으로 내려와 350만 명에 이르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기 시작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대재앙'이라고 부르던 이스라엘의 국가 수립일이자 비극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갑작스럽게 중동 지역에 들어온 유대인들과 기존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아랍계 중동 국가들은 삶의 터전을 놓고 수차례 충돌을 벌였다. 이후 1967년 6월 벌어진 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면서 팔레스타인의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가 이스라엘의 차지가 됐다. 이 전쟁으로 팔레스타인 국경이 봉쇄되면서 바르쿠티는 자신의 고향에 마음대로 갈 수 없는 난민 신세로 전락했다.
그런데 그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집트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중 추방당했다. 1977년 이집트의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면서 이집트에 거주하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추방하기 시작한 탓이다. 고향에서 쫓겨난 바르구티는 망명지인 이집트에서도 쫓겨나면서 '이중 난민'이 돼버렸다.
<나는 라말라를 보았다>는 자신의 땅에서, 그리고 이집트에서마저 추방당하며 세계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었던 바르구티가 30여 년을 해외에서 떠돌다가 1996년 마침내 고향을 다시 찾게 된 자전적 기록을 담은 책으로 지난 1997년 이집트에서 출간됐다. 그리고 17년이 지난 2014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상실감은 안타깝게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추방'이 결정지어 버린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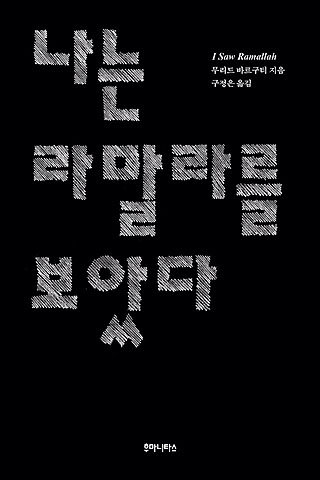
바르구티는 "저 커피포트는 내 것이 아니야. 나는 그런 정서에 나를 길들였다"고 고백한다. 그는 "컵을 깨뜨리는 행위조차 내게는 의미가 다르다. 내 밥솥 색깔, 커튼 색깔, 침대보 색깔은 부동산 관리인의 취향에 따라 정해진다. 우연이 모든 걸 결정한다"며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삶의 단면을 담담하게 보여준다.
고향에 갈 수도, 한곳에 정착할 수도 없는 바르구티가 가족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전화'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 형의 죽음을 모두 전화로 알았다면서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사랑하는 이들의 굴곡진 인생과 그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모두 전화벨과 함께 시작됐다. 기쁨의 전화벨, 슬픔의 전화벨. (…)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이에선 전화벨이 울리면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난다. 우리에겐 그보다 더 사랑스러운 소리도, 그보다 더 두려움에 떨게 하는 소리도 없다."
바르구티는 고향에 있었다면 당연히 얻을 수 있던 것을 포기해야 했던 안타까움도 표현했다. 그는 "올리브기름을 사야 한다는 게 정말 고통스러운 일임을 깨달았다. (…) 마을 사람들 누구도 올리브나 올리브기름을 사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추방이 길어지고 데이르 가사나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지면서 "동네 가게에 가서 처음으로 1킬로그램짜리 올리브기름을 사면서 단순하지만 깊은 모멸감을 느꼈다"고 고백한다. 단순히 올리브오일 때문이 아니라,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현실이 투영된 모멸감이었을 것이다.
발붙일 곳 없는 망명자들로 구성된 가족들에게는 이따금씩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진다. 그가 가족들과 함께 유럽 국경을 통과할 때의 일이다.
"경찰이 앞으로 나오더니 여권을 보자고 했다. 우리는 여권들을 모두 모아 그에게 건넸다. 그에게는 경이로운 일이었을 것이다. 손에 쥔 여권들은 전 세계에서 온 것들이었으니. 요르단·시리아·미국·알제리·영국, 심지어 카리브해 연안 소국인 벨리즈(Belize) 여권도 있었다. 하지만 그 여권들에 적혀 있는 이름들은 우리 모두가 다 한 집안이고 바르구티 출신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추방은 그의 가족 형태까지 규정지어 버렸다. 바르구티는 "이집트 대통령 안와르 알 사다트는 우리 가족의 규모가 정해지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나를 추방한다는 그의 결정 때문에 나는 한 아이의 아버지밖에 될 수 없었다. 이를테면 라드와와 나는 딸을 낳을 수도, 아들딸 열 명을 더 낳을 수도 없었다"며 "나는 이쪽 대륙에 있었고, 라드와는 저쪽 대륙에서, 아이 하나 외에는 더 돌볼 수 없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고 말한다.
달력에서 사라진 수많은 기념일
물론 바르구티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의지할 국가가 없다고 해서 그의 삶이 항상 비극으로만 점철되는 것은 아니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족과 만나는 일상 속에 그에게도 나름의 행복한 순간이 존재했을 것이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을 둘러싼 현실은 그에게 몇 없는 일상적인 행복마저 앗아가 버렸다.
팔레스타인 출신의 나지 알 알리는 저명한 만평 작가였다. 그는 쿠웨이트에서 발행된 <알 시야사> 신문을 비롯해 여러 매체에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만평을 그렸다. 그가 그린 풍자만화의 캐릭터는 아랍권의 폭넓은 사랑을 받으며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바르구티는 종종 나지의 사무실에서 저녁 늦게까지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우정을 쌓아나갔다.
그런데 1987년 7월 22일 나지 알 알리는 총에 맞아 숨을 거두고 말았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바르구티의 결혼기념일이었다. 그는 "우리의 개인적인 기념일들은 이런 사건들이 자꾸만 겹치면서 하나씩 의미가 바뀌어 갔다. 비극적인 사건들이 우리의 기념 달력을 갈기갈기 찢어 바람에 날려버렸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결혼기념일이 우정을 나눴던 친구의 핏빛으로 물들어버린 사건이었다.
1987년에도, 그리고 그가 고향에 다시 갔던 1996년에도 현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작은 행복을 비극적인 사건으로 덮어버리고 있었다. 문제는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지난 2014년 현재, 살아남은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당시와 별로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8일 시작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공습으로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가자 지구의 유엔 피난처까지 공습한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습으로 인해, 바르구티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기념일, 간직하고 싶던 추억들이 예상치 못한 비극으로 지워졌을 것이다. 행복을 덮어버린 비극, 누가 이들의 삶을 이전으로 되돌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프레시안에 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