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은 우리에게 지식과 정보와 통찰을 전해준다. 우리는 역사를 알기 위해 역사책을 읽고 철학에 대해 배우려고 철학책을 읽는다. 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를 과학책에 적용해 보자. 사람들은 왜 과학책을 읽을까? 과학책을 읽으면 과학을 알게 되는가?
물론 어느 정도는 그렇다. 과학책을 통해서 일상에서는 볼 수 없는 과학적 사실과 현상을 접할 수 있고, 새로운 용어와 개념을 배우게 되며, 과학이 발전해온 모습과 현재 도달한 곳을 알게 된다. 잘 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원리의 일부를 통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미진함을 감출 수 없다. 그런 정도로 과연 과학에 대해 뭔가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알게 되었다고 해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다보니, 그렇다면 책을 읽은 것만으로 다른 학문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다른 학문 분야에 대해서야 내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다른 학문 분야와 과학이 분명히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대중을 위한 책과 전문서적, 아니 교과서 사이의 먼 거리다. 다른 학문 분야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관심이 깊어지면 전문 서적을 읽는 일이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전문 서적이라는 말이 모호하면 대학의 교과서나 참고서라고 하면 되겠다. 지금 당장 대학의 교과 과정과 전공과목의 교재 목록을 찾아보면, 인문학 교재 목록에는 알 만한 책들의 제목이 얼마든지 눈에 띄고, 심지어 읽어본 책도 간혹 발견될 것이다.
이제 자연과학 분야의 교재 목록을 보자. 해당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의 눈에는 아마도 누군지 전혀 모를 저자의 듣도 보도 못한 책들만 나열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과학 분야에서 보통 사람들이 읽는 과학책과 과학을 배울 때 읽는 책 사이의 거리는 아득히 멀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칸트에 대해 알고 싶다는 사람에게 <순수이성비판>을 읽어보라는 말은 쉽게 하지만,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 아무도 가시오로비츠의 양자역학 교과서를 읽어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이는 학문의 분화, 대학 교육의 역할, 분과 학문 체계의 상이성 등 여러 원인으로 생겨난 현상일 것이므로, 여기서 이런 상황이 잘못되었다거나 문제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과연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보통의 독자가 대중을 위한 과학책만 읽고 과학을 얼마나 알게 되는 것일까 하는 점이 궁금한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대중을 위한 과학책은 과학 내용을 별로 알려주지 않으며, 사실 원래 그러기 위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런 과학책은 무엇을 위한 책인가? 대중을 위한 과학책은 위에 적은 것처럼, 과학적 사실과 현상, 용어와 개념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당연히 체계적이지도 엄밀하지도 않으며, 독자가 새로운 것을 이해하기를 기대하지도 않는다. 대부분의 잘 쓴 대중 과학책은 과학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것이 어떤 맥락에서 일어났고, 왜 중요하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 책이지, 이론을 이해시켜서 지식을 늘리려는 책이 아니다.

양자역학은 현 인류에게 가장 낯선 지식일 것이다. 양자역학이 세상에 출현한 지 거의 9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러하다. 양자역학이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양자역학은 전적으로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는 거리가 먼 원자를 묘사하려는 목적으로 탐구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기존 경험을 토대로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이유로 적어도 원자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이는 양자역학은 뜬구름 잡는 소리일 뿐이다. 따라서 이 책을 읽는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지식 체계를 접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각오하고?) 적어도 처음 한동안은 왜 이런 짓을 하는가?라는 의문은 잠시 접어두어야 한다.
그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 중에서도 이 책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양자적 입자라는 것을 서술하기 위해 도입한 시계일 것이다. 고전역학에서는 입자를 점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후의 모든 논의의 기초가 되는데 반해, 이 책에서는 특정 위치의 하나의 입자를 하나의 시계로 표시한다. 시계라고는 해도 진짜 시계처럼 시침과 분침과 초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오직 하나의 바늘만 가진 시계다. 이 시계는 두 가지 양으로 표현되는데, 하나는 바늘의 길이이고 다른 하나는 바늘의 각도다. 각 시계는 그 시계의 위치에서 입자가 발견될 확률을 알려준다. 시계를 더할 때는 바늘의 길이와 각도가 둘 다 관계한다. 이 시계를 기반으로, 그 위에 몇 개의 가정만을 더해서 저자들은 양자역학의 많은 부분을 유도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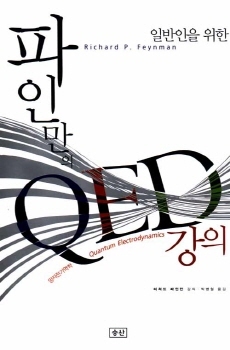
사실 이 방법은 물리학에서 '위상자 phasor'라고 해서 수학을 많이 쓰지 않고 직관적으로 파동을 다룰 때 종종 쓰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양자적 입자를 시계로 서술한다는 것은 곧 파동으로 서술한다는 것이고, 슈뢰딩거의 파동 방정식의 관점에서 현상을 묘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실 일단 복소수 등 필요한 수학을 배우고 나면 굳이 위상자를 쓰지 않고도 훨씬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파동을 서술할 수 있으므로, 물리학자들이 그다지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수학을 가능한 한 적게 쓰고도 파동이 나타내는 현상을 직관적으로 보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이 책은 시계라는 방법을 통해 양자 현상과 이론을 보여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여느 책과는 달리 양자역학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나 주변 상황에 대한 묘사는 거의 없다.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면, 마침 과학 저술가인 짐 배것(Jim Baggott)이 쓴 <퀀텀 스토리(The Quantum Story)>(박병철 옮김, 반니 펴냄)가 같은 역자의 번역으로 출판되었으므로 함께 읽어보면 좋을 듯하다. <퀀텀 스토리>는 부제가 "양자역학 100년 역사의 결정적 순간들"인 데서 알 수 있듯, 양자역학이 탄생하고 발전해온 외면을 그리는 책이므로, 양자역학의 내적 논리를 서술하고 있는 이 책과는 좋은 보완 관계를 이룬다.

그러니 필요하다면 연필과 종이라도 한 장 꺼내들고 책상 앞에 앉아보자. 대신 다른 어떤 책보다도 더 깊게 양자역학과 사귀어 볼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자 이제 양자역학을 체험해 볼 시간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