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힙합, 열정의 발자취>, <힙합, 우리 시대의 클래식>을 집필한 대중음악평론가 김봉현 씨가 프레시안에 흑인음악 전문 코너 [김봉현의 블랙비트] 연재를 시작합니다. 김봉현은 대중음악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한국대중음악상'의 선정위원이며 네이버 뮤직 '이주의 국내 앨범' 선정위원이기도 합니다. 현재 <한겨레>가 새로 창간한 대중음악 웹진 <100beat> 필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의 블랙비트]는 앞으로 힙합, R&B 등 흑인음악의 최신 조류를 특유의 맛깔나는 글로 깊이 있게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또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경향을 짚어나갈 예정입니다. 주말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편집자> |
에픽 하이(Epik High)가 지난 달 새 앨범 [Epilogue]로 아이튠스(iTunes) 힙합 부문 차트 1위에 올랐다. 당사자에게는 물론 한국음악계에도 좋은 일이다. 특히 아이폰(팟)의 보유 없이 21세기로의 편입은 불가능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더 친근(?)하게 와 닿는 사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누군가의 말대로 멕시코의 마약 왕이나 한국의 대통령 정도를 제외하고는 세상의 그 어떤 직업보다 일관되게 욕먹는 직업인 '음악 듣고 글 쓰는 일'을 하는 나로서는 어째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내가 뮤지션도 아닌데 시기, 질투 따위의 감정은 아니겠고 뭐랄까 일종의 괴리 같은 것이다. 차트 성적과 음악적 완성도 사이의 괴리. 물론 이 둘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건 비틀스(Beatles)의 '비' 자도 모르는 뒷집 왕식이도 아는 사실이지만 '기대하지 않은 놀라운 흥행'에 '앨범에 대한 음악적 평가'가 가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펜을 잡았다(매우 고전적인 표현이다. 쓰고도 놀랐다).
그에 앞서 에픽 하이의 팬을 다분히 의식(!)한 발언을 하겠다. 나는 에픽 하이의 반대자보다는 지지자에 가깝다. 뻥이 아니다. 나는 당신들의 편, 이기는 편 우리 편. 실제로 모두가 그들의 '음악적 변화'와 '예능프로 출연'을 두고 말의 성찬을 벌일 때, 나는 '어떤 음악을 하건 뮤지션의 맘이다. 변화 자체보다는 변화한 결과물의 완성도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고 '예능프로 좀 출연하면 안 되나? TV에 하루 종일 나와도 음악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또 [Remapping the Human Soul]은 최근 몇 년 간의 한국힙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앨범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쉬지 않고 결과물을 내놓는 창작욕과 근면함 역시 그들을 호의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이유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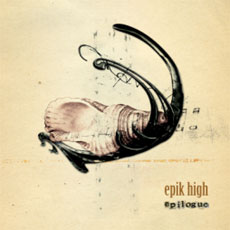
|
| ▲에픽하이의 스페셜 앨범 [Epilogue]. 울림엔터테인먼트. ⓒ프레시안 |
문제는 이 앨범이 에픽 하이의 과거 결과물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던 특유의 '감성 스타일'을 확장해 이어오고는 있으나 과거의 그것들에 비해 별달리 더 나은 점을 들려주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비교우위를 점한다면 이상적이겠지만 애석하게도 [Epilogue]는 비교동등, 아니 비교열위에 가깝다. '과거에 만들어놓은 곡을 다시 작업해 만든 앨범', '누구나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을 추구한 작품' 등의 설명이 있었지만 세상에는 이러한 전제들을 똑같이 달고도 호평 받은 작품이 많다. 즉 과거에 만들어놓았어도 원래의 결과물이 뛰어났거나 혹은 다시 작업하면서 발전적으로 개선하면 되는 것이고, 또 누구나 편하게 들을 수 있으면서도 훌륭한 음악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쉽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일이다.
[Epilogue]는 일단 타이틀곡 <Run>부터 좀 안일한 느낌을 준다. 한번만 들어도 귀에 꽂히지만 동시에 쉽게 질린다. 전형적이고 너무 안전하다. '작품'이라기보다는 대중의 기호를 과하게 의식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 <바보>와 <Coffee>는 이들의 멜로디 감각이 여전함을 보이지만 선택의 상황에 놓인다면 이 두 곡보다는 <우산>과 <1분 1초>에 줄 설 이가 아마 더 많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앨범은 수록곡 대부분의 사운드가 예상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식상하게 들리며, 타블로 특유의 간결한 후렴/브리지 메이킹 방식 역시 무언가 관성화 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마디로 [Epilogue]는 지난 몇 년 간 유효했던 에픽 하이의 '감성 스타일'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알린다. 속단하기 이를지도 모르지만 더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 신선하고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물론 이 앨범으로 에픽 하이를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지적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에픽 하이가 귀기울여야할 대상은 그들의 행보를 꾸준히 지켜봐온 이들이라는 사실 역시 자명하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에픽 하이의 아이튠스 힙합 차트 1위 소식을 들었을 때의 내 심정은 외톨이야-파랑새 표절 사태 때 와이낫(Ynot)에 의해 (본의 아니게) 인디 음악계가 대중에게 각인되었을 때의 심정과 비슷하다. 당시 나는 (사태의 본질과 관계는 없었지만) 이왕이면 와이낫보다 더 실력 있는 밴드가 인디를 대표하(한다고 대중에게 인식되)기를 바랐다. 마찬가지다. 차트 1위의 주인공이 [Epilogue]가 아닌 에픽 하이의 더 좋은 앨범이었다면 훨씬 마음 편하게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번 앨범이 당분간 에픽 하이로서 내는 마지막 작품'이라는 그들의 말이 마냥 서운(?)하게만 들리지는 않는다. 비록 그 마지막 작품이라는 것이 그들의 디스코그래피에서 별다른 존재감이 없는, 특히 그들의 음악을 꾸준히 들어온 이라면 굳이 들을 필요가 없는 앨범이라는 사실이 아쉽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쯤에서 한번 본인들의 음악을 돌아볼 때도 되지 않았나 싶다. 부지런함이 더는 발전을 담보하지 못할 때 대체로 필요한 것은 휴식과 재충전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블로그에서 더 많은 음악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http://kbhman.tistory.com)
.JPG)
|
| ▲ 부지런한 뮤지션이 꼭 발전하는 것만은 아니다. ⓒ뉴시스 |



전체댓글 0